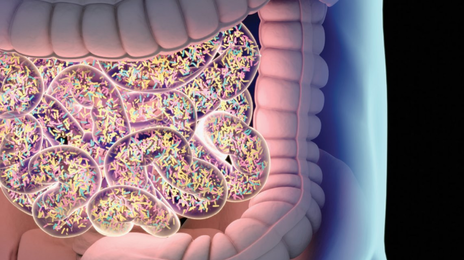공유하기
“오페라 - 발레 살리는 건 전문 오케스트라”
-
입력 2008년 11월 3일 03시 01분
글자크기 설정


최태지(49) 국립발레단장은 공연을 할 때마다 늘 가슴을 졸인다. 발레는 오케스트라와의 호흡이 생명인데 라이브 연주에 맞춘 리허설은 불과 4, 5차례이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은 전속 오케스트라가 없는 이소영(47) 국립오페라단장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30일 서울 예술의 전당 분수대 앞 광장의 모차르트 카페에서 최태지 단장과 이소영 단장이 만나 ‘21세기 문화콘텐츠 강국’을 꿈꾸는 한국의 극장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은 국립예술단체의 존재 이유를 ‘창작’에서 찾았으나, 국내 공연장은 창작보다 ‘대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내년에 창작발레 ‘왕자 호동’을 공연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창작을 하려면 안무와 음악을 끊임없이 수정해야 하는데 음악감독이 없어 고민입니다. 얼마 전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을 찾아갔는데 2∼3년 스케줄이 차 있다고 하더군요. 장이머우 감독의 ‘홍등’을 공연한 중국 국립발레단에는 작곡가 연출가 등 200명의 창작전담팀이 있다고 해요.
△이=서양의 오페라나 발레는 수백 년간 유럽 각국의 문화의 힘이 축적된 것입니다. 이에 맞서려면 동양의 여러 나라도 문화 역량을 합쳐야 합니다. ‘홍등’도 처음엔 평이 좋지 않았지만 10년간 고치고 또 고쳤지요. 좋은 작품은 ‘한 방’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투자가 몇십, 몇백 배의 효과를 낳는 것입니다.
△최=다른 나라와 교류하면서 “우린 전속극장이 없다”는 말을 할 때면 낯 뜨거워집니다. 러시아 안무가 유리 그리가로비치 씨가 “국립발레단은 왜 이 좋은 예술의 전당에서 1년에 2, 3회밖에 공연하지 않고 지방을 돌아다니느냐”고 물었어요. 시즌제로 작품이 공연되는 서구의 극장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유럽의 오페라극장이 수백 년간 극장 중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반면 우리는 서울 예술의 전당의 전속단체가 아닙니다. 국립단체지만 극장에 세 들어 사는 처지여서 대관비부터 오케스트라, 스태프 비용, 피아노 사용료까지 내야 합니다. 작품마다 다른 스태프와 연주팀이 모였다가 흩어지곤 하기 때문에 예술성이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빈 국립오페라극장, 베를린 슈타츠오퍼,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등 세계적 극장에는 유서 깊은 오케스트라와 오페라, 발레단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창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서울시향, KBS 교향악단 등이 있지만 극장에 상주하지 못해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올해 콘서트 형식의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을 준비하는데 러시아 지휘자 노다르 찬바 씨가 리허설 때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미리 악보도 안 읽고 왔는데, 언제 지휘자의 음악을 만들고 가수와 맞춰보느냐는 거지요. 오케스트라가 오페라나 발레 공연에 나설 때는 그저 ‘반주’하는 것으로 소홀히 여긴 탓입니다.
△최=외국 극장에서는 상주 지휘자가 무용수에게 맞춰 음악의 템포를 조절해주기도 해요. 반면 국내 오케스트라는 한 번 더 맞춰보자고 해도 리허설 시간이 끝나면 칼같이 짐을 쌉니다. 월급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단원들이 다른 일을 하러 가는 걸 두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국립오페라단과 발레단이 지방을 돌며 레퍼토리를 메워주는 순회공연 단체가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방 공연장들이 건물만 지어놓고 “서울 예술의 전당과 똑같은 극장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지방도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창작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서울의 대형 국공립극장이 제대로 모범을 보일 때 전국 공연장들도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DMB : 위성 DMB : 지상파 재전송 논쟁 >
-

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그 마을엔 청년이 산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위성DMB 지상파 재전송 불허]정책 헤매다 日에 선두 뺏겨](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