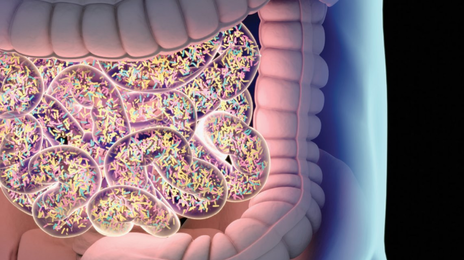공유하기
IMF시대 『인사말도 조심』…『먼저 퇴근하라』반응 민감
-
입력 1997년 12월 7일 20시 47분
글자크기 설정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