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특파원 칼럼/고기정]지금은 한국이 군사력 키울 절호의 기회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추석 연휴에 베이징(北京) 서북쪽에 있는 이허위안(이和園)에 들렀다. 이곳의 인공호수 쿤밍(昆明) 호는 근세 중국의 치욕을 잉태한 곳이다. 1860년 제2차 아편전쟁 막바지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청의원(이허위안의 옛 이름)을 철저히 약탈하고 파괴했다. 서태후는 청의원을 개인 별궁으로 쓸 요량으로 1888년 재건사업에 착수하면서 해군 예산을 끌어다 썼다. 군함 훈련용 호수를 판다는 명분을 붙였고 실제로 전투함을 띄운 적도 있었다.
당시 중국 북양함대는 아시아 최강이었다. 가장 큰 함정의 배수량이 7000t 이상으로 한국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기준 배수량 7600t)과 별 차가 없었다. 하지만 서태후 때문에 재정 지원이 끊기자 전력은 급속히 악화됐고,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궤멸됐다. 당시 북양함대 전투함에는 포탄조차 없었다고 한다. ‘아시아의 병자’ 중국의 마지막 희망은 너무도 허망하게 사라져 버렸다.
19세기 말 동아시아는 일본이 새로 쓰는 국제질서를 청과 조선이 수용하는 구조였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동아시아의 ‘룰 세터(rule setter)’는 중국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것은 질서의 변화 국면을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을 집단적 자위권 확보 등 군사력 증강의 빌미로 활용하고 있다. 6월에는 34년 만에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라는 문구를 추가해 핵개발 가능성까지 열어 뒀다. 표면적으로는 센카쿠 분쟁으로 코너에 몰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쏠쏠한 재미를 보는 셈이다. 미국도 중국 견제를 내세워 동남아 국가와 유대를 강화하고 일본 오키나와(沖繩)에 수직이착륙기 배치를 관철하는 적지 않은 이익을 챙기고 있다.
한국은 어떨까.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미는 정황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하지만 중재자 역할도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북한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한국만 무핵국(無核國)으로 남는다.
기회는 변화와 혼돈 속에서 만들어진다. 세월이 지나 2012년을 회고할 때 한국이 대미 군사의존도를 낮추고 독자 방위력을 증강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다고 평가하며 후회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과 일본의 눈치 때문에 한국의 군사력을 제한해 왔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호기다. 단적으로 중국 항모가 서해에 뜨면 한반도 전역이 함재기의 작전 반경에 들어간다. 독도함대 신설 등 해상전력 현실화도 이참에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할 것이다.
고기정 베이징 특파원 koh@donga.com
특파원 칼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고양이 눈
구독
-

K-TECH 글로벌 리더스
구독
-

기고
구독
트렌드뉴스
-
1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2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증거 인멸 염려”
-
3
미스 이란 출신 모델 “하메네이 사망, 많은 국민이 기뻐해”
-
4
‘K패트리엇’ 천궁-Ⅱ, 이란 미사일 잡았다…UAE서 첫 실전 투입
-
5
만취女 성폭행한 세 남자…“합의하면 되나” 현장서 AI에 물었다
-
6
“친미의 대가” 걸프 6개국 때리는 이란…중동 진출 빅테크도 타깃
-
7
달걀, 조리법 따라 영양 달라진다…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
8
“나는 절대 안 먹는다”…심장 전문의가 끊은 음식 3가지
-
9
이란, 이스라엘에 장거리 미사일 ‘가드르’, ‘에마드’ 발사
-
10
살아서 3년, 죽어서 570년…“단종-정순왕후 만나게” 청원 등장
-
1
‘尹 훈장’ 거부한 교장…3년만에 李대통령 훈장 받고 “감사”
-
2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3
“정파적 우편향 사상, 신앙과 연결도 신자 가스라이팅도 안돼”
-
4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5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6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7
한동훈 “나를 탄핵의 바다 건너는 배로 써달라…출마는 부수적 문제”
-
8
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
9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10
조희대 “사법제도 폄훼-법관 악마화 바람직하지 않아”
트렌드뉴스
-
1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2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증거 인멸 염려”
-
3
미스 이란 출신 모델 “하메네이 사망, 많은 국민이 기뻐해”
-
4
‘K패트리엇’ 천궁-Ⅱ, 이란 미사일 잡았다…UAE서 첫 실전 투입
-
5
만취女 성폭행한 세 남자…“합의하면 되나” 현장서 AI에 물었다
-
6
“친미의 대가” 걸프 6개국 때리는 이란…중동 진출 빅테크도 타깃
-
7
달걀, 조리법 따라 영양 달라진다…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
8
“나는 절대 안 먹는다”…심장 전문의가 끊은 음식 3가지
-
9
이란, 이스라엘에 장거리 미사일 ‘가드르’, ‘에마드’ 발사
-
10
살아서 3년, 죽어서 570년…“단종-정순왕후 만나게” 청원 등장
-
1
‘尹 훈장’ 거부한 교장…3년만에 李대통령 훈장 받고 “감사”
-
2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3
“정파적 우편향 사상, 신앙과 연결도 신자 가스라이팅도 안돼”
-
4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5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6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7
한동훈 “나를 탄핵의 바다 건너는 배로 써달라…출마는 부수적 문제”
-
8
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
9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10
조희대 “사법제도 폄훼-법관 악마화 바람직하지 않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특파원 칼럼/이종훈]5개월전 佛대선 통해 본 한국대선](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2/10/16/50132607.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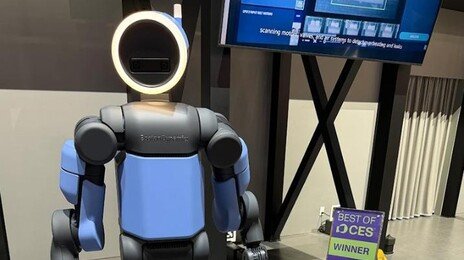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