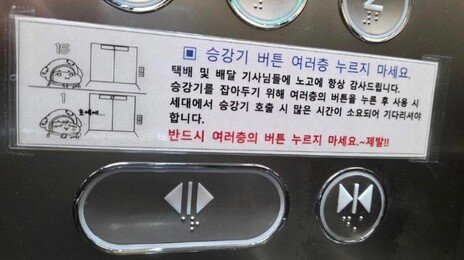공유하기
“黨실세 입김따라 공천” 총선때마다 논란
-
입력 2008년 4월 16일 03시 02분
글자크기 설정
18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를 둘러싼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비례대표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963년 6대 국회 때 ‘전국구’란 이름으로 도입된 비례대표제도는 지역구 의원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직능 대표성과 정책 전문성을 보완하고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애초의 명분과는 달리 총선 때마다 후보 선정을 둘러싼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비례대표 의원 상당수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않고도 정당 실력자와의 친분에 따라 금배지를 달아 왔기 때문에 ‘임명직 국회의원’으로 불리기도 했다.
특히 과거 일부 야당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 장사’를 통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을 조달해 왔다는 점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 때문에 전국구(全國區)가 ‘전(錢)국구’라는 오명에 시달리기도 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비례대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제1의 역할인데, 여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는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행정부 수반이 사실상 일부 입법부 의원을 임명하는 셈.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는 지역구 후보 공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문가 영입과 약자 배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비례대표 무용론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의 지역 기반이 확연히 갈리는 정치구조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정당 충원을 다양화하고 정당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한다는 반론도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5일 비례대표 제도와 관련해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말해 정치권에서 스스로 메스를 댈지 주목된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트렌드뉴스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3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4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
5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6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7
비트코인, 9개월만에 7만 달러대로…연준 의장 워시 지명 영향
-
8
“평생 취미 등산 덕분에 88세 성균관장 도전”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장[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
9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10
한준호, 정청래에 “조국혁신당 합당, 여기서 멈춰 달라”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4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5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6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7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8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9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
10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트렌드뉴스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3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4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
5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6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7
비트코인, 9개월만에 7만 달러대로…연준 의장 워시 지명 영향
-
8
“평생 취미 등산 덕분에 88세 성균관장 도전”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장[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
9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10
한준호, 정청래에 “조국혁신당 합당, 여기서 멈춰 달라”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4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5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6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7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8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9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
10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