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인문사회]나치즘을 조명한 신간들 '게르만 신화…' 외
-
입력 2003년 8월 8일 21시 09분
글자크기 설정

괴테 칸트 베토벤을 배출한 민족을 씻을 수 없는 범죄의 주역으로 잉태시킨 조건과 환경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들을 다른 인간족으로 ‘타자화’한 채 인간에 대한 신뢰 속에 안주할 수 있을까. 최근 발간된 세 권의 책이 ‘광기의 시대’에 대한 이해에 새로운 빛을 던져준다.
‘게르만신화 바그너 히틀러’는 고대 전설부터 바그너의 음악극(Musikdrama)을 거쳐 나치즘으로 이어지는 정신적 연관을 탐색하며 대살육이 펼쳐진 정신적 토양을 드러내는 책. 국내 필자가 방대한 문헌을 들추며 천착해 나간 결실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고대 게르만의 신화는 그리스 신화와 달리 보물을 놓고 뺏고 뺏기는 싸움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바그너는 이 신화의 소재를 특유의 장중하고 감성적인 음악과 결합시켰다. 그의 극에는 영웅의 비장한 최후와 죽음이 펼쳐지며 군중을 격동시킨다. 나치는 게르만 문화 특유의 이 제의(祭儀)성을 정치의 영역과 결합시켰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바그너의 예술은 이미 반민주적이고 엘리트적이라는 나치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장엄미까지 띤 나치의 몰락은 음악극 ‘신들의 황혼’처럼 그 태생에서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나치 시대의 일상사’는 제목 그대로 나치정권 하에서 일하고 교육받고 휴식한 독일 국민들의 생활을 조망해 81년 출간 이후 나치즘 연구의 새로운 고전으로 평가받는 책. ‘왜, 2차 대전 중 시민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국가가 부여한 의무에 순응했는가’라는 질문에 이 책은 중요한 대답을 던져준다. 그 해답은 나치의 철저한 ‘사회적 개체화’ 전략에 있었다. 나치는 인민들의 자발적인 모임 하나하나를 그 싹부터 질식시켰다. 고립되고 개별화된 시민들은 저항의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나치 조직국장 라이가 ‘독일에서 사생활이 있는 사람이란 잠자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이 진실의 핵심을 적시하고 있다. 저자의 미시적인 ‘신화 깨기’도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나치의 경제정책이 그동안 알려진 것만큼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는 것, 반유대주의가 체제 결속에 반드시 효과적 장치만은 아니었다는 것 등.
숙고와 비판의식을 요하는 앞의 두 책에 비해 히틀러의 하수인 6명의 궤적을 추적한 ‘히틀러의 뜻대로’는 비교적 쉽게 읽힌다. 괴벨스 괴링 히믈러 헤스 슈페어 되니츠 등 히틀러의 수족 역할을 한 자들은 각각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을까.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을 바쳐 복종한 괴벨스와 괴링, 뉘른베르크 법정에서 나치의 죄과를 고발한 슈페어, 스스로를 ‘비정치적인 엘리트 군인’으로 의식한 되니츠 등 각각의 모델과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저자는 독일공영방송 ZDF의 다큐멘터리 작가. 이 책에 다뤄진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다큐멘터리 채널을 통해 방영되기도 했다.
유윤종기자 gustav@donga.com
인문사회 >
-

오늘의 운세
구독
-

트렌디깅
구독
-

한시를 영화로 읊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콩나물 팍팍 무쳤냐”… 국민 울고 웃긴 예능史](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2/10/8860349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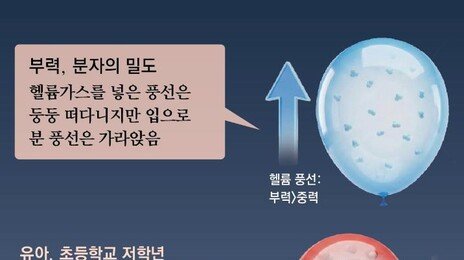
![[김순덕 칼럼]지리멸렬 국민의힘, 입법독재 일등공신이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2934565.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