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집을 가꾼다는 건 나를 가꾸는 일… 추억, 취향, 습관 담아내는 과정[김대균의 건축의 미래]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멋진 집’ 꿈꿔도 시작부터 막막
화분, 커튼 등 쉽고 뻔한 것부터… 추억과 감성 더하면 ‘내 것’ 완성
물건의 제자리 찾아주기 중요해
각 공간 활동 고려해 ‘집중 수납’… 물건 대하는 자세가 분위기 형성

‘거주’는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居)에 촛불 곁에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주(住)를 쓴다. 힘들게 바깥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불을 밝히고 의자에 앉아 쉬는 안식의 모습이 거주의 원형인 것이다. 텅 빈 집은 아직 살기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다. 집이 집다워지려면 의자나 촛대처럼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가구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쉽고 뻔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뻔한 것에 무슨 매력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 뻔함은 생각보다 강한 힘이 있다. 한국 드라마의 전매특허였던 ‘출생의 비밀’을 떠올려 보자. 뻔하지만 그 익숙함이 시대를 걸쳐 드라마를 보게 만드는 마력이었다. 뻔한 것은 이해의 문턱이 낮기 때문에 좀 더 미묘한 감정이나 디테일을 즐길 여유가 생긴다.
집도 마찬가지다. 화분 하나 들이는 일, 창가에 리넨 커튼을 다는 일, 책상 위에 스탠드 조명을 올려두는 일처럼 ‘쉬운 것’에는 부담이 없다. 여기에 자신의 추억과 감성을 한 스푼 더하면 금세 ‘나만의 것’으로 변모한다. 흔히 진부한 표현을 뜻하는 ‘클리셰’는 인쇄 작업에서 편의를 위해 연판을 뜨던 기술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래서 ‘판에 박힌 듯 생명력 없다’는 뉘앙스를 갖게 됐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본받다’는 말과도 통한다. 누군가의 장점을 내 삶에 적용해 나만의 스타일로 만든다는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는 수납이다. 찾고 싶은 물건이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집은 그 자체로 더 빛난다. 그렇다면 ‘물건의 제자리’는 어디일까. 각 공간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주변이 물건의 자리가 된다. 현관, 거실, 주방, 침실 등 공간에서 자신이나 가족의 행동을 떠올린 뒤 그 활동 주변에 물건을 분산해 수납하면 집 정리도 쉬워지고 생활도 한층 편리해진다. 특히 거실과 주방에는 카트형 이동 가구를 두면 매우 유용하다.

세 번째는 분위기다. 단기간에 만들어진 분위기는 쉽게 사라진다. 예쁜 의자나 카펫 등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이전에 살던 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의 분위기는 외모뿐 아니라 말투, 자세, 타인을 대하는 태도 등 오랜 시간 축적된 자신의 모습에서 나온다. 집의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자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두툼한 암막 커튼을 고르고, ‘침대 시트의 촉감은 어떤 느낌이 맞을까?’를 생각하며 부드럽고 촘촘한 소재를 찾는 과정 등을 통해 집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인생이라면, 방을 가꾸는 시간은 그중에서도 가장 깊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결국 자신을 알아가는 일과 자신의 집을 가꾸는 일은 같은 의미를 지닌다.
네 번째, 집을 잘 가꾸는 방법은 물건을 사랑하는 것이다. 물건을 사랑한다는 말은 곧 물건을 신중하게 골라 구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물건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알고 나면 그 물건이 달리 보인다. 물건의 효과와 사용법을 정확히 이해하면 내 생활에 맞는 물건을 선택할 수 있고, 그만큼 더 잘 쓰게 된다. 사용한 뒤 깨끗이 손질해 제자리에 두는 습관도 중요하다. 이런 태도가 쌓이면 물건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또 오랜 세월 손에 익은 물건은 어느 순간 또 다른 내가 된다. 이 과정이 물건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오래 사용한 물건들이 모여 집의 분위기와 취향을 만든다.
개인적으로 ‘집을 꾸민다’보다 ‘집을 가꾼다’라는 표현을 더 좋아한다. ‘가꾼다’에는 집을 하나의 생명체처럼 대하는 태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을 가꾸는 것은 결국 나를 가꾸는 것이기도 하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나는 절대 안 먹는다”…심장 전문의가 끊은 음식 3가지
-
2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3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4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5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6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7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8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
9
“뇌에 칩 심겠다”…시각장애 韓유튜버, 머스크 임상실험 지원
-
10
“장동혁 서문시장 동선 따라 걸은 한동훈…‘압도한다’ 보여주려”[정치를 부탁해]
-
1
‘尹 훈장’ 거부한 교장…3년만에 李대통령 훈장 받고 “감사”
-
2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3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4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5
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
6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지명…‘이화영 변호인’ 정일연, 권익위원장
-
7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8
한동훈 “나를 탄핵의 바다 건너는 배로 써달라…출마는 부수적 문제”
-
9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10
“정파적 우편향 사상, 신앙과 연결도 신자 가스라이팅도 안돼”
트렌드뉴스
-
1
“나는 절대 안 먹는다”…심장 전문의가 끊은 음식 3가지
-
2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3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4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5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6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7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8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
9
“뇌에 칩 심겠다”…시각장애 韓유튜버, 머스크 임상실험 지원
-
10
“장동혁 서문시장 동선 따라 걸은 한동훈…‘압도한다’ 보여주려”[정치를 부탁해]
-
1
‘尹 훈장’ 거부한 교장…3년만에 李대통령 훈장 받고 “감사”
-
2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3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4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5
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
6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지명…‘이화영 변호인’ 정일연, 권익위원장
-
7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8
한동훈 “나를 탄핵의 바다 건너는 배로 써달라…출마는 부수적 문제”
-
9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10
“정파적 우편향 사상, 신앙과 연결도 신자 가스라이팅도 안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시작은 과거를 지우는 일?… 새해는 지난해를 깊게 새길 때 열린다[김대균의 건축의 미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12/31/133071853.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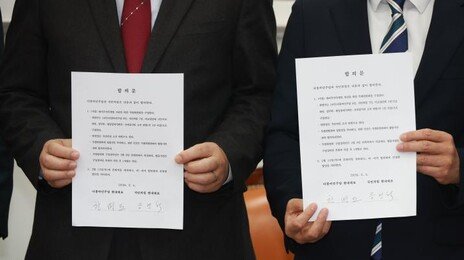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