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DBR]모바일 솔루션 업체 강자 ‘유라클’
-
입력 2009년 9월 26일 02시 56분
글자크기 설정


기술 못지않게 세밀한 포트폴리오 기획-관리
경제위기 속에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
모바일 솔루션 업체인 유라클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회사는 모바일 증권거래 시스템 분야 국내 1위이며, 방송금융(IPTV를 통한 금융정보 제공)과 U-헬스케어 솔루션 등 신규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동아비즈니스리뷰(DBR) 42호 ‘DBR 케이스 스터디’ 코너에 실린 유라클의 성공비결을 요약한다.
○ 꾸준한 사업 확장
조준희 유라클 사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신사업 개발을 성공 비결로 꼽았다. 도전정신은 중소기업답지 않은 꾸준한 사업 확장으로 구체화됐다. 유라클은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첫째는 관련 분야 진출을 통한 채널 다양화다. 모바일 금융거래 솔루션을 TV와 홈 네트워크용으로 확대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 유라클은 기술이 아니라 고객에게 초점을 맞춰 새 사업 영역을 발견했다.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40, 50대 고객이 금융 이외에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건강’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은행의 개인뱅킹(PB) 서비스가 고객의 자산 관리 이외에 병원 소개·예약 업무도 대신해 준다는 점에서 힌트를 얻었지요. 또 자체 기술력으로 관련 서비스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2005년 첫발을 내디딘 U-헬스케어 사업은 지난해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유라클은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1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U-헬스케어 서비스를 개시했다. 앞으로 2만 가구에 추가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U-헬스케어 고객들은 자신의 집에 설치된 건강측정 기기로 혈압과 맥박, 체지방량 등을 점검할 수 있고, 이상을 발견하면 유무선 통신망을 활용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
○ 기술 못지않게 경영전략에도 중점
많은 벤처기업이 보통 한 분야에 집중해 ‘끝장’을 보려고 한다. 하지만 기술 중심주의는 때로 경영관리 측면에서 부실을 부른다. 유라클은 이런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전략과 기술에 모두 공을 들였다.
조 사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甲乙)’ 관계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기는 문제에 대해 예상과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에 제대로 된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윈윈(win-win)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를 짤 때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대기업이 못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만약 유라클이 A그룹의 정보기술(IT) 계열사가 잘하는 분야와 관련해 A그룹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기술을 뺏길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기업 계열사가 못하는 것을 하면 그럴 확률이 줄어듭니다.”
유라클이 보통 삼자구도로 사업을 구성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U-헬스케어 사업은 유라클과 포스코건설, 서울대병원이 함께한다. 이러면 ‘힘의 균형’이 생겨 주도권이 한쪽으로 쏠리기 어렵다. 한 곳이 빠지면 전체 협력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누구도 섣불리 배신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조 사장은 현재의 벤처기업 풍토에도 일침을 가했다.
“벤처기업은 단순히 기술을 자랑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이 없다는 게 참 서글픈 일이지요.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진정한 기업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배수진 인턴연구원 연세대 경영학과 4학년
|
DBR >
-

함께 미래 라운지
구독
-

글로벌 이슈
구독
-

글로벌 현장을 가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DBR]중국 가전의 약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04/133090693.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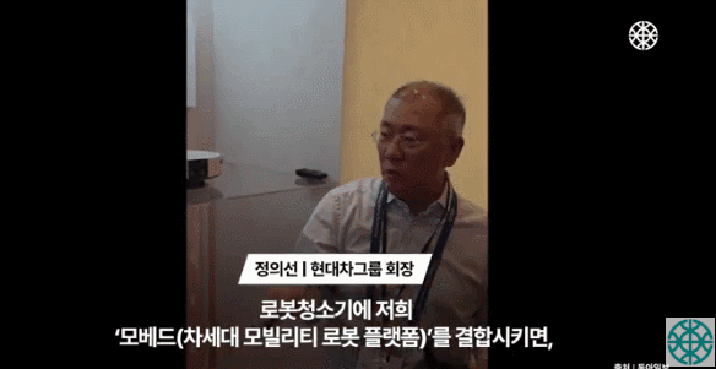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