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동아광장/박효종]민족주의에 눈감은 ‘親日발표’
-
입력 2005년 8월 31일 03시 06분
글자크기 설정
그들의 발표는 두 가지 가정 위에서 이뤄졌다. 친일행위는 명백히 정의될 수 있고, 또 친일행위를 한 인물들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 친일 개념을 내세운 것이나 직위만으로 친일을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과연 이 잣대는 견고한가. 발표자 가운데 누가 봐도 명백한 친일 인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친일 딱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
일단 친일에 대한 ‘사실적 판단’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즉 기록의 신빙성 문제로서, 예를 들면 일제강점 말기 전쟁 참여를 독려한 내용으로 신문에 실린 글들 중에는 다른 사람이 대필한 것도 꽤 있기 때문이다. 한편 ‘평가적 판단’의 불확실성도 문제다. 공과(功過)를 따져야 할 친일 인사가 적지 않다면, ‘과’보다 ‘공’이 많은 사람들까지 반민족적 친일파로 낙인찍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연구소는 생계형 친일과 직위형 친일을 구분했지만, 이 구분은 지극히 자의적이다. 만일 일제강점기에 직위와 명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 죽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 자체를 민족적 죄악으로 치부한다면, 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다. 35년에 걸친 유례없이 엄혹했던 일제강점 시절, 자신의 조선 이름을 버리고 창씨개명해야 했던 상황, 초중고등학교의 스승을 모두 일본인으로 기억해야 했던 상황, 신사참배를 해야 했던 상황, 그것은 시대의 아픔이며 민족적 아픔이었다. 오죽했으면 이상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절규했겠는가. 그러나 그 시절, 이 땅에도 우리의 민족혼이 한 가닥 남아 있어 8·15 광복이 되자마자 3000만 모두 길가로 뛰쳐나와 만세를 불렀다면, 그것은 어찌된 영문일까. 혹시 불량배의 바짓가랑이 사이를 기어간 한신처럼, 일제의 바짓가랑이 사이를 기면서도 민족혼을 살아 꿈틀거리게 했던 민족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산 사람들과 마주하면 죽은 자들은 늘 약자다. 산 사람들과 달리 죽은 이들은 집단행위도 할 수 없고, 스스로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후세 사람들의 선고와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가 그들을 평가하는 데는 지금의 ‘외재적 잣대’로 살생부(殺生簿)를 작성하겠다는 오만을 버리고 그야말로 ‘내재적 접근’을 해야 한다. 만일 박정희 개인이 대통령이 아니고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친일파로 분류됐을까. 그가 ‘토지’에 나오는 김두수처럼 애국지사를 검거하고 고문한 고등계 형사가 아닌 바에야 일본 육사를 나왔다고 해서 일제 잔재 청산의 대상으로 낙인찍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의 발표에 잘못이 있다면, 친일과 반일을 넘어서는 민족주의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광복 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친일파 청산이었다고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그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미군정,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선 친일파가 득세했고 그 결과 우리 체제는 친일파 지배구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친일문제보다 그 내포하는 바가 크고 엄숙한 것이다. 사악한 반(反)민족주의자가 누구였으며 진정한 민족주의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 육사를 나왔다고 해도 국가를 중흥시켰으면 민족주의자다. 또 일제강점기에 신문사와 학교를 경영했어도 민족혼을 불어넣는 데 일조했다면 민족주의자다. 오스카 와일드가 말했던가. “진실은 순수하거나 단순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지극히 순수하고 단순한 진실’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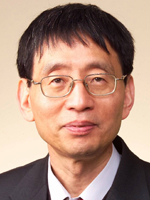 |
박효종 객원논설위원·서울대 교수·정치학 parkp@snu.ac.kr
동아광장 >
-

횡설수설
구독
-

손효림의 베스트셀러 레시피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트렌드뉴스
-
1
美, 최신예 미사일 ‘프리즘’ 이란서 처음 쐈다…“추종 불허 전력”
-
2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
3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4
“美영사관서 ‘쾅쾅’ 뒤 호텔바닥 부르르… 비행기 소리에 떨었다”
-
5
[단독]“두건 쓴 무장경비대 길목마다 검문…택시로 20시간 달려 탈출”
-
6
추미애 “공소청법, 제왕적 검찰총장 못 막아”…정부안에 반발
-
7
美상원, ‘이란 공격 중단 결의안’ 부결…트럼프 제동 실패
-
8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9
10억 투자하면 영주권… 2027년까지 연장
-
10
한동훈 “尹 김경수 복권때 반대했는데…결국 공천받게 됐다”
-
1
[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
2
李 “주유소 휘발유 값 폭등…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해”
-
3
李 “‘다음은 北’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 있어…무슨 득 있나”
-
4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
5
[단독]한미, 주한미군 무기 중동으로 차출 협의
-
6
트럼프, 결국 ‘대리 지상전’…쿠르드 반군 “美요청에 이란 공격”
-
7
與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단수 공천
-
8
김어준에 발끈한 총리실…“중동 대책회의 없다고? 매일 챙겼다”
-
9
與 “조희대 탄핵안 마련”… 정청래는 “사법 저항 우두머리냐”
-
10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트렌드뉴스
-
1
美, 최신예 미사일 ‘프리즘’ 이란서 처음 쐈다…“추종 불허 전력”
-
2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
3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4
“美영사관서 ‘쾅쾅’ 뒤 호텔바닥 부르르… 비행기 소리에 떨었다”
-
5
[단독]“두건 쓴 무장경비대 길목마다 검문…택시로 20시간 달려 탈출”
-
6
추미애 “공소청법, 제왕적 검찰총장 못 막아”…정부안에 반발
-
7
美상원, ‘이란 공격 중단 결의안’ 부결…트럼프 제동 실패
-
8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9
10억 투자하면 영주권… 2027년까지 연장
-
10
한동훈 “尹 김경수 복권때 반대했는데…결국 공천받게 됐다”
-
1
[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
2
李 “주유소 휘발유 값 폭등…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해”
-
3
李 “‘다음은 北’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 있어…무슨 득 있나”
-
4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
5
[단독]한미, 주한미군 무기 중동으로 차출 협의
-
6
트럼프, 결국 ‘대리 지상전’…쿠르드 반군 “美요청에 이란 공격”
-
7
與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단수 공천
-
8
김어준에 발끈한 총리실…“중동 대책회의 없다고? 매일 챙겼다”
-
9
與 “조희대 탄핵안 마련”… 정청래는 “사법 저항 우두머리냐”
-
10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동아광장/이정은]그 많던 핵무기 재료는 지금 어디 있을까](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2/05/133308751.1.png)

![[동아광장/이정은]그 많던 핵무기 재료는 지금 어디 있을까](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308751.1.thumb.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