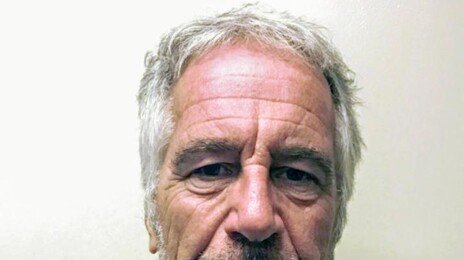공유하기
[권삼윤의 문명과 디자인]흙-문자-창고-도시
-
입력 2000년 4월 24일 19시 26분
글자크기 설정
▼흙, 인류-문명이 빚어낸 '영원한 粒子'▼
우르는 인류 최초의 낙원인 에덴동산에서 가히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한 창세의 땅이자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수메르 왕국의 도읍지이며, 창세기에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의 고향이라 기록된 곳이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이곳에선 20세기 초 찬란한 황금유물이 쏟아져 나왔을 뿐 아니라 5000년 전에 세워진 계단식 피라미드인 지구라트(ziggurat)가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나 우르는 쉽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우선 이라크로 들어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걸프전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서방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어 외국인에게 비자발급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르단 주재 이라크대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고 무려 35일이나 기다리고서야 겨우 손에 쥘 수 있었다. 그리고는 사막 길을 22시간 달려 바그다드에 닿았는데 진짜 문제는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350km 떨어져 있는 우르로 가는 일이었다. 바그다드를 제외한 지역은 후세인 정부의 힘이 미치지 않아 모두 위험지역이었는데 우르가 있는 남부는 그 정도가 심했다.
애태운 자에 대한 보상인지 지구라트는 참으로 늠름했다. 5000년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현지 관리인에 따르면 밑변의 각 모서리는 동서남북 네 방위를 정확히 가리키고 원래는 4층이었으나 지금은 2층까지만 남아 있다. 정면으로 난 긴 계단을 밟고 정상에 오르니 모든 것이 규격 흙벽돌로 되어 있어 깔끔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무슨 기호처럼 보이는 쐐기문자가 적힌 것도 있었다. 그것은 인류 최초의 문자인데도 해독이 가능했다. “도적질을 하지 마라” “간음을 하지 마라” “한눈 팔지 말고 공부하라” 같은 글귀에서 고대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길가메시 서사시’를 읽으며 수메르인들의 영웅적인 삶과 사랑을 그려볼 수 있으며, ‘지우수드라 홍수이야기’를 통해 구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실임도 알게 되었다.
인간은 문자를 통하여 시공을 초월한 커뮤니케이션의 길을 열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몸밖에 별도의 기억장치를 만들어 자신의 생물학적 수명과는 관계없이 그의 생각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문자의 사용으로 의사(意思)의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많은 상품의 거래 또한 이루어지게 됐고 이러한 거래에 따르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전도 편찬됐다. 시장(市場)은 사회가 되고 그것은 다시 도시가 되면서 문명이 태어났다.
지구라트 정상은 허물어진 채로 있어 거칠게 보였으나 전망은 좋았다. 일대가 한눈에 다 들어왔다. 보이는 것은 온통 황토색 벌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두 강이 쉴새 없이 날라다 준 충적토가 쌓여 생긴 땅이라 평평했고 돌 같은 것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높다란 나무도 없다. 흙이 유일한 자원이다. 지구라트는 물론 그 아래로 보이는 도시의 흔적 또한 흙벽돌 더미다. 성벽, 건물, 창고, 수로, 모두가 그러하다. 다같이 강을 끼고 태어났는데도 이집트와 달리 메소포타미아는 흙 문화권이다. 그것도 끈적끈적한 진흙문화권이다.
진흙은 돌보다 다루기 쉽다. 자기의 뜻대로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며 그것을 장식하기도 쉽다. 생각을 문자로 표현할 줄 알았던 수메르인들은 내친 김에 이 흙으로 삶의 모든 공간들을 자신들의 뜻대로 짓고 건설했다. 그들은 정말 창의적이었다. 여기서 보니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구약의 이야기가 전혀 낯설게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점토는 물에 약하므로 물과 닿으면 쉽게 형태가 변한다. 그래서 늘 돌보아주어야 한다. 이런 특성을 가진 흙으로 문명을 일으킨 수메르인들의 삶의 방식은 어쩌면 틀에 박힌 것을 쫓는 산업화 사회보다는 꿈과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문화의 컨텐츠를 살찌우지 않으면 살아 남기 힘든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 창의력의 시대에 더 어울린다.
수메르는 도시국가 체제였다. 도시 그 자체가 하나의 국가였던 것이다. 도시는 일정한 지역적 공간을 토대로 한 코스모스(질서의 세계). 따라서 외부의 카오스(혼돈의 세계)와 구별짓기 위해 바깥에다 성벽을 둘렀다. 내부는 보호신의 영역이므로 고유의 신을 모시는 신전이 세워졌다. 우르의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지구라트는 그들의 최고신이자 수호신이었던 달(月)의 신을 위한 신전이었다. 그러므로 그건 최고, 최대의 공적(公的) 공간으로서 성역이었다. 지금도 남아 있는 거대한 형체가 이를 말해주고도 남는다.
지구라트 앞에는 건물의 흔적인 듯한 벽돌 조각들만 나뒹굴고 있어 그것들이 각기 어떤 기능을 행했는지 짐작하기가 쉽지 않으나 “이곳에는 몇 개의 작은 신전과 신관들의 방, 왕궁과 왕묘, 창고, 문서보관소 등이 있었다”고 한 최초 발굴자 레오날도 울리의 말을 떠올리면 도시란 것도 집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주머니가 여럿 달린 옷 같다. ‘역사 속의 도시’(1961)를 쓴 문명사가 루이스 멈포드는 그래서 “도시는 용기(容器)“라고 말했던 것이다.
인류가 정착과 농경에 성공한 후 잉여생산물을 갖게 되면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은 토기였다. 그 다음에 창고를 지었다. 수메르인들은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성벽을 둘러 도시라는 큰 용기를 만들고는 그 속에다 저렇게 물질적인 잉여를 보관하는 창고와 함께 지식과 정보를 쌓아두는 문서보관소를 두었다.
인간이란 늘 지금 가진 것보다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갖고자 하였으니 후대의 도시라고 해서 우르인들이 만든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이는 작은 디스켓 속에 더 값진 정보를 더 많이 담고자 애쓰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처럼 한번 그려진 디자인(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릴 적에 제대로 그려야 하는 것이다.
권삼윤(문명비평가) tumida@hanmail.net
어린이 레포츠 >
-

밑줄 긋기
구독
-

동아시론
구독
-

우아한 라운지
구독
트렌드뉴스
-
1
[단독]폴란드, 韓 해군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 무상 양도 안받기로
-
2
‘노인 냄새’ 씻으면 없어질까?…“목욕보다 식단이 더 중요”[노화설계]
-
3
李대통령 “큰 거 온다…2월 28일 커밍순”, 뭐길래?
-
4
李 “나와 애들 추억묻은 애착인형 같은 집…돈 때문에 판 것 아냐”
-
5
‘연대생’ 졸리 아들, 이름서 아빠 성 ‘피트’ 뺐다
-
6
대구 찾은 한동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설것” 재보선 출마 시사
-
7
4급 ‘마스가 과장’, 단숨에 2급 국장 파격 직행…“李대통령 OK”
-
8
K팝 걸그룹에 손등 키스…룰라가 반색한 아이돌 누구?
-
9
한국인의 땀과 살과 주름을 그린 화가 황재형 별세
-
10
밥과 빵, 냉동했다가 데워먹으면 살 빠진다?[건강팩트체크]
-
1
‘똘똘한 한채’ 겨냥한 李…“투기용 1주택자, 매각이 낫게 만들것”
-
2
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 중도층서 9%로 역대 최저
-
3
국힘서 멀어진 PK…민주 42% 국힘 25%, 지지율 격차 6년만에 최대
-
4
李 “나와 애들 추억묻은 애착인형 같은 집…돈 때문에 판 것 아냐”
-
5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개혁 반발 고조
-
6
“정원오, 쓰레기 처리업체 후원 받고 357억 수의계약”
-
7
대구 찾은 한동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설것” 재보선 출마 시사
-
8
[사설]계엄 때보다 낮은 지지율 17%… 국힘의 존재 이유를 묻는 민심
-
9
오늘 6시 이준석·전한길 토론…全측 “5시간 전에 경찰 출석해야”
-
10
‘4심제’ 재판소원법 與주도 국회 통과…헌재가 대법판결 번복 가능
트렌드뉴스
-
1
[단독]폴란드, 韓 해군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 무상 양도 안받기로
-
2
‘노인 냄새’ 씻으면 없어질까?…“목욕보다 식단이 더 중요”[노화설계]
-
3
李대통령 “큰 거 온다…2월 28일 커밍순”, 뭐길래?
-
4
李 “나와 애들 추억묻은 애착인형 같은 집…돈 때문에 판 것 아냐”
-
5
‘연대생’ 졸리 아들, 이름서 아빠 성 ‘피트’ 뺐다
-
6
대구 찾은 한동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설것” 재보선 출마 시사
-
7
4급 ‘마스가 과장’, 단숨에 2급 국장 파격 직행…“李대통령 OK”
-
8
K팝 걸그룹에 손등 키스…룰라가 반색한 아이돌 누구?
-
9
한국인의 땀과 살과 주름을 그린 화가 황재형 별세
-
10
밥과 빵, 냉동했다가 데워먹으면 살 빠진다?[건강팩트체크]
-
1
‘똘똘한 한채’ 겨냥한 李…“투기용 1주택자, 매각이 낫게 만들것”
-
2
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 중도층서 9%로 역대 최저
-
3
국힘서 멀어진 PK…민주 42% 국힘 25%, 지지율 격차 6년만에 최대
-
4
李 “나와 애들 추억묻은 애착인형 같은 집…돈 때문에 판 것 아냐”
-
5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개혁 반발 고조
-
6
“정원오, 쓰레기 처리업체 후원 받고 357억 수의계약”
-
7
대구 찾은 한동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설것” 재보선 출마 시사
-
8
[사설]계엄 때보다 낮은 지지율 17%… 국힘의 존재 이유를 묻는 민심
-
9
오늘 6시 이준석·전한길 토론…全측 “5시간 전에 경찰 출석해야”
-
10
‘4심제’ 재판소원법 與주도 국회 통과…헌재가 대법판결 번복 가능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어린이레포츠]실내 인공암벽 등반 끈기-지구력 키워](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2/02/05/684754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