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기자의 눈]지방大부실, 교육부 책임은?
-
입력 2004년 9월 1일 18시 51분
글자크기 설정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은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하되 부실 대학은 퇴출시키겠다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이 같은 ‘극약처방’을 내놓은 데는 대학들이 양적 팽창에만 주력한 나머지 질적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대로 방치하면 결국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돼 있다.
사실 그동안 한국 대학들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1970년 142개이던 전문대와 대학이 현재는 359개로 늘어났고 대학생도 180만명으로 12배나 증가했다. 이런 교육열의 힘이 오늘날 한국을 세계 교역규모 12위의 국가로 끌어올린 원동력이 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대학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학 진학률은 81.3%로 미국(63.3%)이나 일본(49.1%)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대학 경쟁력 평가에서는 세계 28위에 불과하다. 국내 최고라는 서울대는 세계 100대 대학에도 끼지 못하고 지방에는 대학이란 말이 무색한 정도의 대학이 수두룩하다.
교육부는 한계에 이른 대학 문제를 논할 때마다 대학, 특히 지방대들의 방만한 운영과 무사안일을 비판하지만 교육부도 부실 대학을 만들어 낸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대학 부실의 배경에는 교육부가 과거에 학과 정원을 몇 명 늘리는 데까지 간섭하면서도 정작 장기적 인력수급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정책을 펴 온 탓이 크다. 정치인들의 민원 때문에 영남에 대학을 하나 세우면 무마성으로 호남에도 대학을 세워 준 경우가 없지않다.
1995년 교육개혁 이후에는 일정 조건만 갖추면 대학을 세울 수 있는 ‘대학준칙주의’가 도입돼 우후죽순 식으로 무려 57개의 대학이 새로 설립됐다. 문민정부 말기에는 ‘대학 자율화’를 내세워 무더기 증원을 허용했다.
최근 울산에 국립대 설립 공약을 지키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도 이견이 분분하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의 와중에 공약이라는 이유로 대학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이인철 교육생활팀 inchul@donga.com
기자의 눈 >
-

기고
구독
-

포토 에세이
구독
-

횡설수설
구독
![KLPGA, 시드권 특전 주며 스스로 권위 날렸다[기자의 눈/김정훈]](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11/07/13272798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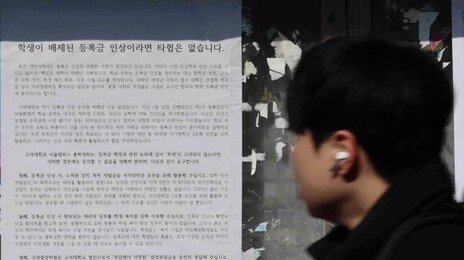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