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화문에서/이형삼]대(竹) 그림자, 달빛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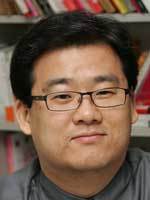
법정 스님 1주기에 출간된 사진집 ‘비구, 법정法頂’에 눈길을 오래 붙잡는 사진이 있다. 스님이 양손에 찻잔과 안경을 들고 앉은 모습, 그리고 빳빳하게 ‘각’을 잡은 행전을 차고 걷는 뒷모습이다. 두 장 모두 스님의 얼굴은 담지 않았지만 그의 면모를 오롯이 압축해 보여준다. 찻잔과 안경은 글을 가까이한 스님에게 평생의 벗이었을 텐데, 그것을 쥔 손은 울퉁불퉁한 농부의 손이다. 만년에 제자들의 보살핌을 마다하고 “나는 혼자 죽 끓여먹을 팔자”라며 산골 오두막에서 홀로 수행한 흔적이다. 겨울이면 꽝꽝 얼어붙은 개울에 도끼를 내리쳐 마실 물을 길었다. 행전은 바짓가랑이를 가든하게 둘러싸려고 무릎 아래에 매는 헝겊인데, 여간 단정하고 바지런하지 않으면 건사하기 힘든 물건이라 요즘은 절집에서도 보기 드물다고 한다.
법정 스님과 교분이 두터운 이들을 취재한 적이 있다. 직업, 종교, 나이, 이념 성향이 제각각인 사람들이 속가(俗家) 상좌들처럼 그를 따르는 이유가 궁금했다. 그런데 그들이 묘사한 스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인자한 ‘산부처’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까다롭고 괴팍스러운 영감님’이라 했다. 그런 성정은 스스로에게 혹독할 만큼 엄격한 태도에서 비롯된 듯했다.
스님은 방문객이 계속 몰려들면 어느 순간 딱 선을 긋고 “법당에 절이나 하고 가시오”라며 매몰차게 돌아섰다. 말씀 한마디 들으러 먼 지방에서 찾아온 이들도 하릴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사정을 전하면 “수행자는 때로 인정이 없어야 한다. 만나자는 사람 다 만나주면 내 공부는 언제 하느냐”고 했다. 명리에 어정쩡하게 매달리지 않기에 무 자르듯 맺고 끊을 수 있는 절제다.
어느 세무공무원은 스님에게서 이런 글귀를 받았다. ‘대 그림자 뜰을 쓸어도 먼지 한 톨 일지 않고, 달이 물 밑을 뚫어도 물 위엔 흔적조차 없네.’ 곧게 뻗은 대(竹) 그림자가 뜰을 쓸어내고 환한 달빛이 물 밑을 샅샅이 비추는데 정작 대와 달은 있는 듯 없는 듯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세리(稅吏)도 가슴 깊이 새길 덕목이지만 이는 스님이 일생토록 실천해 온 종교인의 자세와도 닮아 있지 않을까.
이슬람채권법안과 관련해 기독교계에서 대통령 하야 발언이 나오더니, 대통령을 무릎 꿇린 통성기도를 놓고 불교집회에서도 “장로 대통령은 하야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라”는 말이 나왔다. ‘대 그림자’와 ‘달빛’ 같은 종교지도자들의 처신이 아쉽다. 다행히 같은 집회에서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이 “불교가 홀대받는 것은 스스로 화합, 결속하지 못했고 사회적 역할도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칼끝을 돌리고 자성을 촉구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부처에 얽매이면 참부처를 볼 수 없고, 보살에 얽매이면 진짜 보살행을 할 수 없다”던 법정 스님의 설법이 비단 불자들만 귀 기울여야 할 경구는 아닐 것이다.
이형삼 출판국 전략기획팀장 hans@donga.com
트렌드뉴스
-
1
롤스로이스 끌고다니던 아파트 주민… 알고보니 ‘1.5조 돈세탁’ 총책이었다
-
2
임성근, 폭행 등 전과 6회…“방송 출연 중단하겠다”
-
3
대상포진 백신, 뜻밖의 효과…치매 위험↓ 노화 속도↓
-
4
러시아 폭설의 위력…아파트 10층 높이 쌓여 도시 마비
-
5
[김순덕 칼럼]팥쥐 엄마 ‘원펜타스 장관’에게 700조 예산 맡길 수 있나
-
6
트럼프 “그린란드 협상 틀 마련”…유럽 8개국에 보복관세 철회
-
7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
8
태양계 행성 탄생 비밀, 韓연구진이 풀었다
-
9
현대차, 시총 100조 돌파… 멈추지 않는 ‘아틀라스’ 효과
-
10
“트럼프 싫다”… ‘MANA’ 외치는 그린란드 주민들
-
1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2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3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4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5
[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
6
李 “일부 교회, 설교때 이재명 죽여야 나라 산다고 해”
-
7
李 “정교유착, 나라 망하는길…‘이재명 죽여라’ 설교하는 교회도”
-
8
韓은 참여 선그었는데…트럼프 “알래스카 LNG, 韓日서 자금 확보”
-
9
李 “환율 잘 견디고 있어…우리 정책만으론 원상회복 어려워”
-
10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트렌드뉴스
-
1
롤스로이스 끌고다니던 아파트 주민… 알고보니 ‘1.5조 돈세탁’ 총책이었다
-
2
임성근, 폭행 등 전과 6회…“방송 출연 중단하겠다”
-
3
대상포진 백신, 뜻밖의 효과…치매 위험↓ 노화 속도↓
-
4
러시아 폭설의 위력…아파트 10층 높이 쌓여 도시 마비
-
5
[김순덕 칼럼]팥쥐 엄마 ‘원펜타스 장관’에게 700조 예산 맡길 수 있나
-
6
트럼프 “그린란드 협상 틀 마련”…유럽 8개국에 보복관세 철회
-
7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
8
태양계 행성 탄생 비밀, 韓연구진이 풀었다
-
9
현대차, 시총 100조 돌파… 멈추지 않는 ‘아틀라스’ 효과
-
10
“트럼프 싫다”… ‘MANA’ 외치는 그린란드 주민들
-
1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2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3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4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5
[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
6
李 “일부 교회, 설교때 이재명 죽여야 나라 산다고 해”
-
7
李 “정교유착, 나라 망하는길…‘이재명 죽여라’ 설교하는 교회도”
-
8
韓은 참여 선그었는데…트럼프 “알래스카 LNG, 韓日서 자금 확보”
-
9
李 “환율 잘 견디고 있어…우리 정책만으론 원상회복 어려워”
-
10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박선희]이중 요금제 도입하는 주요국… 한국 문화재라고 안 될 것 있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21/133206262.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