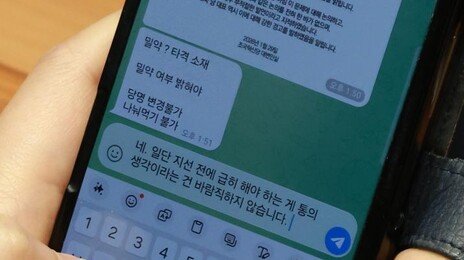공유하기
[소설]오래된 정원 (79)
-
입력 1999년 4월 1일 18시 45분
글자크기 설정
정희에게
네가 왔던 게 벌써 한 달이나 지났구나. 지금 여기는 벌써 겨울이야. 남도의 겨울은 철새들이 날개에 담아 가지구 오지. 물오리들이 저수지와 개울가에서 우짖는 소리들이 들려와. 대나무 잎 끝이 누릿누릿 마르기 시작했고 감나무 꼭대기엔 까치밥만 몇 알씩 달려있다. 너두 찬성했지. 우리가 옛말 사전을 들추며 골라냈지. 은결이라구. 햇빛에 강물이 반짝이는 걸 은결이라구 한다지. 은결이는 이젠 막 기어다닐 정도야. 방이 좁아서 보행기에 얹어 놓을 순 없지만 그렇다구 바깥의 내 작업실 바닥에 내놓을 수도 없잖아. 방안은 온통 그애 물건으로 가득찼어. 여기서 우리는 겨울을 나고 봄에나 올라가게 될 것 같다. 네가 어머니에게 넌지시 말을 깔아 놓는 게 충격을 줄일지두 모른다구 그랬던 게 생각나. 그 때는 반대했었는데 어머니가 당장에 이리루 달려오실까봐 그랬어. 내가 여길 떠나기 며칠 전에 네게 편지하마. 그때쯤 말을 꺼내주지 않겠니? 너는 오 선생에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구 그랬는데 그건 절대루 안된다. 그에게는 지금 자신의 일 말고도 평생을 걸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은 거야. 참, 그에게서 엽서가 왔어. 그는 무기징역으로 확정되었어. 나는 예상은 하구 있었지만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망연히 앉아서 그의 엽서를 몇번이나 보고 또 보고는 했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는 그 전에 나올지두 모르지. 하여튼 나는 그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해주지 않을 생각이야. 아니면 그가 스스로 알게 될 때까지 절대로. 어째서 이런 예감이 드는 걸까. 나는 다시는 그와 만날 수 없다는 불길한 생각으로 누웠다가 소스라쳐 일어나기도 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가 은결이 얘기를 해주기 바란다.
<글:황석영>
화제의 당선자 >
-

사설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트렌드뉴스
-
1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폭탄…월요일 출근길 비상
-
2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5
60조 캐나다 잠수함 입찰 앞둔 한화, 현지에 대대적 거리 광고
-
6
美 군사작전 임박?…감시 항공기 ‘포세이돈’ 이란 인근서 관측
-
7
한국인의 빵 사랑, 100년 전 광장시장에서 시작됐다
-
8
0.24초의 기적…올림픽 직전 월드컵 우승 따낸 ‘배추 보이’ 이상호
-
9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10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7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8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9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10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트렌드뉴스
-
1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폭탄…월요일 출근길 비상
-
2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5
60조 캐나다 잠수함 입찰 앞둔 한화, 현지에 대대적 거리 광고
-
6
美 군사작전 임박?…감시 항공기 ‘포세이돈’ 이란 인근서 관측
-
7
한국인의 빵 사랑, 100년 전 광장시장에서 시작됐다
-
8
0.24초의 기적…올림픽 직전 월드컵 우승 따낸 ‘배추 보이’ 이상호
-
9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10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7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8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9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10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4·15총선]공장-논밭-실험실서도 입성…이색경력 당선자들](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