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횡설수설/김충식]오리발
-
입력 2005년 7월 25일 03시 06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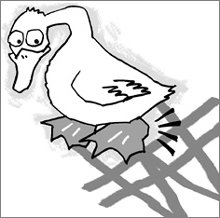
▷MBC는 지난 토요일 국가안전기획부의 ‘1997년 도청(盜聽) 문건’에 관해 보도했다. 그 속에는 당시의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이회창 씨가 지구당 위원장 회의에 들어가기 직전 오리발 2개를 주었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씨가 ‘오리발’을 뿌려서 당 장악에 성공했다는 얘기다.
▷‘오리발’이 정치권 용어가 된 데 대해서는 이런저런 설(說)이 있다. 불법자금이라 ‘시치미 떼고 주고받기 때문’이라는 설. 많이 받고도 조금 받은 것처럼 손을 내젓기 때문이라는 설. 받은 뒤, 추궁당하면 안 받았다고 잡아떼며 손사래 치기 때문이라는 설. 오리가 물밑에서 물갈퀴를 움직여 헤엄치듯이 돈이 정치이면(裏面)의 윤활유 또는 동력이기 때문이라는 설. 하지만 정설은 없다. 설들의 합(合)이 정설일까. 아무튼 오리발은 현금이 대부분이지만 수표로도 내려갔다. 5공화국 시절 여당 상층부가 내려준 수표를 ‘쌈짓돈’으로 챙겼다가 정보기관의 추적을 받아 창피당한 의원들도 있었다.
▷‘오리발 횡재’라는 것도 있다. 당선이 확실한 여당 실세(實勢)는 선거 때 축재(蓄財)의 기회를 맞는다. 5공의 군 출신 C 씨는 13대 총선 때 돈을 신나게 뿌리고도 헌금이 넘쳐 50억 원이나 남겼다. 그는 “선거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며 콧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낙선해도 ‘남는 장사’였던 후보들의 얘기는 역대 선거에서 끊이지 않았다. ‘오리발’이라는 말이 정경사(政經史)에서 사라지고 국어사전의 사어(死語) 또는 고어(古語)가 되는 날은 언제쯤 올까.
김충식 논설위원 skim@donga.com
횡설수설 >
-

사설
구독
-

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
구독
-

동아경제 人터뷰
구독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2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3
취권하는 중국 로봇, ‘쇼’인 줄 알았더니 ‘데이터 스펀지’였다?[딥다이브]
-
4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5
백악관 “10% 임시관세, 24일 발효…핵심광물-승용차 제외”
-
6
[단독]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 서울 아파트로 제한 검토
-
7
김길리 金-최민정 銀…쇼트트랙 여자 1500m 동반 메달 쾌거
-
8
정동극장 이사장 ‘李지지’ 배우 장동직
-
9
30년 이상 고정 주담대 나온다는데…내 대출, 뭐가 달라질까?
-
10
“D램 품귀에 공장 100% 돌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가 증설 나서”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尹 “계엄은 구국 결단…국민에 좌절·고난 겪게해 깊이 사과”
-
3
유시민 “李공소취소 모임, 미친 짓”에 친명계 “선 넘지마라”
-
4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5
“尹 무죄추정 해야”…장동혁, ‘절윤’ 대신 ‘비호’ 나섰다
-
6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7
尹 ‘입틀막’ 카이스트서…李, 졸업생과 하이파이브-셀카
-
8
한동훈 “장동혁은 ‘尹 숙주’…못 끊어내면 보수 죽는다”
-
9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10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2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3
취권하는 중국 로봇, ‘쇼’인 줄 알았더니 ‘데이터 스펀지’였다?[딥다이브]
-
4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5
백악관 “10% 임시관세, 24일 발효…핵심광물-승용차 제외”
-
6
[단독]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 서울 아파트로 제한 검토
-
7
김길리 金-최민정 銀…쇼트트랙 여자 1500m 동반 메달 쾌거
-
8
정동극장 이사장 ‘李지지’ 배우 장동직
-
9
30년 이상 고정 주담대 나온다는데…내 대출, 뭐가 달라질까?
-
10
“D램 품귀에 공장 100% 돌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가 증설 나서”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尹 “계엄은 구국 결단…국민에 좌절·고난 겪게해 깊이 사과”
-
3
유시민 “李공소취소 모임, 미친 짓”에 친명계 “선 넘지마라”
-
4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5
“尹 무죄추정 해야”…장동혁, ‘절윤’ 대신 ‘비호’ 나섰다
-
6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7
尹 ‘입틀막’ 카이스트서…李, 졸업생과 하이파이브-셀카
-
8
한동훈 “장동혁은 ‘尹 숙주’…못 끊어내면 보수 죽는다”
-
9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10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BTS 광화문 공연 D-1개월[횡설수설/이진영]](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2/20/133392476.2.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