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화문에서]포스코와 한전사이
-
입력 2005년 7월 16일 03시 04분
글자크기 설정
포스코의 주가는 민영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딘 1998년 말 6만4500원에서 이달 15일 19만8500원으로 올랐다. 기업의 시장가치를 보여 주는 시가총액은 6조2230억 원에서 17조3060억 원으로 늘었다. 뉴욕과 런던에 이어 연내에 도쿄(東京) 증시에 상장되면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세계 3대 증시에서 주식이 거래된다.
수익성 외에 사회적 공헌과 윤리 경영도 인정받고 있다. 이 회사는 동아일보와 한국IBM BCS가 공동선정한 ‘2005년 존경받는 30대 한국기업’에서 금상을 받았다.
그럼 공기업의 현실은 어떨까.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들여다보자.
한전의 주가는 같은 기간 2만9800원에서 3만2200원으로, 시가총액은 18조7200억 원에서 20조6320억 원으로 달라졌다. 포스코의 주가와 시가총액이 각각 3.08배와 2.78배로 급증하는 동안 한전은 1.08배와 1.1배로 옆걸음질 쳤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뒷걸음질 친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비효율적 경영만 아니었다면 독점적 전력업체인 한전의 시장가치가 훨씬 높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2001년 4월 발전(發電) 부문을 떼 내 6개 자회사를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발전 부문 자회사의 5급 이상 간부는 분사(分社) 후 1008명 증가했다. 평균 연봉 1억5000만 원인 임원도 30명이 늘었다. 구조조정이 아니라 ‘자리 늘리기’였던 것이다.
포스코와 한전의 차이는 임원 진용에서도 드러난다.
포스코 임원 40명 가운데 ‘낙하산 인사’는 한 명도 없다. 16개 자회사 CEO도 마찬가지다. ‘포스코호(號)’를 이끄는 이구택 회장은 1969년 공채 1기로 입사해 36년간 실전(實戰) 경험을 쌓은 전문가다. 일을 소홀히 하면서도 봉급만 챙기는 ‘누크콩(누워서 크는 콩나물)’ 직원은 살아남지 못한다.
반면 한전은 낙하산이 즐비하다. 공무원 출신인 한준호 사장은 그래도 옛 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실장을 지냈으니 그렇다 치자. 최근 물의를 빚은 상근감사와 비상근감사, 비상임이사는 모두 전기와 무관한 집권세력 주변 사람이다.
6개 발전 자회사 가운데 5개사 감사도 여권(與圈) 인사다. 경력을 훑어보면 방만한 경영에 대한 견제는 고사하고 기업 대차대조표라도 볼 능력이 있을지 솔직히 의심스럽다.
 한전을 아는 사람들은 “인원을 절반 이하로 줄여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공기업 가운데 형편없는 수준이냐 하면 아니다. 한전은 공기업 평가에서 6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를 차지한 점을 자랑한다.
한전을 아는 사람들은 “인원을 절반 이하로 줄여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공기업 가운데 형편없는 수준이냐 하면 아니다. 한전은 공기업 평가에서 6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를 차지한 점을 자랑한다.
정부는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효율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다. 포스코와 한전의 현주소는 이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도대체 언제까지 공기업을 비효율과 낙하산이 난무하는 ‘세금 먹는 하마’로 그냥 놔둬야 하는 것일까.
권순활 경제부 차장 shkwon@donga.com
광화문에서 >
-

유상건의 라커룸 안과 밖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임용한의 전쟁사
구독
트렌드뉴스
-
1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2
‘1000억대 자산’ 손흥민이 타는 車 뭐길래…조회수 폭발
-
3
“성관계 몰래 촬영”…20대 순경, 전 여친 고소로 입건
-
4
‘100만 달러’에 강남 술집서 넘어간 삼성전자 기밀
-
5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6
“열차 변기에 1200만원 금팔찌 빠트려” 오물통 다 뒤진 中철도
-
7
“같은 사람 맞아?”…日 ‘성형 전후 투샷 인증’ 챌린지 유행
-
8
도서관 책에 줄 그은 김지호…“조심성 없었다” 사과
-
9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10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
3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4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
-
5
장동혁 “내 이름 파는 사람, 공천 탈락시켜달라”
-
6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7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8
與의원 105명 참여 ‘공취모’ 출범…친명 결집 지적에 김병주 이탈도
-
9
李 “한국과 브라질, 룰라와 나, 닮은게 참으로 많다”
-
10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트렌드뉴스
-
1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2
‘1000억대 자산’ 손흥민이 타는 車 뭐길래…조회수 폭발
-
3
“성관계 몰래 촬영”…20대 순경, 전 여친 고소로 입건
-
4
‘100만 달러’에 강남 술집서 넘어간 삼성전자 기밀
-
5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6
“열차 변기에 1200만원 금팔찌 빠트려” 오물통 다 뒤진 中철도
-
7
“같은 사람 맞아?”…日 ‘성형 전후 투샷 인증’ 챌린지 유행
-
8
도서관 책에 줄 그은 김지호…“조심성 없었다” 사과
-
9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10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
3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4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
-
5
장동혁 “내 이름 파는 사람, 공천 탈락시켜달라”
-
6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7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8
與의원 105명 참여 ‘공취모’ 출범…친명 결집 지적에 김병주 이탈도
-
9
李 “한국과 브라질, 룰라와 나, 닮은게 참으로 많다”
-
10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박성민]치매 인구 100만 한국, ‘국가책임제’ 환상 버려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2/23/133407497.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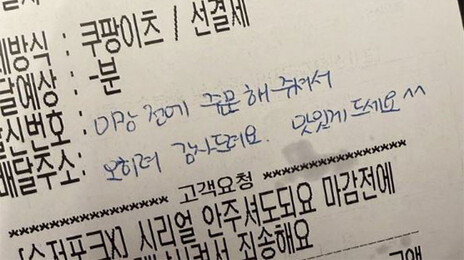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