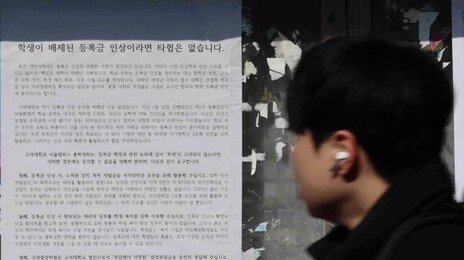공유하기
[사설]정치적 自己否定의 극치, 이회창-문국현 야합
-
입력 2008년 5월 23일 22시 59분
글자크기 설정
두 사람은 “대운하 저지,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 확보가 전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세운 정책은 구실일 뿐, 실은 교섭단체를 구성해 떡고물을 챙기겠다는 욕심이 앞섰음을 숨길 수 없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정체성을 내팽개치고 무작정 ‘합방’을 하겠다는 것이니 이보다 더한 자기부정이 또 있을까.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소수당의 정치적 한계와 설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도 국민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더구나 정당은 같은 정치적 노선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연대하겠다는 것은 밀실 야합이자 정치적 배신이다.
두 사람은 누구보다 원칙을 중시해 왔다. 이 총재는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새 정권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여는 철학과 원칙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고, 문 대표는 작년 11월 통합신당과 민주당 합당에 대해 “졸속과 무원칙의 극치” “정체성 없는 과거식 선거공학”이라고 비난했다. 정치인의 겉과 속은 다르다고들 하지만 어제의 말과 오늘의 행동이 이렇듯 다를 수가 있는가.
이 총재는 ‘좌파정권 종식’을 정치 재개의 명분으로, 문 대표는 ‘깨끗한 정치’를 정치 참여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두 사람 모두 결과적으로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그렇다면 차라리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 옳은 처신일지도 모른다. 정치의 단맛에 취해 점점 때 묻은 정치인을 닮아가는 듯한 두 사람의 모습이 딱해 보인다.
화제의 비디오 >
-

따만사
구독
-

임용한의 전쟁사
구독
-

히어로콘텐츠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화제의 비디오]분출구 못찾은 젊음 그린 「크랙시티」](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