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한국, 美·日·獨에 혁신 뒤처져…G5 평균도 못 미친다”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2일 06시 24분
글자크기 설정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이 주요국(G5)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량 등 직접 투입요소 외에 경영혁신·기술개발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꼽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총요소생산성 현황과 경쟁력 비교’ 분석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 1 △독일 0.927 △프랑스 0.909 △영국 0.787 △일본 0.656 △한국 0.614였다.
전경련은 총요소생산성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로 혁신성, 인적자본, 규제환경, 사회적자본, 경제자유도 등 5개 분야를 선정해 경쟁력을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은 모든 비교 분야에서 G5 대비 경쟁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별 G5 평균 경쟁력을 100으로 두었을 때, 한국의 상대적 경쟁력은 △사회적자본 74.2 △규제환경 76.9 △혁신성 79.2 △인적자본 87.4 △경제자유도 98.7을 기록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기준 연구개발 활동의 실질적인 성과(R&D 투입 대비 특허 수 등)를 측정하는 ‘혁신성과 지수’가 48.4에 불과해 G5 평균(61.1)을 밑돌았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주에 포함된 국내 기업 수 역시 5개에 불과해 G5 평균(14.4개사)의 3분의1 수준이었다.
프랑스 인시아드 대학교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재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인재경쟁력은 세계 133개국 중 27위를 기록해 미국(4위), 영국(10위) 등주 G5 국가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OECD에 따르면 근로시간 당 부가가치 창출을 나타내는 노동생산성 역시 한국은 2021년 기준 42.9달러를 기록해 G5 평균(63.2)에 비해 20.3달러나 낮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한국경제는 노동·자본의 양적 투입을 통한 성장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며 “총요소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환경 개선, 혁신성 제고, 인적자본 확충 등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렌드뉴스
-
1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2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3
‘워시 쇼크’ 금·은값 폭락 배경엔…“中 투기꾼의 광적인 투자”
-
4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5
“아가야 행복해야 해”…홈캠 속 산후 도우미 작별 인사에 ‘뭉클’
-
6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7
길고양이 따라갔다가…여수 폐가서 백골 시신 발견
-
8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9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10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1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2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3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4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8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9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10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트렌드뉴스
-
1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2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3
‘워시 쇼크’ 금·은값 폭락 배경엔…“中 투기꾼의 광적인 투자”
-
4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5
“아가야 행복해야 해”…홈캠 속 산후 도우미 작별 인사에 ‘뭉클’
-
6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7
길고양이 따라갔다가…여수 폐가서 백골 시신 발견
-
8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9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10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1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2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3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4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8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9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10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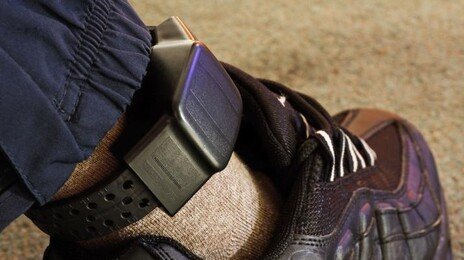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