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커버스토리]'딴물'서 성장한 외국인 사원들 기업문화 변화 촉매제
-
입력 2002년 5월 16일 14시 27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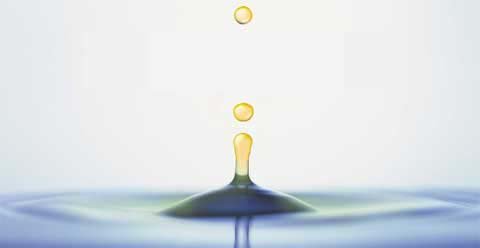
SK텔레콤(SKT) 법무팀에 8개월째 근무중인 제이슨 새뮤얼 시츠 변호사(30). 그는 SKT 국내 본사의 유일한 미국인이다. 사업상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일이 그의 주된 업무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선택한 또 하나의 역할이 있다. 바로 ‘배를 흔드는 일(rocking the boat)’이다.
“사업추진 협의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을 ‘배를 흔드는 것’에 비유한 겁니다. 아무래도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보다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 흔드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조직에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뒤집히기 전에 배를 흔들어라
시츠 변호사는 이렇게 ‘배를 흔들다가’ 회사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을 뻔하기도 했다. 그의 판단으로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보이는 한 사업 제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논쟁이 지속되자 시츠 변호사는 “내 이름을 걸고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일을 결정하게 되면 팀장이 하는 것이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업은 개인적으로 친구처럼 지내던 상사가 맡고 있던 일이었다. “공과 사는 다른 것”이라며 그 친구를 한참 설득한 후에야 껄끄러워진 관계를 원상회복할 수 있었다.
“기술적으로나 사업환경 측면에서 변화무쌍한 이동통신업계에서 ‘머물러 있는 배’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스스로라도 조금씩 배를 흔들어야만 변화의 풍랑을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기고 또 제대로 항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츠 변호사는 아직 한국의 기업문화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무조건 배를 흔들만큼 성숙돼 있지 않다고 느낀다. 업무든 개인사든 상사와 부하, 동료들간의 대화나 토론이 많지 않은 조직에서는 심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 자칫 배가 뒤집힐 위험도 있다.
경희대와 숙명여대 대학원에서 ‘회사법’ 등도 강의하는 시츠 변호사는 회사가 아닌 대학의 강의실에서 한미간의 기업문화 차이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주제를 주고 발표를 하라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한국학생들과 발표하고 질문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미국 학생들의 졸업 후 회사 생활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미국 로스쿨의 경우 소크래틱 메서드(So-cratic method)라는 교육법을 씁니다. 교수가 질문을 던지면 학생은 반강제적으로라도 자신의 논지를 세워 답변을 하게 되어있죠. 중고등학교에서는 먼저 질문하는 학생에게 선생이 상을 줄 정도로 동기부여를 합니다. 이런 교육시스템에서 성장하다보니 미국 학생들은 문제제기 하는 것, 의견이 다른 윗사람과 토론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유 상무님? 오, 미스터 유!
|
SKT 중국사업팀에 근무한 지 한달 된 퍄오청환(朴成煥·33)과장. SKT 국내본사가 올해 선발한 중국인 사원 3명 중 한 사람이다. 아직 적응기간이지만 그는 수시로 팀장을 찾아가 구체적인 할 일과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상의한다. 신입사원이면 다소곳이 앉아있는 것이 미덕인 한국기업 분위기에서는 사뭇 튀는 모습이다. 지난주 그는 회사 근처에서 상사인 유모 상무를 만나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오, 미스터 유. 다음 주에 한번 찾아가서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할 일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였다. ‘유 상무님’이 아니라 ‘미스터 유’라는 호칭 때문에 누가 옆에서 봤다면 마치 회사 동료와 인사하는 것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를 광경이었다. 주위의 한국인 동료들은 “서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일을 배운다”라고들 하지만 그에겐 오히려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낯설다. 중국 베이징대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경영학석사(MBA)과정을 마친 뒤 영국계 유통기업인 FDL사, 미국의 시스코사 등에서 근무한 퍄오 과장은 지금껏 상사와 업무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 벽을 느끼지 않고 살아왔다.
“한국기업에 와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밑의 직원들이 윗사람을 많이 겁내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할 말이 있는데도 무조건 참는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상사가 뭐라고 하면 별 의견없이 따라하는 모습도 이전에 몸 담고 있었던 기업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에요.”
그는 이미 SKT에 입사하기 전 한국기업을 경험한 중국 친구들로부터 ‘한국의 기업은 상하관계가 엄격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충고를 여러차례 받았다. MBA동기인 한 중국인 친구도 이것이 싫어서 굴지의 한국기업으로부터 입사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다.
“베이징대와 MBA의 중국인 동문들과 얘기를 해보면 한국 기업에 대해 갖는 이미지가 비슷해요. 사업을 밀어붙이는 추진력과 근면성은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한국 기업의 장점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조직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이 막혀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 기업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퍄오 과장이 베이징대에서 배운 것 중 지금도 금과옥조로 여기는 것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누구의 생각이든, 이론이든, 결정사항이든 믿지 말고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베이징대 4년 동안의 학과 공부보다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밤새워 토론한 일, 학생들이 직접 외부 유명인사를 초청해 한달에 한번씩 잔디밭에 둘러앉아 가졌던 토론대회를 더 소중하게 기억한다.
●외국인 사원은 변화의 촉매제?
직원수 4000명이 넘는 대기업 SKT에서 시츠 변호사나 퍄오 과장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다른 사고방식, 기업문화에서 성장한 외국인 사원들의 한국 정착 과정 자체가 조직의 동료들에게 적잖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시츠 변호사를 직접 채용한 신승국 부장(법무팀)의 느낌은 남다르다.
“당초 국제적인 계약을 할 전문가가 없어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시작한 뒤 현업팀과 법률적인 문제로 무섭게 부딪치는 거예요. 예전엔 현업팀에서 ‘중요한 계약’이라고 하면 법률적인 위험이 있어도 법무팀에서는 그냥 넘어가곤 했지만 그는 달랐어요. 팀원들이 그를 통해 승부 근성이랄까, ‘조직 내에서 논쟁을 통한 협상기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뜻하지 않은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기술 수출건을 함께 추진했던 글로벌사업팀에는 아직도 시츠 변호사라면 진저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의 계약건에 사인한 뒤 현업팀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시츠 변호사가 법률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내부에서 미리 논쟁을 벌여줘 결과적으로는 불리한 계약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남아 국가 중 한 곳과 새로 추진중인 사업 건은 아예 처음부터 시츠 변호사와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할 뜻을 법무팀에 알려왔다.
퍄오 과장의 상사인 손태오 팀장은 외국인 인재들이 일으키는 변화의 바람에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저 자신 중국에서 5년간 근무하며 중국기업이 우리보다 훨씬 서구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상사에게 스스럼없이 할 말을 하는 개방적인 기업문화를 갖고 있죠.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할 문화예요. 하지만 중국 사원 몇 명이 당장 한국의 기업문화를 바꿀 순 없을 겁니다. 그들도 한국 기업에 적응하고 우리도 그들에게 배우면서 서서히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봐요.”
현재 SKT 국내 본사에는 시츠 변호사 등 4명의 외국인 사원이 있다. 그러나 SKT 인력운용팀은 곧 국적을 막론하고 미국 유럽에서 MBA를 받은 3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외국생활을 경험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채용도 대폭 늘려갈 계획이다. 당장 글로벌 마켓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조달하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목적이지만 기업의 조직문화를 바꿀 에너지를 외부에서 끌어오겠다는 전략도 깔려있다.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 등 다른 국내 대기업들도 이미 이런 실험을 진행중이다.
“글로벌 기업이 되려면 기업의 조직문화도 글로벌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인력만으로는 그 변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외국인이나 해외경험이 많은 한국인들을 변화의 거점으로 삼아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게 최고경영진의 생각인 것 같아요.”(SKT 인력운용팀 김현구 차장)
서로 다른 교육방법과 가치관 아래 키워져온 다국적 인재들. 이들의 이질적인 결합 혹은 충돌이 변화를 모색하는 한국의 기업들에 새로운 조직문화를 낳을 수 있을까.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언론법안 : 무엇이 문제인가 : 편집위원회 설치,편집규약제정 의무화 >
-

고양이 눈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함께 미래 라운지
구독
트렌드뉴스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3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 예보…월요일 출근길 비상
-
4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
5
“까치발 들고 물 1.5L 마시기”…50대 매끈한 다리 어떻게? [바디플랜]
-
6
비트코인, 9개월만에 7만 달러대로…연준 의장 워시 지명 영향
-
7
“놓지마!” 애원에도…술 취해 어린아들 7층 창문에 매단 아버지
-
8
한준호, 정청래에 “조국혁신당 합당, 여기서 멈춰 달라”
-
9
다카이치, 팔 통증에 예정된 방송 취소…총선 앞 건강 변수 부상
-
10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4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5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6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7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8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9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10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트렌드뉴스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3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 예보…월요일 출근길 비상
-
4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
5
“까치발 들고 물 1.5L 마시기”…50대 매끈한 다리 어떻게? [바디플랜]
-
6
비트코인, 9개월만에 7만 달러대로…연준 의장 워시 지명 영향
-
7
“놓지마!” 애원에도…술 취해 어린아들 7층 창문에 매단 아버지
-
8
한준호, 정청래에 “조국혁신당 합당, 여기서 멈춰 달라”
-
9
다카이치, 팔 통증에 예정된 방송 취소…총선 앞 건강 변수 부상
-
10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4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5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6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7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8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9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10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與 ‘언론법안’]“언론사內 논의구조 정부개입은 위헌”](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