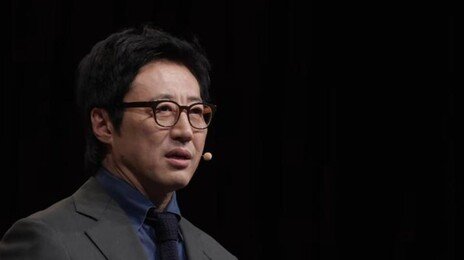공유하기
[광화문에서/이병기]진짜 약자는 누구인가
-
입력 2008년 4월 29일 02시 58분
글자크기 설정

18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을 타결한 이후 축산농가의 반발이 거세다. 축산업은 절체절명의 상태다. 정치권은 청문회 개최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도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쇠고기 문제에서 보듯 룰이 하나 바뀌면 손해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긴다. 소비자 안전이 걸린 광우병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면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사회는 쇠고기 문제처럼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룰에 따라 작동된다. 민주주의 사회는 이런 룰을 바꾸기 전에 이해 당사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사회 전체, 특히 룰을 만드는 정치권과 정부에 전달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간 양극화가 다층적으로 누적되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약자들이 생겨났으나 이들의 목소리는 소외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도시와 농어촌의 빈민(貧民), 실질적인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88만 원 세대’로 일컬어지는 청년층 등 4대 약자그룹이 대표적이다.
적자 가계부를 벗어나지 못하는 최하위층, 넷 중 하나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절대빈곤의 상태인 노인가구, 정규직 임금의 67%밖에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대학 졸업 후에도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하는 청년백수들…. 한 가정에 이들이 모여 고통을 몇 배로 겪는 곳도 흔하다. 여기다 결혼 이주 여성과 그들의 자녀도 새로운 약자로 커 가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소수가 아니다. 비정규직만 해도 570만 명에 이른다. 수(數)만 놓고 보면 폭발적인 정치적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미약한 것은 ‘조직화’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입에 풀칠하기도 버겁거나 취직공부하기 바쁜 이들이 시간과 자원을 동원해서 조직화에 나서기는 어렵다.
대기업 노동자를 보면 알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였던 이들은 민주화 운동과 결합돼 조직화되면서 거대세력으로 변신했다. 이 중 상당수는 약자의 위치를 벗어났지만 아직도 약자 행세를 하곤 한다. 새로운 약자가 과거의 약자들 때문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더 힘든 삶을 강요받는 ‘민주주의의 경직화’ 현상이 우려될 정도다.
최근 우리는 진짜 약자를 배려할 기회를 소홀히 넘겼다. 비례대표 의원은 조직화 능력이 떨어진 약자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좋은 통로였다.
하지만 18대 국회 비례대표 54명 가운데 4대 약자그룹에 속한 의원은 환경미화원 출신인 민주노동당 홍희덕 당선인 한 명뿐이다. 또 이들을 대변할 이는 ‘빈민의 대모’로 알려진 한나라당 강명순(안산제일감리교회 목사) 당선인 한 명 정도로 보인다.
공천 파동으로 비례대표 몇 명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면 각 당이 사회적 약자 가운데서 새 비례대표를 지명할 것을 검토했으면 한다.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가 골고루 수렴되는 실질적 민주화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병기 경제부 차장 eye@donga.com
트렌드뉴스
-
1
“잠만 자면 입이 바싹바싹”…잠들기 전에 이것 체크해야 [알쓸톡]
-
2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전
-
3
가짜 돈 내민 할머니에게 7년째 음식 내준 노점상
-
4
서로 껴안은 두 소년공, 대통령 되어 만났다
-
5
[단독]“학업 위해 닷새전 이사왔는데”…‘은마’ 화재에 10대 딸 참변
-
6
우유냐 두유냐…단백질 양 같아도 노령층엔 ‘이것’ 유리[노화설계]
-
7
[단독]타슈켄트 의대 한국인 유학생들, 국시 응시 1년 밀릴 듯
-
8
“대구에 이렇게 눈이 온다고?” 시민들도 놀란 ‘2월 폭설’
-
9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10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4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5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6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7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8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9
서로 껴안은 두 소년공, 대통령 되어 만났다
-
10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트렌드뉴스
-
1
“잠만 자면 입이 바싹바싹”…잠들기 전에 이것 체크해야 [알쓸톡]
-
2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전
-
3
가짜 돈 내민 할머니에게 7년째 음식 내준 노점상
-
4
서로 껴안은 두 소년공, 대통령 되어 만났다
-
5
[단독]“학업 위해 닷새전 이사왔는데”…‘은마’ 화재에 10대 딸 참변
-
6
우유냐 두유냐…단백질 양 같아도 노령층엔 ‘이것’ 유리[노화설계]
-
7
[단독]타슈켄트 의대 한국인 유학생들, 국시 응시 1년 밀릴 듯
-
8
“대구에 이렇게 눈이 온다고?” 시민들도 놀란 ‘2월 폭설’
-
9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10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4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5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6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7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8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9
서로 껴안은 두 소년공, 대통령 되어 만났다
-
10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차승재의 영화이야기]'영화 아카데미'의 빛과 그늘](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