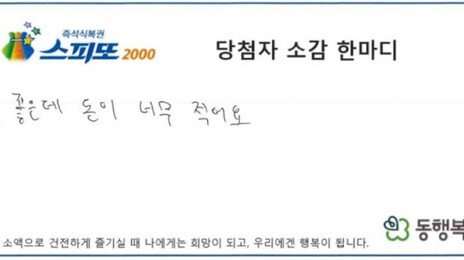공유하기
[사설]우주강국 향한 작지만 뜻 깊은 ‘이소연씨 壯途’
-
입력 2008년 4월 7일 23시 05분
글자크기 설정
나라와 국민의 경사다.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첫발을 내디디며 “개인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라고 했듯이 이 씨의 비행이 우리에겐 우주강국을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주 선진국인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등과 비교하면 우리는 겨우 첫발을 뗀 데 지나지 않는다. 35개국이 우리보다 먼저 우주인을 배출했고 그 수는 474명에 이른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다. 첫 우주인 배출에 쏠린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발판 삼아 우리도 우주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마침 9월에는 전남 고흥에 나로우주센터가 완공되고, 12월에는 한국형 소형위성발사체(KSLV-1)가 발사된다. 내년 10월에는 대전에서 3000여 명의 각국 우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우주대회(IAC)도 열린다. 우리가 우주시대를 열어나갈 호기(好機)다.
강대국들은 우주탐사를 국가 위상을 높이는 최고의 전략으로 삼는다. 첨단 기술이 결집된 우주 프로젝트는 미래의 산업과 기술을 주도하는 토대일 뿐 아니라 군사전략 차원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일본과 중국도 상업적 이익보다 주로 군사적 목적에서 우주탐사에 열중하고 있다. 장영근(한국과학재단 우주단장) 한국항공대 교수는 “강대국은 우주사업을 생존게임 차원에서 추진한다”며 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우주강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정책적 배려가 긴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 연구개발(R&D)예산의 3% 수준인 우주예산을 5∼6%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이나 유럽의 우주국(ESA)처럼 우주사업을 통합 관리할 국가기구도 필요하다. 장기적 비전을 세워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려면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 그런 조건이 마련돼야 우수한 두뇌를 영입할 수 있다. 우주시대의 초입에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새겨야 할 과제들이다.
화제의 비디오 >
-

어린이 책
구독
-

사설
구독
-

동아시론
구독
트렌드뉴스
-
1
이란, 중동 美기지 4곳 ‘조준 공격’…“미군 4만명 이란 사정권”
-
2
[단독]폴란드, 韓 해군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 무상 양도 안받기로
-
3
집무실 ‘가루’ 된 하메네이, 생사 불확실…권력 계승자 4명 정해놔
-
4
“내 항공권 어쩌나” 도하 영공 전면 폐쇄…중동 하늘길 막혔다
-
5
하메네이, 집무실 비워 공습 피해…“최근 암살 시도 걱정”
-
6
트럼프, 이란 향해 “국민은 봉기하고 군인은 무기 내려놔라”
-
7
장동혁, 이준석-전한길 토론 보더니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필요”
-
8
‘노인 냄새’ 씻으면 없어질까?…“목욕보다 식단이 더 중요”[노화설계]
-
9
이란 초교에 떨어진 미사일…여학생 최소 51명 사망
-
10
지지율 하락을 전쟁으로 만회?…트럼프 ‘이란 공격’ 진짜 이유는
-
1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2
장동혁, 이준석-전한길 토론 보더니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필요”
-
3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4
대구 간 한동훈 “죽이되든 밥이되든 나설것”
-
5
송광사 찾은 李대통령 내외…“고요함 속 다시 힘 얻어”
-
6
[책의 향기]무기 팔고자 위협을 제조하는 美 군산복합체
-
7
큰 거 온다더니 ‘틱톡커 이재명’…“팔로우 좋아요 아시죠?”
-
8
‘지지율 바닥’ 쇼크에도… 민심과 따로 가는 국힘
-
9
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법도 강행 처리… 법원행정처장 사퇴
-
10
쿠팡 김범석, 정보유출 99일만에 영어로 “사과”
트렌드뉴스
-
1
이란, 중동 美기지 4곳 ‘조준 공격’…“미군 4만명 이란 사정권”
-
2
[단독]폴란드, 韓 해군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 무상 양도 안받기로
-
3
집무실 ‘가루’ 된 하메네이, 생사 불확실…권력 계승자 4명 정해놔
-
4
“내 항공권 어쩌나” 도하 영공 전면 폐쇄…중동 하늘길 막혔다
-
5
하메네이, 집무실 비워 공습 피해…“최근 암살 시도 걱정”
-
6
트럼프, 이란 향해 “국민은 봉기하고 군인은 무기 내려놔라”
-
7
장동혁, 이준석-전한길 토론 보더니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필요”
-
8
‘노인 냄새’ 씻으면 없어질까?…“목욕보다 식단이 더 중요”[노화설계]
-
9
이란 초교에 떨어진 미사일…여학생 최소 51명 사망
-
10
지지율 하락을 전쟁으로 만회?…트럼프 ‘이란 공격’ 진짜 이유는
-
1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2
장동혁, 이준석-전한길 토론 보더니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필요”
-
3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4
대구 간 한동훈 “죽이되든 밥이되든 나설것”
-
5
송광사 찾은 李대통령 내외…“고요함 속 다시 힘 얻어”
-
6
[책의 향기]무기 팔고자 위협을 제조하는 美 군산복합체
-
7
큰 거 온다더니 ‘틱톡커 이재명’…“팔로우 좋아요 아시죠?”
-
8
‘지지율 바닥’ 쇼크에도… 민심과 따로 가는 국힘
-
9
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법도 강행 처리… 법원행정처장 사퇴
-
10
쿠팡 김범석, 정보유출 99일만에 영어로 “사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화제의 비디오]분출구 못찾은 젊음 그린 「크랙시티」](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