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횡설수설/권순택]민노총 탈퇴 도미노
-
입력 2006년 12월 22일 19시 53분
글자크기 설정

▷이달 7일에는 건설업계의 대표적 강성 노조인 대림산업 노조가 아예 노조 해산을 결의했다. 5월 민노총을 탈퇴한 대림산업 노조원 1500여 명은 민노총이 노동자를 정치투쟁 현장으로 내몰자 ‘이런 노조라면 없는 것이 낫다’고 반기를 들었다. 2002년 태광산업, 대한화섬, 효성에서 시작된 민노총 탈퇴 도미노현상이 2004년 GS칼텍스, 현대중공업을 거쳐 계속되고 있다. 아직 탈퇴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와 상생을 모색하는 노조도 적지 않다.
▷노동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같은 정치투쟁 위주의 민노총 노선은 조합원의 복지와 실익을 중시하는 단위노조의 반감만 살 뿐이라고 말해 왔다. 대규모 사업장 노조가 많은 민노총은 산별, 지역별 핵심 노조들이 이탈하면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선과 운동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없으면 도심 불법시위로 민심(民心)을 잃은 데다 노심(勞心)마저 떠나 민노총의 붕괴가 시간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코오롱 노조는 “장기 파업이 적자 전환과 대량 해고로 이어졌다는 반성 때문에 민노총을 탈퇴했다”면서 “코오롱의 잃어버린 10년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민노총 대변인은 “어용노조 집행부에 의한 탈퇴일 뿐”이라며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청년 실업자가 40만 명이 넘고 경제성장 동력이 꺼져 가는 상황에서 강성 노조가 설 땅은 좁을 수밖에 없다. 민노총은 ‘붕괴냐,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생존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횡설수설 >
-

게임 인더스트리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동아광장
구독
트렌드뉴스
-
1
“불륜으로 성병 걸린 빌게이츠, 엡스타인에 SOS” 문건 공개
-
2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3
코스피만 뜨겁다…건설-생산 한파, 지갑도 꽁꽁 얼어붙어
-
4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5
용인 도로서 7중 추돌사고…1명 사망·3명 부상
-
6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7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8
워시 연준의장 지명에 금-은 폭락…안전자산 랠리 끝?
-
9
“배달시 여러 층 누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안내문에 시끌
-
10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3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4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5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6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7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
8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9
李 “부동산 정상화, 5천피-계곡 정비보다 쉬워”
-
10
김정관, 러트닉과 관세 결론 못 내…“향후 화상으로 대화”
트렌드뉴스
-
1
“불륜으로 성병 걸린 빌게이츠, 엡스타인에 SOS” 문건 공개
-
2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3
코스피만 뜨겁다…건설-생산 한파, 지갑도 꽁꽁 얼어붙어
-
4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5
용인 도로서 7중 추돌사고…1명 사망·3명 부상
-
6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7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8
워시 연준의장 지명에 금-은 폭락…안전자산 랠리 끝?
-
9
“배달시 여러 층 누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안내문에 시끌
-
10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3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4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5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6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7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
8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9
李 “부동산 정상화, 5천피-계곡 정비보다 쉬워”
-
10
김정관, 러트닉과 관세 결론 못 내…“향후 화상으로 대화”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횡설수설/우경임]다시 쉬는 제헌절… 공휴일도 시대 따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30/133269552.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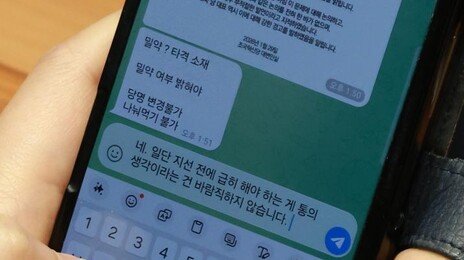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