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사설]“나도 미국 소도시로 유학 가고 싶다”
-
입력 2006년 12월 4일 22시 59분
글자크기 설정
‘기러기 가족’으로 아버지와 떨어져 사는 생활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나 역시 아이들을 보내고 싶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이 씨는 기독교 계통 사립학교를 ‘선택’해 큰아이를 7학년(한국의 중학교 1학년)에 진학시켰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선택권을 가질 수 없다. 그나마 내년부터는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는 국제중학교와 특수목적고 설립 인가권마저 교육인적자원부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회수’한다.
위헌 소지가 드러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은 집단경영체제 성격의 ‘개방형 이사제’를 그대로 두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고 학교 간, 교사 간 평가 및 경쟁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높이는데 우리만 평등주의적 교육관에 사로잡혀 하향 평둔화(平鈍化)로 치달린다.
교육의 해외 탈출이 2000년 4400명에서 4년 만에 4배가량 급증한 것도 이 때문이다. 5월 기획예산처의 학부모 심층면접 결과 초등학생은 영어, 중고교생은 국내 교육에 대한 불만이 조기유학의 이유라고 한다. 잘못된 교육제도 탓에 지난해 교육수지 적자가 약 3조1500억 원이었다. 나라 전체가 벌어들인 경상수지 흑자액의 20%를 해외 학교에 쏟아 부은 셈이다.
돈과 사람이 빠져나가는 나라에 얼마나 희망이 있겠는가. 미국 뉴스위크지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시장가격부터 교육시스템까지 일일이 간섭하기 때문에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이라며 한국이 아시아모델을 거꾸로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경쟁력 없는 국내 교육만 받은 아이들이 실업과 빈곤의 대물림으로 허덕이기 전에 정부는 시대착오적 코드 교육을 버려야 한다.
트렌드뉴스
-
1
배우 이상아 애견카페에 경찰 출동…“법 개정에 예견된 일”
-
2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3
“하메네이 차남, 이란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
-
4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5
“나는 절대 안 먹는다”…심장 전문의가 끊은 음식 3가지
-
6
UAE 배치 ‘천궁-2’, 실전 첫 투입… 이란 미사일 요격
-
7
“헤즈볼라 궤멸 기회”… 중동 확전에 뒤에서 웃는 이스라엘
-
8
달걀, 조리법 따라 영양 달라진다…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
9
살아서 3년, 죽어서 570년…“단종-정순왕후 만나게” 청원 등장
-
10
트럼프 “호르무즈 유조선 美해군이 호위”…유가 급등에 대응
-
1
“정파적 우편향 사상, 신앙과 연결도 신자 가스라이팅도 안돼”
-
2
“혁명수비대 업은 강경파” vs “빈살만식 개혁 가능”…하메네이 차남 엇갈린 평가
-
3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4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5
“한국 교회 큰 위기…설교 강단서 복음의 본질 회복해야”
-
6
‘尹 훈장’ 거부한 교장…3년만에 李대통령 훈장 받고 “감사”
-
7
한동훈 “나를 탄핵의 바다 건너는 배로 써달라…출마는 부수적 문제”
-
8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증거 인멸 염려”
-
9
李 “檢 수사·기소권으로 증거조작…강도·살인보다 나쁜 짓”
-
10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트렌드뉴스
-
1
배우 이상아 애견카페에 경찰 출동…“법 개정에 예견된 일”
-
2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3
“하메네이 차남, 이란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
-
4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5
“나는 절대 안 먹는다”…심장 전문의가 끊은 음식 3가지
-
6
UAE 배치 ‘천궁-2’, 실전 첫 투입… 이란 미사일 요격
-
7
“헤즈볼라 궤멸 기회”… 중동 확전에 뒤에서 웃는 이스라엘
-
8
달걀, 조리법 따라 영양 달라진다…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
9
살아서 3년, 죽어서 570년…“단종-정순왕후 만나게” 청원 등장
-
10
트럼프 “호르무즈 유조선 美해군이 호위”…유가 급등에 대응
-
1
“정파적 우편향 사상, 신앙과 연결도 신자 가스라이팅도 안돼”
-
2
“혁명수비대 업은 강경파” vs “빈살만식 개혁 가능”…하메네이 차남 엇갈린 평가
-
3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4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5
“한국 교회 큰 위기…설교 강단서 복음의 본질 회복해야”
-
6
‘尹 훈장’ 거부한 교장…3년만에 李대통령 훈장 받고 “감사”
-
7
한동훈 “나를 탄핵의 바다 건너는 배로 써달라…출마는 부수적 문제”
-
8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증거 인멸 염려”
-
9
李 “檢 수사·기소권으로 증거조작…강도·살인보다 나쁜 짓”
-
10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중동 확전… 韓 ‘안보-경제 복합위기’ 장기화 대비해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3/03/13345882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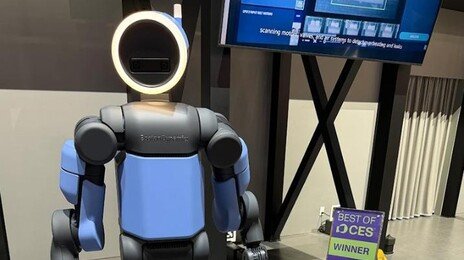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