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기자의 눈]김상훈/臟器 찾아 중국까지…
-
입력 2002년 12월 24일 18시 21분
글자크기 설정

만성 신장질환으로 고생하다 최근 중국에서 신장을 이식받은 50대 환자는 기자를 만나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장기 이식수술을 받는 환자들을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그들도 알고 보면 피해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가 들려준 중국 병원의 실상은 충격적이었다. 모기떼가 들끓고 여기저기 가래침이 널려 있었다. 귀국한 뒤에도 수술이 잘못돼 행여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했다.
굳이 중국행을 택해야 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국내에서 대기자로 등록하면 다음 세대에나 이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그는 장기 이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와 병원 등 문의해 보지 않은 곳이 없다고 했다. 신장을 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나 관련기관들은 모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것. 결국 그는 대기자로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다른 환자들에게도 중국행을 권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중국으로 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들도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11월 말 현재 국내의 장기이식 대기자는 1만68명이지만 장기이식을 받았거나 승인받은 사람은 1487명에 불과하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뇌사자가 생긴 병원에 장기이식수술 우선권을 주기로 해 다소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현행 장기이식법이 뇌사자의 장기기증 절차를 너무 엄격히 제한하는 바람에 기증이 줄어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에도 “장기기증을 하고 싶었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 마음을 바꿨다”는 항의성 글이 자주 오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기증 절차를 바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환자와 기증자 모두를 고려하는 정책은 언제쯤이나 가능할까. 당국의 유연한 사고를 기대해 본다.
김상훈기자 사회2부 corekim@donga.com
빛나는 조연 >
-

광화문에서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이승재의 무비홀릭
구독
트렌드뉴스
-
1
‘1000억대 자산’ 손흥민이 타는 車 뭐길래…조회수 폭발
-
2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3
전현무 “고인에 예 다하지 못했다”…칼빵 발언 사과
-
4
핵잠 건조 논의할 美협상단 방한 연기…‘관세 위법판결’ 후폭풍
-
5
“재명이네 마을은 TK에 있나”…정청래 강퇴에 與지지층 분열
-
6
“잠만 자면 입이 바싹바싹”…잠들기 전에 이것 체크해야 [알쓸톡]
-
7
‘100만 달러’에 강남 술집서 넘어간 삼성전자 기밀
-
8
與 “국힘 반대로 충남-대전 통합 무산 위기”… 지방선거 변수 떠올라
-
9
[단독]학교별 교복값 최대 87만원 차이… “안입는 정장 교복은 왜 사나”
-
10
美, 이란 정밀 타격후 대규모 공격 검토… 韓대사관 ‘교민 철수령’
-
1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
-
2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
3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
4
장동혁 “내 이름 파는 사람, 공천 탈락시켜달라”
-
5
조희대 “與,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꿔…국민에 직접 피해”
-
6
與의원 105명 참여 ‘공취모’ 출범…친명 결집 지적에 김병주 이탈도
-
7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8
李 “한국과 브라질, 룰라와 나, 닮은게 참으로 많다”
-
9
119 구급차 출동 36%가 ‘허탕’… “심정지 대응 10분씩 늦어져”
-
10
전현무, 순직 경관에 ‘칼빵’ 발언 논란…“숭고한 희생 모독” 경찰 반발
트렌드뉴스
-
1
‘1000억대 자산’ 손흥민이 타는 車 뭐길래…조회수 폭발
-
2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3
전현무 “고인에 예 다하지 못했다”…칼빵 발언 사과
-
4
핵잠 건조 논의할 美협상단 방한 연기…‘관세 위법판결’ 후폭풍
-
5
“재명이네 마을은 TK에 있나”…정청래 강퇴에 與지지층 분열
-
6
“잠만 자면 입이 바싹바싹”…잠들기 전에 이것 체크해야 [알쓸톡]
-
7
‘100만 달러’에 강남 술집서 넘어간 삼성전자 기밀
-
8
與 “국힘 반대로 충남-대전 통합 무산 위기”… 지방선거 변수 떠올라
-
9
[단독]학교별 교복값 최대 87만원 차이… “안입는 정장 교복은 왜 사나”
-
10
美, 이란 정밀 타격후 대규모 공격 검토… 韓대사관 ‘교민 철수령’
-
1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
-
2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
3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
4
장동혁 “내 이름 파는 사람, 공천 탈락시켜달라”
-
5
조희대 “與,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꿔…국민에 직접 피해”
-
6
與의원 105명 참여 ‘공취모’ 출범…친명 결집 지적에 김병주 이탈도
-
7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8
李 “한국과 브라질, 룰라와 나, 닮은게 참으로 많다”
-
9
119 구급차 출동 36%가 ‘허탕’… “심정지 대응 10분씩 늦어져”
-
10
전현무, 순직 경관에 ‘칼빵’ 발언 논란…“숭고한 희생 모독” 경찰 반발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빛나는 조연]英배우 주드 로/주연 압도하는 '2色 카리스마'](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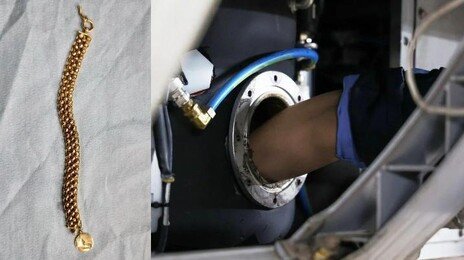
![[이철희 칼럼]김정은은 트럼프의 ‘러브레터’를 기다린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407506.1.thumb.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