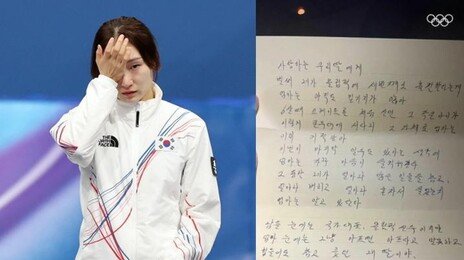공유하기
[소설]오래된 정원 (185)
-
입력 1999년 8월 3일 18시 40분
글자크기 설정
예 그러죠. 이리 앉으세요.
그는 내 말에 따르지 않고 화실 안을 서성대면서 이리 저리 돌아다녔어요. 마치 마지막 심사를 하는 사람처럼 학생들의 소묘들을 둘러보거나 책장에 놓인 작은 장식품들이며 손으로 빚어 구운 그릇이나 항아리에 꽂힌 마른 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늉을 했어요. 커피 잔을 의자 앞에 놓아 주고 내가 먼저 마시면서 그에게 말했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두 있나요?
예에?
이번에는 그가 내 존재를 잊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돌려 나를 멍한 얼굴로 돌아다 보았어요. 그는 정말 천진스럽게 눈이 안보일 정도로 주름을 잡으며 웃었지요.
그러믄요, 아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송영태가 내 앞에 다가와 마주 앉으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이 학원의 수강생이 되기로 결심했죠.
그건 곤란한데요. 전 지금 입시생 위주로 받구 있거든요. 그것두 두 달 동안이에요.
특별 개인지도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어요. 수강료가 좀 비싸겠지만.
좋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그쪽에서 편하신 때부터 시작하기루 하죠. 매일 나올 필욘 없구요 일주일에 두번이 어떻겠어요?
바로 제 생각과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루 하지요. 에에 그러니까….
하고 더듬더니 그는 상의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어 코 앞에다 대고 들여다보았어요.
수요일, 금요일이 좋겠군. 어떻습니까?
저녁 여섯 시 이후라면 저두 괜찮아요. 그런데 뭐하러 그림을 배우려고 하죠?
그는 마치 나의 그런 질문을 예상하기라도 한 것처럼 서슴없이 대꾸하더군요.
에에 그러니까…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사물의 표현에는 여러 가지 관점과 방법론이 필요할테니까요.
그건 훨씬 나중의 일이구요, 일단은 정확하게 보고 그대로 잡아내는 게 우선이지요.
그래도 사람마다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서루 다를걸요. 손짓두 다르구요. 헌데 이거 좀 출출하고 어딘가 섭섭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작에 저녁을 먹었어요.
아 그렇군요. 에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사제의 인연을 맺은 셈이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박주 한 잔 대접해드리고 싶은데요.
나도 소주 한 잔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어서 선선히 말했죠.
좋아요. 여긴 우리 동네니까 내가 잘 아는 집이 있어요.
그를 데리고 화실에서 길을 건너 시장통 입구로 갔습니다. 거기 일년 사철을 다른 데로 이사 가지 않고 저녁녘이면 나오는 포장마차로 갔어요. 부부가 하고 있었는데 남자는 삐쩍 마르고 키가 작은 반면에 여자는 키도 크고 뚱뚱해서 그집을 드나드는 우리 학생들이 뚱뚱이와 홀쭉이네 집이라고 부르는 곳이지요.
<글:황석영>
화제의 당선자 >
-

광화문에서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횡설수설
구독
트렌드뉴스
-
1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
2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노블레스 오블리주 표본”
-
3
당뇨병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 받는다
-
4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5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6
버스서 韓 여학생 성희롱하고 불법 촬영…인니 남성 논란
-
7
‘신격호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향년 85세
-
8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9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10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4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5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6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7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8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9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10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트렌드뉴스
-
1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
2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노블레스 오블리주 표본”
-
3
당뇨병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 받는다
-
4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5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6
버스서 韓 여학생 성희롱하고 불법 촬영…인니 남성 논란
-
7
‘신격호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향년 85세
-
8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9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10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4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5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6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7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8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9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10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4·15총선]공장-논밭-실험실서도 입성…이색경력 당선자들](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