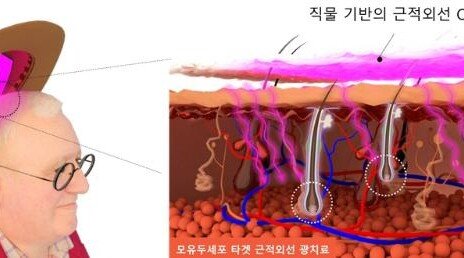공유하기
11년째 뇌성마비 장애인에 무료사진 찍어주는 김이남씨
-
입력 2002년 12월 15일 17시 36분
글자크기 설정

그는 11년째 뇌성마비 장애아들의 사진을 무료로 찍어왔다. 그것도 무심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일그러진 표정 뒤에 숨어 있는 해맑은 영혼을 찍는다. 그래서 그가 찍은 뇌성마비 장애아의 사진에는 여느 비장애아들과 같은 자연스러운 표정이 담겨 있다.
“저도 조금 더 예쁜 사진을 찍어주자는 생각에 자꾸 셔터를 누르다 발견한 거예요. 보통은 뒤틀려 있기 마련인 그 애들의 얼굴에 정말 아주 잠깐 비장애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표정이 깃드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가 찍어준 사진을 받아든 부모들은 너무도 고마워 눈물을 감추지 못한다. 일그러진 겉모습과 달리 마음은 천사같이 해맑은 자녀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이다.
“동영상으로 찍으면 그 모습이 안 잡혀요.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카메라에만 잡히죠. 사람의 눈이 참 간사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순간이 진실이 아닐까요.”
그렇게 11년째, 이 땅의 뇌성마비 장애아 대부분의 사진을 찍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런 사진들이 육체의 눈에는 순간의 잔상(殘像)일지 몰라도 마음의 눈에는 진상(眞像)이라는 점을.
그가 뇌성마비 장애인을 처음 접한 것은 1991년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빚을 얻어 서울 창동역 앞에 7평짜리 사진관을 열었던 때였다. 손님이 적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시절 ‘3통이나’ 되는 필름을 들고 찾아온 손님이 마침 인근 한국뇌성마비복지회관 직원이었다.
모처럼 큰 손님을 잡았다는 생각에 사진을 인화하던 그는 사지가 뒤틀린 아이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평생 뇌성마비 장애인을 눈여겨 본 적이 없던 터라 ‘이런 사진을 넘겨도 되나’하는 걱정부터 앞섰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사진을 찍어주면 더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서비스 차원에서 출장 촬영을 나갔다가 풀썩 주저앉게 됐다.
“아이들이 그 불편한 몸으로, 남들은 5분 안에 뚝딱 해치울 일을 혼신을 다해 한 시간에 걸쳐 해내는 걸 봤어요. 그처럼 힘겨운 조건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사지(四肢) 멀쩡한 내가 뭘 못하랴 하는 용기를 얻었죠.”
그 뒤 뇌성마비 장애아의 사진은 절대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게 그의 철칙이 됐다. 그에게 이 일은 결코 돈벌이가 아니라 자기충전을 위한 약속이기 때문이었다. 생활비도 못 벌어다 주는 형편에 남을 돕는다는 말을 꺼낼 수 없어 2∼3년은 아내에게도 비밀로 했다. 어느 날 아내가 장애인을 다룬 TV프로그램을 보다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슬쩍 털어놓아 면죄부를 얻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매번 퍼준 만큼 돈이 더 들어옵디다. 세상이 그래서 공정하다는 거 아니겠수. 잘나도 마음에 때 탄 사람이 많고, 못나도 마음은 해맑기 그지없는 우리 아이들이 있듯이.”
권재현기자 confetti@donga.com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5
홍석천 “부동산에 속아 2억에 넘긴 재개발 앞둔 집, 현재 30억”
-
6
한국인의 빵 사랑, 100년 전 광장시장에서 시작됐다
-
7
지자체 공개 반발… ‘1·29 대책’ 특별법 통과가 분수령
-
8
인간은 구경만…AI끼리 주인 뒷담화 내뱉는 SNS ‘몰트북’ 등장
-
9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10
[횡설수설/김창덕]“그는 정치적 동물이야”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5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6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7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10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5
홍석천 “부동산에 속아 2억에 넘긴 재개발 앞둔 집, 현재 30억”
-
6
한국인의 빵 사랑, 100년 전 광장시장에서 시작됐다
-
7
지자체 공개 반발… ‘1·29 대책’ 특별법 통과가 분수령
-
8
인간은 구경만…AI끼리 주인 뒷담화 내뱉는 SNS ‘몰트북’ 등장
-
9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10
[횡설수설/김창덕]“그는 정치적 동물이야”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5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6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7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10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