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횡설수설/권순활]연기금 vs 대기업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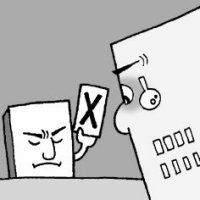
국민연금은 2008년 3월 현대자동차와 두산인프라코어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회장과 박용성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경영 복귀는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대기업 오너의 이사 선임을 반대한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현대차 지분 4.6%,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2.9%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회사 측과의 표 대결에서 졌지만 파장이 컸다.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연기금의 경영 참여가 활발하다. 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은 실적이 나쁜 최고경영자(CEO)의 사임도 요구한다. 우리 국민연금은 2005년 2월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한 뒤 주총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례가 늘었다. 하지만 경영자 인선 등 민감한 사안에서는 대부분 의결권을 포기했다. 현대차나 두산인프라코어 케이스는 극히 예외적 사례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LG화학 현대차 포스코 신한금융지주 대한항공 등 161개사에 이른다. 연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면 영향이 만만찮을 것이다. 청와대는 “정부와 사전 조율하거나 정책으로 검토하지 않은 곽 위원장의 사견(私見)”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재계는 ‘연금 사회주의’까지 거론하며 반발했다.
권순활 논설위원 shkwon@donga.com
횡설수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골든타임의 약탈자들
구독
-

Tech&
구독
-

e글e글
구독
트렌드뉴스
-
1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전
-
2
사패산 터널 ‘1억 금팔찌’ 주인 찾았다…“차에서 부부싸움하다 던져”
-
3
“너 때문에 넘어졌어” 부축해준 학생에 4600만원 청구 논란
-
4
우유냐 두유냐…단백질 양 같아도 노령층엔 ‘이것’ 유리[노화설계]
-
5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6
“같은 사람 맞아?”…日 ‘성형 전후 투샷 인증’ 챌린지 유행
-
7
박신양 “10년간 몸 못 가눠”…허리 수술·갑상선 투병 고백
-
8
“예쁘니 무죄?”…범죄보다 ‘외모’에 쏠린 韓日의 위험한 열광
-
9
심장마비라더니, 숨진 병사 유골에 ‘숟가락’…‘가혹행위 의혹’ 태국 발칵
-
10
김태희 한남더힐 7년 만에 시세차익 85억 원…세금은?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4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5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6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7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8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9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
10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트렌드뉴스
-
1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전
-
2
사패산 터널 ‘1억 금팔찌’ 주인 찾았다…“차에서 부부싸움하다 던져”
-
3
“너 때문에 넘어졌어” 부축해준 학생에 4600만원 청구 논란
-
4
우유냐 두유냐…단백질 양 같아도 노령층엔 ‘이것’ 유리[노화설계]
-
5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6
“같은 사람 맞아?”…日 ‘성형 전후 투샷 인증’ 챌린지 유행
-
7
박신양 “10년간 몸 못 가눠”…허리 수술·갑상선 투병 고백
-
8
“예쁘니 무죄?”…범죄보다 ‘외모’에 쏠린 韓日의 위험한 열광
-
9
심장마비라더니, 숨진 병사 유골에 ‘숟가락’…‘가혹행위 의혹’ 태국 발칵
-
10
김태희 한남더힐 7년 만에 시세차익 85억 원…세금은?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4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5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6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7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8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9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
10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횡설수설/윤완준]우크라이나 전쟁 4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2/23/133407063.2.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