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자연과학]‘대담-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만나다’
-
입력 2005년 11월 19일 03시 04분
글자크기 설정

인문학계의 전천후 수비수와 자연과학계의 변칙 공격수가 만났다. 도정일 경희대 영문학과 교수와 최재천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다.
도 교수는 1990년대 사회주의의 성채가 무너지고 포스트모더니즘의 모래바람이 불어 닥쳤을 때 비판적 이성의 수문장을 자처하며 혜성처럼 등장했다. 자본의 논리에 맞서 인문학적 가치를 지키려는 그의 검(劍)이 문학평론이었다면 방패는 도서관 짓기를 포함한 책읽기 운동이었다.
최 교수는 과학의 세계와 시인의 세계가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증명해 보이며 역시 혜성처럼 등장했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경계를 허물려는 그의 무기는 인간과 동물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사회생물학이라는 자신의 전공과 생명의 신비를 풀어가고 있는 분자생물학에 대한 지식이 하나로 연결된 쌍절곤이다.
이 두 고수(高手)가 2001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펼친 대담에다가 출판사 측의 4차례의 개별 인터뷰가 더해져 책이 엮어졌다. 두 사람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도 교수는 인문학적 가치의 수호자답게 일정 선을 그으려 하고 궁극적 통합에 무게를 둔 최 교수는 그 경계를 넘어서려 한다. 그래서 둘의 만남은 화합의 이중창보다 팽팽한 검무(劍舞)로 돌변할 때가 더 많다.
도 교수는 21세기의 최고 화두로 떠오른 생명과학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낸다. 그는 “생명공학, 생명의학, 유전자 치료 같은 분야가 현대인들에게는 일종의 마술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인간이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자연적 한계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다는 기대와 환상을 뿌리고 있다”고 경계한다.
최 교수는 이를 ‘지나친 유전자 신봉주의’라고 받아넘기면서 생물학이 꿈꾸는 미래가 결코 ‘기술적 유토피아’는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그는 “생명과학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래는 모든 사람이 최대 수명인 120세까지 질병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며 “생물학은 오히려 고통 없는 것이 과연 행복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인문학의 영역을 넘본다.
최 교수는 “유전자에 의해 발현되는 형질들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모든 학문이 생물학에 포함되며 따라서 비생물학적 차원이라는 것은 없다”면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생물학의 영역으로 통섭하려 한다.
도 교수는 이를 ‘생물학의 제국주의’라고 비판하며 “인간에게는 비생물학적이라 할 행동과 동기, 층위, 선택과 판단의 차원이 있다”며 “생물학적 진화가 자연선택에 지배된다면 사회적 진화는 ‘문화적 선택’의 지배를 받는다”고 반박한다.
최 교수가 “영혼도 DNA의 씨앗”이라고 공격하면 도 교수는 “그렇다면 영혼도 유전된다는 말이냐”고 반박한다. 도 교수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혁명”이라고 옹호하면 최 교수는 “문학적 상상력에서 나온 일종의 신화일 뿐”이라며 비판한다.
그러나 책을 덮는 순간 깨닫는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의사소통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그리고 이 두 고수의 진짜 노림수는 상대가 아니고 바로 독자를 향하고 있었음을.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자연과학 >
-

월요 초대석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2030세상
구독
트렌드뉴스
-
1
“과거사 사죄는 평생의 사명” 日목사…“日 정부와 국민은 달라요”
-
2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
3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4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5
엇갈리는 미군 사상자…美 “3명 전사” vs 이란 “560명 죽거나 다쳐”
-
6
한국이 제빵 강국이 된 비결
-
7
싱가포르, 난초 교배종에 ‘이재명-김혜경 난’ 이름 붙여
-
8
“귀 안까지 찌릿”…뒤통수 통증 부르는 이 질환은?
-
9
트럼프 “모든 목표 달성 때까지 이란 공격…미군 죽음 복수할 것”
-
10
역대급 불황이라고? 실상은 자산 계층 중심으로 소비 확산하는 국면
-
1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2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3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4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5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
6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7
장동혁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정청래 “부럽다, 난 0주택”
-
8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9
李대통령 “국민 여러분 전혀 걱정 않으셔도…일상 즐기시길”
-
10
“과거사 사죄는 평생의 사명” 日목사…“日 정부와 국민은 달라요”
트렌드뉴스
-
1
“과거사 사죄는 평생의 사명” 日목사…“日 정부와 국민은 달라요”
-
2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
3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4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5
엇갈리는 미군 사상자…美 “3명 전사” vs 이란 “560명 죽거나 다쳐”
-
6
한국이 제빵 강국이 된 비결
-
7
싱가포르, 난초 교배종에 ‘이재명-김혜경 난’ 이름 붙여
-
8
“귀 안까지 찌릿”…뒤통수 통증 부르는 이 질환은?
-
9
트럼프 “모든 목표 달성 때까지 이란 공격…미군 죽음 복수할 것”
-
10
역대급 불황이라고? 실상은 자산 계층 중심으로 소비 확산하는 국면
-
1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2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3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4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5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
6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7
장동혁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정청래 “부럽다, 난 0주택”
-
8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9
李대통령 “국민 여러분 전혀 걱정 않으셔도…일상 즐기시길”
-
10
“과거사 사죄는 평생의 사명” 日목사…“日 정부와 국민은 달라요”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자연과학]‘휴먼 브레인’…인간의 뇌는 소우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5/11/19/6958577.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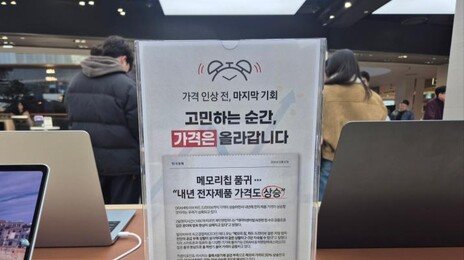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