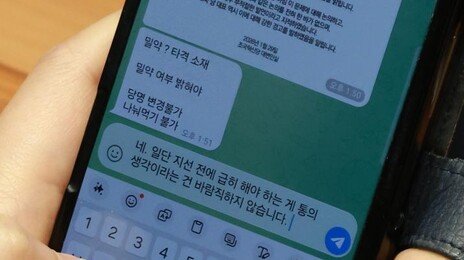공유하기
[기고/홍두승]마흔살 예비군, 소수정예군 키우자
-
입력 2008년 4월 7일 02시 51분
글자크기 설정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국가방위의 저비용 대안으로 예비군 제도를 운용한다. 정보·지식 중심의 첨단 정보과학군을 지향하면서 선진정예 강군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방개혁 2020’도 2020년까지 상비군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예비전력을 정예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창설 40년의 예비군은 국민과 정책당국자들의 관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현역 위주 군운용으로 예비전력에 대한 투자는 미미하고, 예비군과 동원 분야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뒤로 밀리고 있다.
그 결과 예비군은 장비 훈련시간 훈련방식 지휘조직 동원제도 운영예산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됐다. 특히 300만 명에 이르는 예비군의 훈련과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T-50 국산초음속훈련기 3대 값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규모이다. 육군의 경우 2008년도 예비전력 관련 예산은 2992억 원으로 경상비의 2.6% 수준. 이나마도 경상비 위주로 편성돼 전력증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비군 개인화기의 절반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카빈소총이다. 국가차원의 예산 및 제도의 뒷받침 없이 예비군제도가 실질적인 국방전력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예비군은 시민예비군(citizen-soldiers)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시민예비군은 모든 국민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국가방위의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스스로를 지킬 의무를 진다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예비군 복무는 국가와 사회에 의무일 뿐 아니라 국가사회의 성원임을 재확인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서구 국가에서 시민예비군 복무가 참정권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으로 간주되어 온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향후 상비군 감축에 대비해 예비군제도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비군을 소수 정예화하고 현역에 준하는 전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예비전력을 운영하는 군 부대 조직에 예비역 자원을 폭 넓게 활용함으로써 현역과의 연계를 높이고 유사시 긴밀하게 동원해 임무수행에 투입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37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예비군인 주방위군은 지금도 이라크를 포함해 세계분쟁지역에 파견되며, 6·25전쟁 때는 13만8000여 명이 동원됐다.
예비군은 창설 당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출발했다. 그 후 훈련 기간 및 시간 단축 등 예비군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정치쟁점이 되기도 했다. 국민생활 불편은 최소화해야겠지만 실제 전력화에 필요한 교육·훈련이라면 원칙대로 충실히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평시 생업에 종사하면서 예비군 훈련에 동원될 경우 보상의 현실화도 이뤄져야 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예비군제도에 대한 정책 개발과 적정한 투자, 그리고 사회적 관심을 통해 정예 예비군으로 거듭 날 수 있게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홍두승 서울대 교수 사회학과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정해인, 서양 남성 사이에서 곤혹…인종차별 의혹도
-
5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6
[사설]‘무리해서 집 살 필요 없다’는 믿음 커져야 투기 잡힌다
-
7
홍석천 “부동산에 속아 2억에 넘긴 재개발 앞둔 집, 현재 30억”
-
8
[횡설수설/김창덕]“그는 정치적 동물이야”
-
9
‘역대급 실적’ 은행들, 성과급 최대 350%… 금요일 단축 근무
-
10
인간은 구경만…AI끼리 주인 뒷담화 내뱉는 SNS ‘몰트북’ 등장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5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6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7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8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9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10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정해인, 서양 남성 사이에서 곤혹…인종차별 의혹도
-
5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6
[사설]‘무리해서 집 살 필요 없다’는 믿음 커져야 투기 잡힌다
-
7
홍석천 “부동산에 속아 2억에 넘긴 재개발 앞둔 집, 현재 30억”
-
8
[횡설수설/김창덕]“그는 정치적 동물이야”
-
9
‘역대급 실적’ 은행들, 성과급 최대 350%… 금요일 단축 근무
-
10
인간은 구경만…AI끼리 주인 뒷담화 내뱉는 SNS ‘몰트북’ 등장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5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6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7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8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9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10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박중훈의 세상스크린]배우지망생때의 시련](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