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횡설수설/김순덕]사회적 일자리
-
입력 2006년 2월 3일 03시 05분
글자크기 설정

▷‘인간의 얼굴을 한 복지.’ 스웨덴의 싱크탱크 ‘팀브로’는 새로운 스웨덴 모델을 이렇게 소개했다. 1990년대 초 경제 침체를 겪으며 스웨덴은 정부의 복지 독점체제를 깼다. 치솟는 복지비용과 인간의 공짜 심리를 감당할 수 없어서다. 수요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공급자에게는 경쟁을 보장했더니 복지도 비로소 인간의 얼굴을 갖게 됐다는 평가다. 학교와 병원은 물론이고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도 민간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부는 관리감독에 주력했다. 그러자 기존의 공공서비스까지 놀랍게 달라졌다.
▷공공부문 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는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이 전 위원장은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필요하되 시장에 맡겨 두면 수익성이 낮아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일자리’를 지난해 7만 개에서 올해 13만 개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여성 가장(家長)에게 간병전문 교육을 실시해 저소득층 환자에게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면 취업이 힘든 계층은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 저소득층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좋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활용 유리병 수거 같은 ‘공익형 단순노동’이 적지 않다.
▷공공부문이 제공하든 민간부문이 제공하든 서비스는 서비스다. 스웨덴에선 복지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규제를 풀자 서비스의 질과 일하는 사람의 삶이 더 좋아졌다. 노무현 정부는 복지서비스부문을 민간에 맡기면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고 믿는 듯하다.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실험이 끝난 일을 놓고 우리나라는 뒤늦게 씨름하고 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횡설수설 >
-

임용한의 전쟁사
구독
-

이승재의 무비홀릭
구독
-

사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가짜 금 주의보[횡설수설/이진영]](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12/133142685.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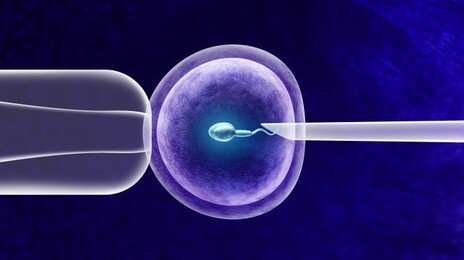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