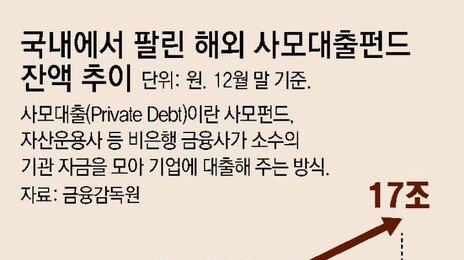공유하기
[소설]8월의 저편 187…전안례(奠雁禮) 10
-
입력 2002년 12월 3일 17시 45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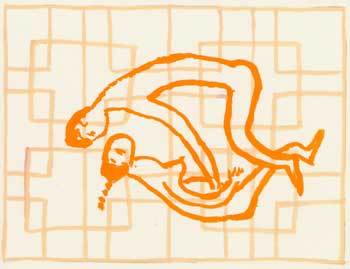
“인혜 손이 작은 거지.”
“아입니다, 당신 손이 큰 거지예. 보이소, 내 손이 둘이나 쏙 들어간다 아입니까.”
우철은 아내의 머리를 살며시 껴안고 혀로 가르마를 더듬었다. 인혜는 간지러워하며 몸을 뒤틀었지만, 가마께에 뜨거운 숨이 느껴지면서 남편의 어깨가 웃음을 막았다. 머리에 바른 동백기름 냄새가 땀냄새와 섞이고, 둘은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인혜는 남편의 건장하고 탄력 있는 몸이 자기를 관통하고 싶어하는 것을 느끼고, 우철은 아내의 따스하고 부드러운 몸이 자기를 포근히 감싸안고 싶어하는 것을 느꼈다. 한여름 강가에서 서로를 원했을 때 같은 무모한 격렬함은 없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둘은 꼭 껴안은 채 조용히 부유했다.
“안고 싶다.”
“…안 됩니다.”
-울퉁불퉁 커다란 손이 손을 잡고 아래로 아래로, 입술로 파고 들어온 두툼한 혀가 이와 잇몸과 혀에 남아 있는 맛을 남김없이 핥아내고, 꼭 잡은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불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아래로 더 아래로, 턱을 핥고, 머리를 누르고, 요람 안에 있는 것처럼, 요람을 흔드는 것처럼, 당신의 손으로, 내 손으로, 흔들고, 흔들리고, 흔들고, 흔들리고, 인혜, 아이고, 인혜, 저 높은 곳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인혜! 지붕보다 별보다 높은 곳에서, 인혜, 인혜, 인혜!
푸우…파아…푸우…파아…굵고 깊은 숨소리가 들린다. 욕망이 사라진 후에는 늘 노래가 끊긴 듯한 허전함을 느낀다. 이어지는 소절은 아무리 숨을 들이쉬어도 노래할 수 없고, 아무리 귀기울여도 들을 수 없다.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뚝 하고. 인혜는 남편의 손을 살며시 쥐어본다. 아까보다 따뜻하다. 손을 놓고 가슴을 누른다. 속이 메슥거린다. 올라올지도 모르겠다. 냄새나는 누런 위액으로 초례방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자자. 잠들면 그냥 지나칠 수 있다. 이대로 어떻게든 잠들면…푸우…파아…푸우…파아…내 숨이 좀 빠르다…푸우…파아…푸우…파아…조금씩 맞아간다…푸우…파아…푸우…파아…푸우…파아….
글·유미리
이라크 파병 : 보상 >
-

광화문에서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대덕연구개발특구 10년
구독
트렌드뉴스
-
1
배우 이상아 애견카페에 경찰 출동…“법 개정에 예견된 일”
-
2
트럼프 안 겁내는 스페인…공습 협조 거부하고 무역 협박도 무시
-
3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4
美국방차관 “한국이 北 상대 재래식 대응 책임지기로 합의”
-
5
美국방 “폭탄 무제한 비축…이틀내 이란 영공 완전 장악할것”
-
6
하메네이 사망에 ‘트럼프 댄스’ 환호…이란 여성 정체 밝혀졌다
-
7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8
하메네이 장례식 연기…이란 “전례 없는 인파 우려”
-
9
이스라엘 “F-35 아디르 전투기로 이란 YAK-130 격추”
-
10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1
‘증시 패닉’ 어제보다 더했다…코스피 12%, 코스닥 14% 폭락
-
2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3
“혁명수비대 업은 강경파” vs “빈살만식 개혁 가능”…하메네이 차남 엇갈린 평가
-
4
주가 폭락에…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
5
“한국 교회 큰 위기…설교 강단서 복음의 본질 회복해야”
-
6
국힘 또 ‘징계 정치’… 한동훈과 대구行 8명 윤리위 제소
-
7
李 “檢 수사·기소권으로 증거조작…강도·살인보다 나쁜 짓”
-
8
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 사퇴도 타이밍 있다”
-
9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증거 인멸 염려”
-
10
李 “필리핀 대통령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인도 요청”
트렌드뉴스
-
1
배우 이상아 애견카페에 경찰 출동…“법 개정에 예견된 일”
-
2
트럼프 안 겁내는 스페인…공습 협조 거부하고 무역 협박도 무시
-
3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4
美국방차관 “한국이 北 상대 재래식 대응 책임지기로 합의”
-
5
美국방 “폭탄 무제한 비축…이틀내 이란 영공 완전 장악할것”
-
6
하메네이 사망에 ‘트럼프 댄스’ 환호…이란 여성 정체 밝혀졌다
-
7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8
하메네이 장례식 연기…이란 “전례 없는 인파 우려”
-
9
이스라엘 “F-35 아디르 전투기로 이란 YAK-130 격추”
-
10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1
‘증시 패닉’ 어제보다 더했다…코스피 12%, 코스닥 14% 폭락
-
2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3
“혁명수비대 업은 강경파” vs “빈살만식 개혁 가능”…하메네이 차남 엇갈린 평가
-
4
주가 폭락에…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
5
“한국 교회 큰 위기…설교 강단서 복음의 본질 회복해야”
-
6
국힘 또 ‘징계 정치’… 한동훈과 대구行 8명 윤리위 제소
-
7
李 “檢 수사·기소권으로 증거조작…강도·살인보다 나쁜 짓”
-
8
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 사퇴도 타이밍 있다”
-
9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증거 인멸 염려”
-
10
李 “필리핀 대통령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인도 요청”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