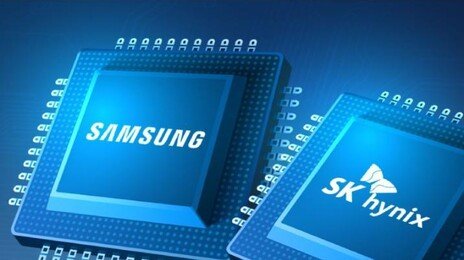공유하기
[방송]다큐 <잠자리>만든 '카메듀서' 이의호
-
입력 2001년 1월 15일 18시 50분
글자크기 설정

92년 그는 카메라 촬영과 연출까지 혼자서 한 자연다큐멘터리 ‘논’을 만들어 ‘카메듀서’(카메라맨+프로듀서)라는 ‘한국식’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그의 이력은 독특하다. 홍익대 미대(공예학과)를 졸업한 그는 85년 EBS 미술팀에 입사했다. 그래픽 담당자로 일하던 중 자연 다큐를 찍고 싶다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밤에는 홀로 카메라 기술을 익혔다. 마침내 92년 자연 다큐 전문 카메라맨으로 전업했고, 현재는 다큐 전문 ‘카메듀서’로 활동 중이다.
16일 방영되는 <잠자리>는 <논>, <풀섶의 세레나데>에 이어 그가 ‘카메듀서’로서 만든 세 번째 작품. 그는 “독특하고 화려한 동물보다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면서도 막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잠자리를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평범한 잠자리의 생애를 7개월에 걸쳐 아름다운 영상에 담아냈다. 맑고 투명한 날씨에만 촬영을 한 덕분에 푸른색, 빨간색 등 갖가지 잠자리의 색깔과 배경인 자연의 모습이 선명하고 깨끗하다. 특히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잠자리의 네 날개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잡아낸 것이라든지, 물잠자리들이 하트 모양의 자세로 짝짓기하는 장면이 돋보인다.
그의 ‘전업’은 매번 성공적인 편이었다. 카메라맨으로 만든 <하늘다람쥐의 숲> <물총새 부부의 여름나기>, 그리고 첫 연출작인 <논>은 각종 자연 다큐 페스티벌에 출품돼 호평을 받았다. 특히 <논>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에 50분짜리 다큐로서는 국내 최고 금액인 3만2000달러에 팔리기도 했다.
환경 다큐멘터리에 매달리는 이유에 대해 그는 “자연을 알아야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만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해야겠다는 의식도 생길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같은 그의 생각은 이번 다큐 <잠자리>에도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산란철의 잠자리들이 물표면처럼 반짝이는 자동차 유리창을 물웅덩이로 착각하고 연신 몸을 부딪치며 알을 낳으려고 몸부림치는 장면을 통해 그는 잠자리들이 살 수 없게 된 도시 환경을 되돌아보도록 만든다.
<강수진기자>sjkang@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