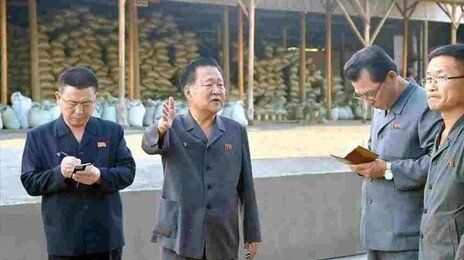공유하기
[인터뷰]CF계 '신의 손' 박명천감독
-
입력 2000년 6월 11일 21시 38분
글자크기 설정

흔히 말하는 ‘광고쟁이’의 방이 아니었다. 사무실로 개조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주택의 전망좋은 2층에 자리잡은 작업실. CF계 ‘미다스의 손’ 박명천 감독(31·매스매스 에이지 대표)의 공간이다. 모든게 직각으로 정리돼 있지 않으면 일이 손에 안잡히는 성격. 이 속에서 요즘 촌스러워 화제인 ‘016Na’광고를 비롯, 엽기적 이미지의 ‘마이크로 아이’, 앙큼한 ‘도도화장품’, 그리고 알듯모를 듯해서 관심을 끈 ‘스무살의 TTL’광고 등이 만들어졌다. 광고 자체를 이슈로 만드는 그의 영상은 어떻게 나왔을까》
▽이미지로 사고한다〓그는 키치적이며 때로 엽기적이기까지 하다.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재학시절 만화서클 ‘네모라미’에서 만화를 그리던 시절부터 그의 작품에는 사람인지 괴물인지 알수 없는 물체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다. 그가 광고안에 담는 영상 하나하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이 안나오는 ‘이상한 영상’이다.
“젊은세대는 사물을 이미지로 기억하니까요. 어떻게든 기억에 남을만한 영상을 만드는게 우선이죠.”
그가 역설하는 것은 ‘기억의 파편’이다. 약장수처럼 주절거리는 광고가 아니라 웃긴 표정 하나, 강렬한 이미지의 대사 한마디가 결국은 광고 전체의 이미지로 남는다고 믿는다. 논리가 아니라 이미지로 사고하는 ‘뉴 밀레니엄 영상세대’의 감수성을 그는 성감대처럼 자극한다.
“영상 이미지를 강조하는 탓에 남들은 ‘만든 사람도 모르고 광고주도 모르고 보는 사람도 모르는 광고’라고 깎아내립니다. 제가 설치해둔 여러 장치들이 어느새 머릿속에 각인되는걸 모르고 말이죠.”
아는가. ‘016Na’ 편에는 제품의 이름을 지칭하는 ‘나’발음이 14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광고계 ‘신의 손’〓한달 평균 10편씩 CF를 찍는다. 사흘에 한작품씩. 최대 40만명 가입이 목표라던 TTL은 넉달만에 200만이 넘었고 연간 1만개 팔리면 대박이라던 도도화장품은 그의 손이 닿자마자 한달 1만개 판매로 뛰어올랐다.
이쯤되자 기획단계에서부터 그를 초빙하려는 광고주들이 줄을 선다. ‘미다스의 손’을 넘어 이젠 ‘신의 손’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박감독은 3년여의 조감독 시절을 끝내고 1997년 ‘물고기와 소녀’라는 이색상황을 도입한 청바지 ‘닉스’광고로 일약 CF계의 혜성으로 등장했다. 전원주가 ‘짱가’주제가를 불러 히트쳤던 98년의 ‘002데이콤’으로 명성을 이어갔고 잇달아 터진 ‘스무살의 TTL’편과 남편과 부인의 짤막한 대화로만 이뤄졌던 ‘한미은행’편, 골목길 향수를 불러일으켰던 ‘스니커즈’광고 등으로 더 이상 올라설 곳이 없을 만큼 그의 주가는 올라갔다.
“스토리를 설정하고 주인공의 캐릭터를 불어넣고 대사를 만들고…. 어려서부터 만화를 잘그린게 광고제작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서른 하나, 불타는 열정으로〓좌절의 시간은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가 닥치며 한달에 한편도 광고를 따내지 못해 사무실 임대료를 못낸 정도는 괜찮았다.
골목길에서 오빠가 교복을 입은 여동생과 그의 남자친구의 머리를 쵸코바로 치며 훈계하는 ‘스니커즈’CF 2편이 전파를 타지 못한게 가장 슬펐던 순간. ‘교복을 입고 못된짓을 했다’는 게 심의에서 기각받은 이유였다.
“TV드라마에선 선생님과 결혼해서 애도 낳는데 광고는 아직도 불합리한 장벽이 너무 많아요.”
결벽증에 가까운 깔끔 때문일까. 스스로 ‘걸레’같은 광고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 때면 그나마 하루 서너시간씩 자는 잠도 오지 않는다. 이미지란 쉽게, 퍼뜩 떠오르는 것이라고? 천만에! 개가 자연스레 웃는 표정을 담으려고 몇 달씩 같이 뒹굴며 종국엔 주종관계를 만들어버리는 정도는 보통이다.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박명천의 광고’가 깊숙이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 그는 사람들 잠재의식 속을 수없이 넘나든다. 편집광처럼 집요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조인직기자>cij1999@donga.com
애니메이션 >
-

어린이 책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동아시론
구독
트렌드뉴스
-
1
이란, 중동 美기지 4곳 ‘조준 공격’…“미군 4만명 이란 사정권”
-
2
[단독]폴란드, 韓 해군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 무상 양도 안받기로
-
3
하메네이, 집무실 비워 공습 피해…“최근 암살 시도 걱정”
-
4
트럼프, 이란 향해 “국민은 봉기하고 군인은 무기 내려놔라”
-
5
집무실 ‘가루’ 된 하메네이, 생사 불확실…권력 계승자 4명 정해놔
-
6
“내 항공권 어쩌나” 도하 영공 전면 폐쇄…중동 하늘길 막혔다
-
7
장동혁, 이준석-전한길 토론 보더니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필요”
-
8
‘노인 냄새’ 씻으면 없어질까?…“목욕보다 식단이 더 중요”[노화설계]
-
9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10
‘지지율 바닥’ 쇼크에도… 민심과 따로 가는 국힘
-
1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2
장동혁, 이준석-전한길 토론 보더니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필요”
-
3
대구 간 한동훈 “죽이되든 밥이되든 나설것”
-
4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5
송광사 찾은 李대통령 내외…“고요함 속 다시 힘 얻어”
-
6
‘지지율 바닥’ 쇼크에도… 민심과 따로 가는 국힘
-
7
[책의 향기]무기 팔고자 위협을 제조하는 美 군산복합체
-
8
큰 거 온다더니 ‘틱톡커 이재명’…“팔로우 좋아요 아시죠?”
-
9
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법도 강행 처리… 법원행정처장 사퇴
-
10
쿠팡 김범석, 정보유출 99일만에 영어로 “사과”
트렌드뉴스
-
1
이란, 중동 美기지 4곳 ‘조준 공격’…“미군 4만명 이란 사정권”
-
2
[단독]폴란드, 韓 해군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 무상 양도 안받기로
-
3
하메네이, 집무실 비워 공습 피해…“최근 암살 시도 걱정”
-
4
트럼프, 이란 향해 “국민은 봉기하고 군인은 무기 내려놔라”
-
5
집무실 ‘가루’ 된 하메네이, 생사 불확실…권력 계승자 4명 정해놔
-
6
“내 항공권 어쩌나” 도하 영공 전면 폐쇄…중동 하늘길 막혔다
-
7
장동혁, 이준석-전한길 토론 보더니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필요”
-
8
‘노인 냄새’ 씻으면 없어질까?…“목욕보다 식단이 더 중요”[노화설계]
-
9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10
‘지지율 바닥’ 쇼크에도… 민심과 따로 가는 국힘
-
1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2
장동혁, 이준석-전한길 토론 보더니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필요”
-
3
대구 간 한동훈 “죽이되든 밥이되든 나설것”
-
4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5
송광사 찾은 李대통령 내외…“고요함 속 다시 힘 얻어”
-
6
‘지지율 바닥’ 쇼크에도… 민심과 따로 가는 국힘
-
7
[책의 향기]무기 팔고자 위협을 제조하는 美 군산복합체
-
8
큰 거 온다더니 ‘틱톡커 이재명’…“팔로우 좋아요 아시죠?”
-
9
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법도 강행 처리… 법원행정처장 사퇴
-
10
쿠팡 김범석, 정보유출 99일만에 영어로 “사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애니메이션]'환타지아 2000' 8월 5일 개봉](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