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420억불 인출… 은행 무너뜨린 스마트폰[횡설수설/김재영]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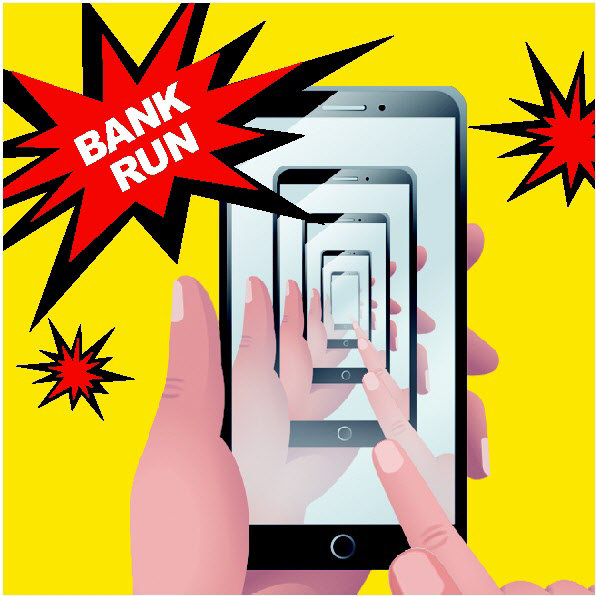
버스에 오르니 모두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정신없었다. 사무용 메신저 슬랙을 보곤 황급히 은행 앱을 켜고 회사 자금을 이체하고 있었다. 미국 실리콘밸리 곳곳에서 동시에 벌어진 이 같은 풍경에 9일 하루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빠진 돈이 420억 달러(약 56조 원).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한 조용하고도 신속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의 현장이었다.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이뤄진 ‘디지털 뱅크런’에 40년 역사의 SVB는 채 이틀도 안 돼 무너졌다.
▷전통적인 뱅크런은 은행 창구나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이뤄졌다. 문자 그대로 은행으로 달려가야 했다. 1997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한꺼번에 은행으로 몰려 북새통을 이뤘던 장면이 기억에 선하다. 번호표를 받기 위해 지점 앞에 줄을 서 뜬눈으로 밤을 새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 뱅크런은 이 같은 예금자들의 동요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은행과 금융당국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침묵의 암살자처럼 은행을 위기로 몰아넣는다.
▷고객들이 신속하게 돈을 빼기로 결심한 데는 소셜미디어도 한몫했다. SVB의 주요 고객인 스타트업 창업자와 투자자들은 온라인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다. 슬랙, 와츠앱 등의 메신저를 통해 “SVB가 불안하다” “나는 돈을 뺐다”는 공포의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주가 하락 뉴스에도 설마 하던 사람들은 동료들의 재촉에 탈출을 결심했다. 신속한 정보전달과 빠른 실행을 가능케 했던 실리콘밸리의 기술이 오히려 파국을 앞당긴 셈이다.
▷뱅크런을 연구한 학자들이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것도 의미심장하다.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는 수상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금융위기는 사람들이 금융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고 했다. 기술의 발전으로 불안의 전염이 어느 때보다 빠른 시대다. 위기의 전개방식도 예측 불가능해졌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가 뱅크런의 방아쇠 역할을 할지 누가 알았으랴. 과거의 위기 극복 백서만 들춰봐서는 정답을 찾을 수 없게 됐다.
횡설수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어린이 책
구독
-

밑줄 긋기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최태원 “SK하이닉스 이익 1000억달러 전망? 1000억달러 손실 될수도”
-
2
“장동혁 사퇴” “분열 행위”…‘尹 절연’ 거부에 원외당협 정면 충돌
-
3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4
야상 입은 이정현, ‘계엄 연상’ 지적에 “뻥도 그정도면 병”
-
5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6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7
尹선고 후 최시원 “불의필망”…SM, 악플러에 법적 대응
-
8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
9
조승래 “8곳 단체장 ‘무능한 尹키즈’…6·3 선거서 퇴출할 것”
-
10
‘삼전닉스’보다 의대?…고대·연대 계약학과 144명 등록포기
-
1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2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3
李 “다주택자 압박하면 전월세 불안? 기적의 논리”
-
4
‘면직’ 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질주…보행자 칠뻔, 車 2대 ‘쾅’
-
5
“장동혁 사퇴” “분열 행위”…‘尹 절연’ 거부에 원외당협 정면 충돌
-
6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7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8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9
야상 입은 이정현, ‘계엄 연상’ 지적에 “뻥도 그정도면 병”
-
10
브라질 영부인, 김혜경 여사에 “삼바 축제 방문해달라”
트렌드뉴스
-
1
최태원 “SK하이닉스 이익 1000억달러 전망? 1000억달러 손실 될수도”
-
2
“장동혁 사퇴” “분열 행위”…‘尹 절연’ 거부에 원외당협 정면 충돌
-
3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4
야상 입은 이정현, ‘계엄 연상’ 지적에 “뻥도 그정도면 병”
-
5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6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7
尹선고 후 최시원 “불의필망”…SM, 악플러에 법적 대응
-
8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
9
조승래 “8곳 단체장 ‘무능한 尹키즈’…6·3 선거서 퇴출할 것”
-
10
‘삼전닉스’보다 의대?…고대·연대 계약학과 144명 등록포기
-
1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2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3
李 “다주택자 압박하면 전월세 불안? 기적의 논리”
-
4
‘면직’ 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질주…보행자 칠뻔, 車 2대 ‘쾅’
-
5
“장동혁 사퇴” “분열 행위”…‘尹 절연’ 거부에 원외당협 정면 충돌
-
6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7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8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9
야상 입은 이정현, ‘계엄 연상’ 지적에 “뻥도 그정도면 병”
-
10
브라질 영부인, 김혜경 여사에 “삼바 축제 방문해달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횡설수설/이진영]BTS 광화문 공연 D-1개월](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2/20/133392476.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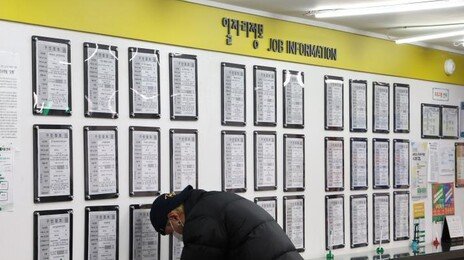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