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향기]억울한 비둘기… ‘평화의 전령’서 ‘날개 달린 쥐’로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인간 필요에 따라 위상 오락가락
사랑받거나 경멸받는 동물의 삶
구분짓기보다 공존의 길 찾아야
◇나쁜 동물의 탄생/베서니 브룩셔 지음·김명남 옮김/508쪽·2만4000원·북트리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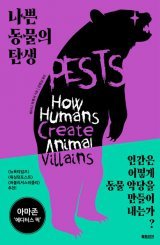
비둘기는 고대 페르시아에선 전령으로 활약했고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적군의 이동에 관한 결정적 정보를 전달했다. 20세기 중반 미국 서민에겐 유용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신과 휴대전화가 보급되고 공장식 닭 사육이 가능해지면서 비둘기는 설 자리를 잃었다. 높은 지능과 번식력은 되레 혐오의 명분이 됐다. 연구 결과 비둘기는 이들의 배설물을 흡입하지 않는 이상 병균을 옮기지 않는다. 산성비만큼 건물에 해롭지도 않다.
이 책은 비둘기처럼 애꿎게 혐오의 대상이 된 동물들의 편에서, 이들을 향한 인식의 변천사를 짚는다. 과학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기심 등이 동물에 ‘골칫거리’ 이미지를 덧씌웠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곳곳의 동물행동학자, 야생동물 보전활동가, 토착 원주민 등과 함께 살펴본 동물의 다층적 면모를 유쾌하고 현장감 있게 들려준다.
동물의 이미지는 국제 정세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도시민에게 영물인 코끼리는 가까이에서 사는 현지인에겐 ‘살아 있는 탱크’다. 인간을 포함한 다른 생물을 찢어발기고, 농부의 한철 작물을 싹 먹어 치운다. 경제 가치에 따라 사람보다 코끼리 목숨이 더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한다. 케냐에서 코끼리는 사람보다 귀하다. 코끼리가 밀렵을 당하면 현장에 서른 명이 출동하지만, 코끼리에게 사람이 다칠 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코끼리 살해 벌금은 2000만 케냐실링이지만 코끼리에 받쳐 죽은 피해자에겐 고작 500만 케냐실링이 주어진다.
이런 모순은 코끼리를 보러 오는 서구 관광객과 이들이 내는 서식 환경 보전 지원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저자는 서구에서 오는 이런 ‘온정주의적 지원’이 결과적으로는 생태계 질서를 왜곡시키고 현지인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해동물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과 혐오는 이면의 사정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무지 때문일지도 모른다. 책이 제시하는 해법은 우리 주변 동물들의 생태를 이해하고 알맞은 공생 방식을 찾음으로써 ‘정신적 쥐덫’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지금 방식대로 계속 사는 한 유해 동물은 늘 우리 앞을 막아설 것”이라며 ‘더불어 사는 삶’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의 향기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양정무의 미술과 경제
구독
-

초대석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李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개혁은 안돼”…추미애 법사위 겨냥?
-
2
한국 성인 4명 중 1명만 한다…오래 살려면 ‘이 운동’부터[노화설계]
-
3
국힘 공관위, 오세훈 겨냥 “후보 없더라도 공천 기강 세울 것”
-
4
이란 “최고지도자로 모즈타바 선출”…美와 화해 멀어졌다
-
5
빗장풀린 주한미군 무기 차출… “통보-협의 절차도 축소할듯”
-
6
1평 사무실서 ‘월천’… 내 이름이 간판이면 은퇴는 없다[은퇴 레시피]
-
7
“왜 나만 늙었지?”…서울대 명예교수가 꼽은 ‘피부노화 습관’ [노화설계]
-
8
이승윤 “촬영중 말벌 쏘여 아나필락시스 쇼크…의식 잃고 응급실行”
-
9
‘주사이모’ 돌연 얼굴 공개…“박나래 연락하나” 질문엔 침묵
-
10
코스피 장중 52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1
국힘 공관위, 오세훈 겨냥 “후보 없더라도 공천 기강 세울 것”
-
2
[천광암 칼럼]“尹이 계속했어도 주가 6,000”… 정말 가능했을까
-
3
빗장풀린 주한미군 무기 차출… “통보-협의 절차도 축소할듯”
-
4
한동훈 “尹이어도 코스피 6000 가능” 발언에…與 “윤어게인 본색”
-
5
李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개혁은 안돼”…추미애 법사위 겨냥?
-
6
마감까지 공천신청 안한 오세훈… 吳측 “중대결단 배제 안해”
-
7
이란 “최고지도자로 모즈타바 선출”…美와 화해 멀어졌다
-
8
韓야구, 대만에도 졌다…‘피홈런’ 최다팀 불명예까지
-
9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 안했다…“당 노선변경 촉구”
-
10
[사설]李 “집권했다고 맘대로 다 못한다”… 이 시점에 다짐한 까닭은
트렌드뉴스
-
1
李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개혁은 안돼”…추미애 법사위 겨냥?
-
2
한국 성인 4명 중 1명만 한다…오래 살려면 ‘이 운동’부터[노화설계]
-
3
국힘 공관위, 오세훈 겨냥 “후보 없더라도 공천 기강 세울 것”
-
4
이란 “최고지도자로 모즈타바 선출”…美와 화해 멀어졌다
-
5
빗장풀린 주한미군 무기 차출… “통보-협의 절차도 축소할듯”
-
6
1평 사무실서 ‘월천’… 내 이름이 간판이면 은퇴는 없다[은퇴 레시피]
-
7
“왜 나만 늙었지?”…서울대 명예교수가 꼽은 ‘피부노화 습관’ [노화설계]
-
8
이승윤 “촬영중 말벌 쏘여 아나필락시스 쇼크…의식 잃고 응급실行”
-
9
‘주사이모’ 돌연 얼굴 공개…“박나래 연락하나” 질문엔 침묵
-
10
코스피 장중 52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1
국힘 공관위, 오세훈 겨냥 “후보 없더라도 공천 기강 세울 것”
-
2
[천광암 칼럼]“尹이 계속했어도 주가 6,000”… 정말 가능했을까
-
3
빗장풀린 주한미군 무기 차출… “통보-협의 절차도 축소할듯”
-
4
한동훈 “尹이어도 코스피 6000 가능” 발언에…與 “윤어게인 본색”
-
5
李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개혁은 안돼”…추미애 법사위 겨냥?
-
6
마감까지 공천신청 안한 오세훈… 吳측 “중대결단 배제 안해”
-
7
이란 “최고지도자로 모즈타바 선출”…美와 화해 멀어졌다
-
8
韓야구, 대만에도 졌다…‘피홈런’ 최다팀 불명예까지
-
9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 안했다…“당 노선변경 촉구”
-
10
[사설]李 “집권했다고 맘대로 다 못한다”… 이 시점에 다짐한 까닭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밑줄 긋기]꿈 목욕](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3/06/133479332.4.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