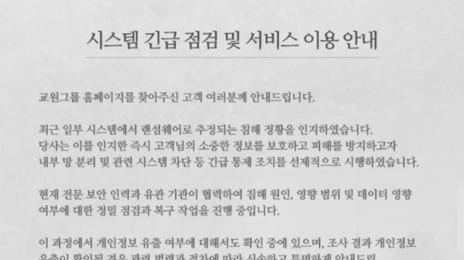공유하기
[사설]市場은 경제관료 ‘파워게임’ 무대 아니다
-
입력 2008년 4월 3일 23시 32분
글자크기 설정
메가뱅크는 금융 공기업 민영화의 틀을 송두리째 바꿀 뿐 아니라 금융계 지도를 새로 그려야 할 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당연히 한국 금융의 미래상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도 강 장관은 주무부처와 조율도 하지 않은 채 불쑥 ‘아이디어’를 내놓아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했다. 금융회사 대형화라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민영화 완료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관료들이 민영화를 지연시키고 국책은행 지배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이라는 해석이 나올 만하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표방하며 출범한 지 40일이 됐지만 경제 관료들의 힘겨루기와 이에 따른 정책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금리 및 환율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기(氣)싸움을 벌인 후유증도 아직 가시지 않았다. 파워게임이 벌어진 무대의 막전막후에는 강 장관과 대통령수석비서관의 이름이 등장해 뒷공론을 낳는다. 강 장관이 제동을 건 산은 민영화 방안만 해도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개별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의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정책 당국자들의 책무는 누구의 파워가 더 센지 겨루는 게 아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스템보다는 특정인의 취향에 따라 춤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한국 금융계는 관치로도 모자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뭉친 ‘이헌재 사단’이 끼리끼리 요직을 독점한 인치(人治)의 폐해를 겪었다. 이런 식이라면 비슷한 과오가 새 정부에서 재연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화제의 비디오 >
-

지금, 여기
구독
-

이원홍의 스포트라이트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화제의 비디오]분출구 못찾은 젊음 그린 「크랙시티」](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