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오늘의 날씨/4월 3일]눈 따끔, 목 간질, 얼굴 푸석
-
입력 2007년 4월 3일 03시 01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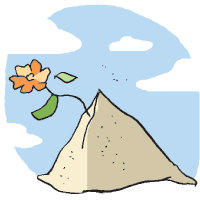
어찔어찔 멀미나는 봄. 꽃들이 폭죽처럼 터지는가 했더니, 한순간 누런 흙바람이 천지를 덮어버렸다. 눈 따끔, 목 간질, 얼굴 푸석. 몸에선 온종일 서걱서걱 마른 갈대들의 몸 비비는 소리. 모래밥알을 씹는 언짢음. 그러다가 왈칵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달아오른다. “그동안 너무 쉽고 편한 것에만 길들었구나! 나도 다음 생엔 한줌 먼지 되어 어디론가 날아갈 텐데….”
김화성 기자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2
당뇨병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 받는다
-
3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
4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5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6
블랙핑크, ‘레드 다이아’ 버튼 받았다…세계 아티스트 최초
-
7
구성환 반려견 ‘꽃분이’ 무지개다리 건넜다…“언젠가 꼭 다시 만나”
-
8
“넌 이미 엄마 인생의 금메달”…최민정, 母손편지 품고 뛰었다
-
9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10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4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5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6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7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8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9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10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2
당뇨병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 받는다
-
3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
4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5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6
블랙핑크, ‘레드 다이아’ 버튼 받았다…세계 아티스트 최초
-
7
구성환 반려견 ‘꽃분이’ 무지개다리 건넜다…“언젠가 꼭 다시 만나”
-
8
“넌 이미 엄마 인생의 금메달”…최민정, 母손편지 품고 뛰었다
-
9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10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4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5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6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7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8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9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10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미리보는 명승부/일본-벨기에전]양팀 "16강 분수령"](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2/05/29/6859329.1.jpg)




![합리적 관련성’ 없는 별건 수사 말라는 법원의 경고[오늘과 내일/장택동]‘](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392680.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