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화문에서/하준우]단순함이 좋다
-
입력 2006년 12월 18일 20시 34분
글자크기 설정

한국의 대학입시는 우수 학생을 선발하려는 대학의 자율성과 국가 주도의 평등주의라는 2가지 축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1945년 광복 이후 대입제도는 14차례의 크고 작은 변화를 거쳤고, 2008학년도에 또 한 차례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학별 고사는 1962, 63년에 사라졌다가 64년에 다시 등장했다. 이어 1981년에 폐지됐다가 94년 부활했고 97년 국공립대부터 다시 폐지됐다.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구술 논술 등 전형요소를 다양화하면서 수능을 쉽게 내고, 원점수를 폐지한 데 이어 2008학년도엔 수능의 모든 점수를 폐지하는 등급화를 예고했다.
정부의 평등주의 입시 정책은 그 취지대로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에서 전인교육을 꽃피우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하다. 독불장군 정책이란 존재할 수 없다. 이해 관련자의 욕구를 일정 부분 충족하지 못하는 정책은 외면당하기 일쑤다. 이런 점에서 평등주의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대학은 우수 인재를 선발해야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2008학년도엔 영역별 1등급(상위 4%) 수험생이 무려 2만2000여 명이나 쏟아질 지경에 이르자 대학은 자율권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인 논술로 눈을 돌렸다. 논술을 치르는 대학은 인문계는 21개에서 41개로, 자연계는 1개에서 22개로 늘어난다. 수험생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다른 유용한 선발기준이 없는 한 대학은 논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수험생은 다양한 요소에 대비하느라 시간을 쪼개 가며 공부해야 한다. 학교가 해 주지 못하는 논술 및 면접 등을 위해 학원을 전전한다. 교육 당국이 학교 여건을 살피지도 않고 다양한 요소를 도입해 사교육의 배만 불렸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현실이다. 이미 수능 성적표에 원점수를 없애 경쟁요소를 완화했으니 수험생이 기뻐할 듯도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더욱이 높은 학생부 반영 비율은 고교 3년 내내 성적이 뛰어나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학습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 목표는 실종된 지 오래고, 복잡하고 힘든 입시제도와 사교육비에 치를 떠는 사람만 늘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요구는 단순하다. 비현실적인 취지만을 내세워 수능과 학생부 뒤에 숨겨진 ‘물 밑 경쟁’만 가열시키지 말고 차라리 경쟁의 방법을 손쉽게 이해하고 경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낫다. 교과서 한 권과 참고서 한 권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는 없을까.
이를 위해선 대학에 입시 자율권을 되돌려줘야 한다. ‘대입 시장’의 한 축인 대학은 고객인 수험생과 학부모를 불필요할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 만큼 미련하지 않다. 시시콜콜 입학정책을 따져 대학이 샛길을 고르게 하지 말고 단순하고 간명한 길을 걷도록 교육 당국이 도와줘야 한다.
하준우 교육생활부장 hawoo@donga.com
광화문에서 >
-

오늘의 운세
구독
-

정치를 부탁해
구독
-

e글e글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권기범]경찰의 ‘세 가지 시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11/13313460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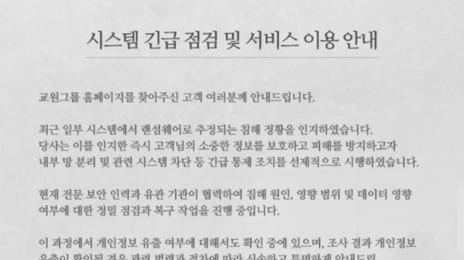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