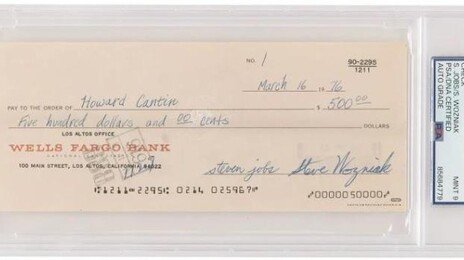공유하기
김동길 “DJ 추종자, 추태 부리는 일 없길”
- 동아닷컴
-
입력 2009년 8월 19일 11시 36분
글자크기 설정

동아일보 자료 사진
김대중 전 대통령 생존 당시 '북한에 돈 준 사람은 투신자살해야 한다'고 비난했던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19일 김 전 대통령 서거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추종자들이 추태를 부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인생무상을 느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모두에게 착잡한 심정과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며 "가히 파란만장한 삶"이라고 추모했다.
그는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 투사로서 반정부 운동에 일선을 담당하는 가운데 박정희 후보에 맞서 싸우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도 했다"며 "일본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동교동 자택에 돌아왔다는 소식에 자택으로 달려가 서로 손을 잡고 기뻐했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추억했다.
끝으로 그는 "나는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적과 과실을 논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앞으로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역사가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어른이 가고 난 뒤에 그의 추종자들이 추태를 부리는 일만은 없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교수는 6월 25일 "남한에서 북으로 간 달러가 핵무기 개발을 도운 것이라면 그 돈을 가져다준 사람은 마땅히 뒷산에 올라가 투신자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김 전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이틀 전인 16일에는 "정계 인물, 재계 인물들이 줄을 지어 김 전 대통령의 병실을 찾는 까닭을 나는 헤아리기가 좀 힘이 든다"며 유력 인사들의 문병 목적에 의구심을 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모두에게 착잡한 심정과 인생의 무상함을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더욱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이제 평화롭게 그 생이 막을 내렸으니 당장에 할 말을 찾기 어렵습니다. 가히 파란만장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일제시대에 태어나 불우한 젊은 날을 보냈을 것이고 해방 직후의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괴로운 젊은 날을 보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 뒤에 정계에 발을 들여놓고 결코 순탄한 나날을 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군사정권 하에서 야당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김대중 씨는 민주화 투사로서 반정부 운동에 일선을 담당하는 가운데 박정희 후보에 맞서서 싸우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에 갔다가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배에 실려 망망대해를 헤매던 중에 바다에 던져져 고기밥이 될 뻔도 하였지만, 천우신조로 살아서 동교동 자택에 돌아올 수 있었고 그 소식을 듣고 자택으로 달려가 서로 손을 잡고 기뻐했던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런 과정에서 한국 민주화 운동의 대표 주자로 떠올랐을 뿐만 아니라 호남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 한국 정계에서는 가장 유력한 정치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적과 과실을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역사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른이 가고 난 뒤에 그의 추종자들이 추태를 부리는 일만은 없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바입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동아닷컴 Only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부동산 빨간펜
구독
-

현장속으로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트렌드뉴스
-
1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2
홍석천 “부동산에 속아 2억에 넘긴 재개발 앞둔 집, 현재 30억”
-
3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4
“놓지마!” 애원에도…술 취해 어린아들 7층 창문에 매단 아버지
-
5
“까치발 들고 물 1.5L 마시기”…50대 매끈한 다리 어떻게? [바디플랜]
-
6
美 군사작전 임박?…감시 항공기 ‘포세이돈’ 이란 인근서 관측
-
7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폭탄…월요일 출근길 비상
-
8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
9
김건희 “편지-영치금 큰 위안” vs 특검 “주가조작 전주이자 공범”
-
10
다카이치, 팔 통증에 생방송 30분전 취소…총선 앞 건강 변수 부상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4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5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6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7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8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9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10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트렌드뉴스
-
1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2
홍석천 “부동산에 속아 2억에 넘긴 재개발 앞둔 집, 현재 30억”
-
3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4
“놓지마!” 애원에도…술 취해 어린아들 7층 창문에 매단 아버지
-
5
“까치발 들고 물 1.5L 마시기”…50대 매끈한 다리 어떻게? [바디플랜]
-
6
美 군사작전 임박?…감시 항공기 ‘포세이돈’ 이란 인근서 관측
-
7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폭탄…월요일 출근길 비상
-
8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
9
김건희 “편지-영치금 큰 위안” vs 특검 “주가조작 전주이자 공범”
-
10
다카이치, 팔 통증에 생방송 30분전 취소…총선 앞 건강 변수 부상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4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5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6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7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8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9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10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자세 교정, 체력증진 효과에 노르딕워킹 배우기 열풍 전국으로 확산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2/09/17/11549657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