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동아광장/박원호]‘생애 첫 투표’ 10대 유권자에게 말 걸기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고3에 투표권 부여한 뒤 사회 무엇을 했나
지방선거 낮은 참여에 청년 발언권 약화돼
운전도 투표도 ‘햇수 쌓이면 능숙’은 착각
‘동료 시민’으로 맞을 의무 우리에게 있어

공직선거법이 2019년 개정되면서 만 18세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대체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이들을 우리가 ‘동료 시민’으로 맞이하는 크나큰 결정을 했던 것이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있었던 매우 열띤 논쟁이나 이것이 한국 정치 참여에 미치는 함의에 비하면 그 이후 10대 유권자들에 대한 아무런 후속 평가도, 그리고 추가적인 고민도 없었던 것 같다. 요컨대 당신은 6월 지방선거에서 처음 투표하게 되는 자녀, 조카, 후배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이 아마 정답일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정치 이야기를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악화시킬 가장 빠른 지름길일 것이며, 애초 정치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당신부터 선거에서 그냥 마음을 떼고 싶을 수 있다.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맞은 ‘첫 선거’에서 표를 던지던 때를 생각해 보라. 그냥 별 이유 없이 기표소 앞에 가서 말없이 줄을 서지 않았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적어도 우리의 젊은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 큰 관심이 없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10대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36% 정도로,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70대(7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경향은 20, 30대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인구 피라미드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연령별 인구 구조를 생각하면, 그리고 도시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청년 인구를 생각하면,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발언권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약화됐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금 선거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는 ‘참여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운전의 비유를 조금만 더 이어가자면, 직접적인 교육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가 좋은 운전으로 모범을 보이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운전자와 유권자의 공통점은 아마 햇수가 쌓이면 저절로 능숙해진다는 것, 그러나 상당수가 ‘불량 운전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초보 운전자’들에게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상대방을 타도해야 할 적으로 바라보면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태도가 매우 전염성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이것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지만, 그것이 무용하거나 오히려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최악의 지도자들을 너무나 빈번하게 당선시킨 것도 결국 선거를 통해서였고, 정당의 공천 과정 자체가 부패해 있다면 과연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드는 것도 당연하다. 일군의 정치학자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옹호하거나 선거를 추첨제로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학자 버나드 크릭이 영국 학교 시민교육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남겼던 ‘크릭 보고서’의 정신은 되새길 만하다. 참정권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정치적 문해력, 사회적·도덕적 책임감, 지역사회로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선거와 정치가 악화 일로를 걷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어느 기성세대는 자신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던 순간들을 회상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은 기나긴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쟁취한 감격스러운 첫 직선제 투표였거나, 외환위기 와중에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던졌던 한 표일 수도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에 열린 유쾌했던 지방선거 이야기나, 대통령이 파면된 후 치러지는 암울한 궐위 선거 이야기도 좋겠다. 그 선거들은 한국 현대사가 됐고, 싫건 좋건 우리 정치 공동체의 자산이 됐다. 첫 선거를 앞둔 젊은 유권자들을 동료 시민으로 맞이하면서,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동아광장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광화문에서
구독
-

사설
구독
-

어린이 책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2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3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노블레스 오블리주 표본”
-
4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
5
블랙핑크, ‘레드 다이아’ 버튼 받았다…세계 아티스트 최초
-
6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7
“넌 이미 엄마 인생의 금메달”…최민정, 母손편지 품고 뛰었다
-
8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9
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관세’…韓 대미 투자, 반도체-車 영향은?
-
10
구성환 반려견 ‘꽃분이’ 무지개다리 건넜다…“언젠가 꼭 다시 만나”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4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5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6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7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8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9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10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트렌드뉴스
-
1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2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3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노블레스 오블리주 표본”
-
4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
5
블랙핑크, ‘레드 다이아’ 버튼 받았다…세계 아티스트 최초
-
6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7
“넌 이미 엄마 인생의 금메달”…최민정, 母손편지 품고 뛰었다
-
8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9
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관세’…韓 대미 투자, 반도체-車 영향은?
-
10
구성환 반려견 ‘꽃분이’ 무지개다리 건넜다…“언젠가 꼭 다시 만나”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4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5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6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7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8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9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10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동아광장/허정]‘韓 수출 7000억 달러’ 성과를 다시 본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06/133106191.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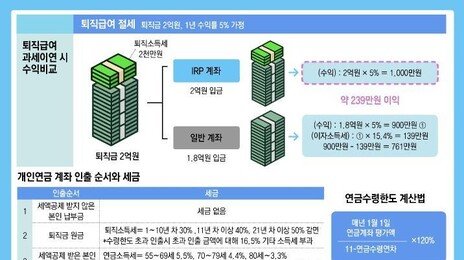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