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기고/원윤희]세금으로 건강보험 재원 만든 선진국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 주요 공약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책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다. 당초 제시했던 소요비용인 연 1조5000억 원의 몇 배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조달의 문제를 강하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건보료 인상만으론 한계
필자는 평소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향상돼야 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과 “그러나 일부 고소득층의 조세부담만을 올려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이고 일시적인 처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에 소요되는 비용도 건강보험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근본적이고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핵심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일 것이다.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책임’을 포함해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건강보험료에만 국한한다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재의 경제여건과 국민 정서상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준조세인 연금소득, 실업급여, 자본소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사회보장분담금(CSG) 외에도 자동차보험세, 담배·알코올 소비세, 의약품 광고세 등 목적세가 있으며 2012년에는 비만세 신설로 부과재원을 더욱 다변화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보험료율은 0.75%에 지나지 않으며 보험재원에서 건강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8%에 불과하다.
덴마크 역시 부과재원의 다각화 흐름을 타고 있다. 벨기에도 부가가치세 및 담배세 등으로 보험재원을 분산해 건강보험료 비중은 66.3%, 보험료율은 7.35%(근로자 3.55%)다. 이 국가들은 부과재원의 다양화를 통해 보험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면서 보장률은 80∼90%로 국민이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주의 보험료 부담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다른 유형은 독일과 네덜란드 등이다. 독일은 전적으로 소득 중심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료율이 매우 높다. 1992년 12.7%에서 완만한 상승을 거쳐 현재는 15.5%(근로자 8.2%)에 이른다. 이와 유사한 네덜란드의 보험료는 독일보다 높다. 하지만 이러한 독일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2년에 국고지원을 140억 유로(약 21조 원)로 대폭 늘린 바 있다. 이웃 일본의 보험료율은 9.3%이며 국고지원 비율도 매우 높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마저도 의료비 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작년에는 소비세를 5%에서 10%로 인상했다.
각국, 부과재원 다원화해
부과재원을 다각화하든, 보험료를 올리든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선택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 어느 특정 국가의 모델을 고집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규모나 국민소득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보장성 수준이 60%대 초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크게 못 미치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려면 사회적, 정치적 합의 과정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는 현재의 우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
기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과 내일
구독
-

초대석
구독
-

HBR insight
구독
트렌드뉴스
-
1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2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3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4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5
폐암 말기 환자가 40년 더 살았다…‘기적의 섬’ 어디?
-
6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쳤다…韓 1041조원 vs 日 1021조원
-
7
수명 연장에 가장 중요한 운동법 찾았다…핵심은 ‘이것’ [바디플랜]
-
8
[단독]“5000만원씩 두 상자…윤영호 ‘王자 노리개 상자’ 권성동에 건네”
-
9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
10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3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4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5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6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7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8
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쾌유 기원”
-
9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10
[사설]한덕수 구형보다 크게 무거운 23년형… 준엄한 ‘12·3’ 첫 단죄
트렌드뉴스
-
1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2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3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4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5
폐암 말기 환자가 40년 더 살았다…‘기적의 섬’ 어디?
-
6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쳤다…韓 1041조원 vs 日 1021조원
-
7
수명 연장에 가장 중요한 운동법 찾았다…핵심은 ‘이것’ [바디플랜]
-
8
[단독]“5000만원씩 두 상자…윤영호 ‘王자 노리개 상자’ 권성동에 건네”
-
9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
10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3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4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5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6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7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8
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쾌유 기원”
-
9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10
[사설]한덕수 구형보다 크게 무거운 23년형… 준엄한 ‘12·3’ 첫 단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I 대전환 시대, 골든타임이 끝나가고 있다[기고/안준모]](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22/13321454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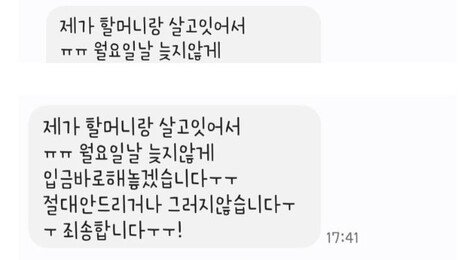
![‘할머니 김장 조끼’에 꽂힌 발렌티노…630만원 명품 출시 [트렌디깅]](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211079.3.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