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기고/주기용]부동산 PF금융 부실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부실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은 말할 것도 없이 시중은행의 PF대출 부실률도 20%에 육박하며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는 PF금융 대출 부실 문제가 일반 서민금융 전반에까지 일파만파로 확대되어 국내 경제 문제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됐다.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건설회사가 단 한 건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PF금융 보증을 섰다가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일시에 유동성 위기에 처해 법정관리까지 신청한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PF금융 부실문제 해결과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부실채권 매입, 배드뱅크 설립 등 여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방안들은 금융권의 부실화된 문제들을 잠정적으로 덮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부실이 더 악화돼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PF금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PF 개발사업의 사후 단계가 아닌 프로젝트사업이 시작되는 사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부실을 차단하는 금융규제가 필요하다. 즉 프로젝트사업의 주관자이며 채무자인 사업의 시행자(Developer)의 자격 요건과 신분이 엄격히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구도로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자본금 5000만 원짜리 시행회사가 수백억∼수천억 원을 대출받고 시공사가 보증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사업구조다. 최소한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시행사만 PF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확고한 대출규제가 필요하다.
둘째, PF금융 개발사업의 사업성 검토와 집행의 전문화 및 객관화된 법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의 PF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종국에는 모든 책임을 시공회사가 떠안는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의 주관자이며 주 채무자인 시행회사는 명색만 주인일 뿐 사업의 책임을 갖는 사업 주체가 없기 때문에 철저한 사업성 검토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되는 건설회사는 리스크 분담을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능력을 키워야 하는데도 입지 분석, 부동산 마케팅, 도시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회계법인이나 컨설팅업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끝으로 PF금융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행자가 사업의 원본인 토지를 위탁하여 시행사와 시공회사, 금융권, 신탁회사 간의 리스크가 균등하게 분산돼 헤지되는 신탁회사의 개발형 토지신탁 상품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주기용 대한토지신탁 사장
기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고양이 눈
구독
-

게임 인더스트리
구독
-

김도언의 너희가 노포를 아느냐
구독
트렌드뉴스
-
1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폭탄…월요일 출근길 비상
-
2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5
60조 캐나다 잠수함 입찰 앞둔 한화, 현지에 대대적 거리 광고
-
6
美 군사작전 임박?…감시 항공기 ‘포세이돈’ 이란 인근서 관측
-
7
한국인의 빵 사랑, 100년 전 광장시장에서 시작됐다
-
8
0.24초의 기적…올림픽 직전 월드컵 우승 따낸 ‘배추 보이’ 이상호
-
9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10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7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8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9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10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트렌드뉴스
-
1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폭탄…월요일 출근길 비상
-
2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5
60조 캐나다 잠수함 입찰 앞둔 한화, 현지에 대대적 거리 광고
-
6
美 군사작전 임박?…감시 항공기 ‘포세이돈’ 이란 인근서 관측
-
7
한국인의 빵 사랑, 100년 전 광장시장에서 시작됐다
-
8
0.24초의 기적…올림픽 직전 월드컵 우승 따낸 ‘배추 보이’ 이상호
-
9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10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7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8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9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10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자주 깜빡하는 부모님, 새해에는 그냥 넘기지 마세요[기고/조용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30/133263345.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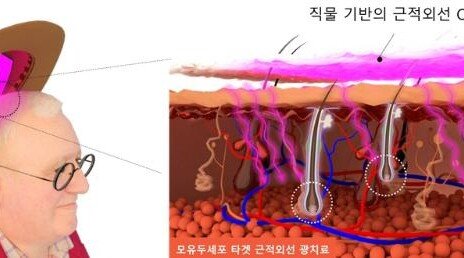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