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기자의 눈]김태한/'010'
-
입력 2003년 1월 19일 18시 24분
글자크기 설정

소비자나 휴대전화 후발업체들은 여러 이유로 이 제도를 서둘러 도입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우선 소비자로서는 도중에 업체를 바꿔도 쓰던 번호를 계속 쓸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이다. 특정업체 식별번호를 갖고 있느냐가 신분의 상징이 되고 있는 젊은이들의 소비풍조도 주춤해질 것같다. 요금이 비싼 업체의 번호를 애써 이용하면서까지 굳이 체면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2, 3위 업체들은 이 제도 시행으로 1위 업체인 SK텔레콤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선발업체로서 ‘011’이라는 최정상의 브랜드를 포기해야하는 SK텔레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SK텔레콤 고위 관계자가 “정권 말기에 이 같은 제도를 급하게 도입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나섰다선 것도 SK텔레콤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은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다. 이런 관점에서 비록 이번 결정이 SK텔레콤에 큰 타격을 준다해도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겠다.
물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려면 사전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과 같이 ‘깜짝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면 아무리 그 취지가 옳더라도 무리를 낳게 마련이다.
SK텔레콤도 좀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엄밀히 따지자면 ‘011’이 자기만 쓸 수 있는 독자적인 브랜드라 고집 부릴 뚜렷한 근거도 없지 않은가.
통신업체들이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하는 진정한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한다.
김태한 경제부기자 reewill@donga.com
기자의 눈 >
-

강용수의 철학이 필요할 때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발리볼 비키니
구독
트렌드뉴스
-
1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2
“놓지마!” 애원에도…술 취해 어린아들 7층 창문에 매단 아버지
-
3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4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5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6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7
김민석 “과정 민주적이어야”…‘정청래식 합당’에 사실상 반대
-
8
‘성유리 남편’ 안성현, 1심 뒤집고 코인 상장 청탁 2심 무죄
-
9
길고양이 따라갔다가…여수 폐가서 백골 시신 발견
-
10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8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9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10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트렌드뉴스
-
1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2
“놓지마!” 애원에도…술 취해 어린아들 7층 창문에 매단 아버지
-
3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4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5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6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7
김민석 “과정 민주적이어야”…‘정청래식 합당’에 사실상 반대
-
8
‘성유리 남편’ 안성현, 1심 뒤집고 코인 상장 청탁 2심 무죄
-
9
길고양이 따라갔다가…여수 폐가서 백골 시신 발견
-
10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8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9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10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KLPGA, 시드권 특전 주며 스스로 권위 날렸다[기자의 눈/김정훈]](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11/07/13272798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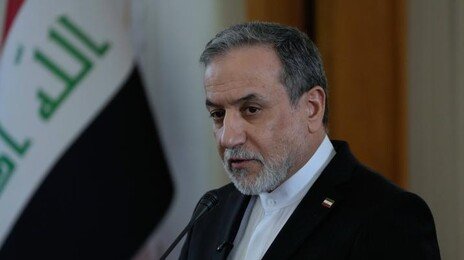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