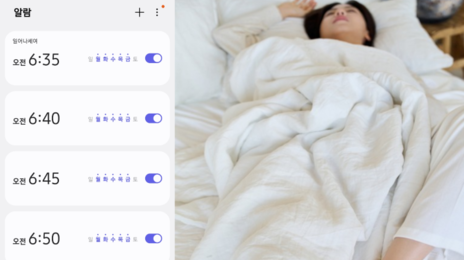공유하기
국내기업 산업재산권「속빈 강정」…해외출원 빈약
-
입력 1999년 4월 8일 19시 33분
글자크기 설정
반면 국내업계는 ‘무형의 재산’인 산업재산권에 대해 아직은 걸음마 수준. 출원건수로 보면 선진국 대열에 올랐지만 정작 돈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물안 개구리’격〓지난해 국내에서 출원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은 20만건이 넘는다. 건수로만 보면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기술 선진국’.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국내업계와 연구소가 해외에서 출원한 산업재산권은 2만건이 채 안된다. 국내 출원건수의 10%에 불과하다.
국내기업 중 가장 많은 기술특허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에서 1천3백여건의 기술특허를 등록, IBM 캐논 NEC 등에 이어 6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를 빼면 대우전자가 3백20건으로 41위, LG반도체가 2백35건을 등록해 55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선진국 기업들은 자국보다 해외 특허를 따기 위해 전력 투구한다. 산업재산권은 분쟁이 일어나는 해당 국가에 출원해 놓아야 효력을 갖게되는 ‘속지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영국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4배에 가까운 산업재산권을 출원했다. 미국(3배) 독일(2배) 프랑스(1.7배) 등도 해외출원 건수가 더 많다. 이때문에 국내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노력은 ‘국내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만년 ‘피고’인 국내업계〓국내 반도체 업계는 해마다 수십 건의 특허분쟁에 시달린다. 대부분은 상대업체에서 ‘특허를 침해했다’며 트집을 잡은 경우다.
지난해 특허분쟁 문제로 15번이나 미국 출장을 다녀온 삼성전자 정승복(鄭承馥)부장은 “특허와 관련해 외국업체와 마찰을 빚은 20여건 가운데 우리가 먼저 공격한 경우는 불과 2,3건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 NEC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승리한 현대전자도 NEC 건 외에는 모두 피고였다.
이후동(李厚東·법무법인 태평양)변호사는 “국내기업은 한해 20만건씩 산업재산권을 쏟아내지만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특허는 거의 없다”면서 “빈발하고 있는 각종 특허분쟁에서 원고가 되는 경우가 극히 미미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가 되는 경우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맞불을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히타치 등 일본기업들은 ‘특허〓상품’이라는 인식을 갖고 기술개발 단계부터 특허담당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업계도 특허부문의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는 등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
트렌드뉴스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 예보…월요일 출근길 비상
-
3
비트코인, 9개월만에 7만 달러대로…연준 의장 워시 지명 영향
-
4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
5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6
“까치발 들고 물 1.5L 마시기”…50대 매끈한 다리 어떻게? [바디플랜]
-
7
한준호, 정청래에 “조국혁신당 합당, 여기서 멈춰 달라”
-
8
다카이치, 팔 통증에 예정된 방송 취소…총선 앞 건강 변수 부상
-
9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10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4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5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6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7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8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9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
10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트렌드뉴스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 예보…월요일 출근길 비상
-
3
비트코인, 9개월만에 7만 달러대로…연준 의장 워시 지명 영향
-
4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
5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6
“까치발 들고 물 1.5L 마시기”…50대 매끈한 다리 어떻게? [바디플랜]
-
7
한준호, 정청래에 “조국혁신당 합당, 여기서 멈춰 달라”
-
8
다카이치, 팔 통증에 예정된 방송 취소…총선 앞 건강 변수 부상
-
9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10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4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5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6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7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8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9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
10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