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별미서 여름 대중 음식으로… 냉면, 세상밖으로 나오다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19세기 농업-기술 발달과 함께 확산
감자 재배 확대로 면 제조 수월해져… 전화-자전거 보급도 ‘대중화’ 한몫
제빙기술-인공조미료 등장이후… ‘여름철 냉면’으로 본격 자리잡아
‘짝꿍’ 만두는 1980년대 이후 붐

“서관(西關)은 10월이라 한 자나 눈이 쌓였으니/…손님 대접 간곡하다/…/눌러 뽑은 냉면에 배추김치 푸르네.”
다산 정약용(1762∼1836)이 쓴 시를 보면 ‘냉면’은 눈이 쌓였을 때 먹는 음식이다. 실제로 조선시대엔 “한겨울 아랫목에 이불을 쓰고 앉아 덜덜 떨면서 동치밋국에 말아 먹는 음식”이었다고 한다. 당시엔 귀한 음식이라 양반도 특별한 날에야 먹을 수 있었다. 냉면을 널리 먹을 수 있게 된 건 19세기 중후반 이후 농업과 기술이 발달한 결과다.
때문에 요즘은 냉면이 여름철에 더 인기지만, 애호가들은 여전히 겨울에 먹어야 제맛으로 친다. 최근 발간된 교양서 ‘냉면의 역사’(강명관 지음·푸른 역사)와 ‘다시 쓰는 한국 풍속’(김용갑 지음·어문학사)을 통해 냉면이 확산된 과정을 살펴봤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국내 외식업이 활성화되며 냉면도 널리 퍼졌다. ‘냉면의 역사’에 따르면 인천을 비롯한 개항장과 서울, 평양 등 주요 도시에선 빨리 만들어 간단히 한 끼 때울 수 있는 냉면이 ‘직장인의 음식’ 메뉴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특히 전화와 자전거의 보급이 가져온 ‘배달 음식’ 문화의 확산과도 직결된다. 도시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냉면 가게 매출의 상당 부분은 1884년 제물포에서 처음 등장한 자전거 배달 주문 덕이었다. 강명관 부산대 한문학과 명예교수는 “당대 직장인들은 점심 때 전화로 냉면을 주문했고, 음식점들은 앞다퉈 전화를 개설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 제빙 기술과 인공 조미료 등장
1908년 일본에서 개발된 인공 조미료 ‘아지노모토(味の素)’ 역시 여름 냉면을 확산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한여름에 굳이 동치미를 담글 필요 없이 손쉽게 감칠맛을 낼 수 있게 된 것. 아지노모토의 국내 광고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1925년부터 약 15년간 동아일보에 아지노모토 광고는 총 90건이 실렸다. 이 중 18건(20%)에서 냉면이 삽화나 광고 카피로 등장했다. 1930년대 평양, 부산 등에선 아지노모토 소매상 모임까지 생길 정도로 조미료가 인기였다.

김 박사는 “1970년대 쌀 자급화를 이루고 나서야 밀가루가 외식이나 별식용으로도 확산하기 시작했다”며 “밀가루 반죽으로 빚는 고기만두는 1980년대 이후 한반도 중부 이남으로도 확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이혜훈 낙마, 與 입장 전달 전 李가 먼저 결심했다
-
2
이준석 “한동훈 사과는 일본식 사과, 장동혁 단식은 정치 기술”
-
3
李 “팔때보다 세금 비싸도 들고 버틸까”… 하루 4차례 집값 메시지
-
4
‘더 글로리’ 차주영 활동 중단…“반복적 코피, 수술 미루기 어려워”
-
5
그린란드 청년들 “美 막으려 입대”… 덴마크 군함 본 주민 “힘 필요”
-
6
[단독]‘李 성남-경기라인’ 김용, 보석중 북콘서트 논란
-
7
운동권 1세대서 7선 의원-책임총리까지… 민주당 킹메이커
-
8
“한국을 미국의 54번째주로 만들겠다”…그린란드 나타난 짝퉁 트럼프
-
9
[천광암 칼럼]이혜훈 결국 낙마… ‘탕평’이라도 무자격자는 안 된다
-
10
李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용인 산단 이어 부동산에도 언급
-
1
‘민주 킹메이커’ 이해찬 전 총리 별세…7선 무패-책임 총리까지
-
2
李, 이혜훈 지명 철회…“국민 눈높이 부합 못해”
-
3
민주평통 “이해찬, 의식 돌아오지 않은 위중한 상태”
-
4
李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강조
-
5
운동권 1세대서 7선 의원-책임총리…‘민주당 킹메이커’ 이해찬 별세
-
6
한동훈 제명 두고 국힘 ‘폭풍전야’…장동혁 복귀후 직접 마무리할 듯
-
7
李, 美 새 국방전략 발표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에 기본”
-
8
이혜훈 낙마, 與 입장 전달 전 李가 먼저 결심했다
-
9
與 “이해찬, 의식 회복 못한 상태“…국내 긴급 이송 논의 중
-
10
“한국을 미국의 54번째주로 만들겠다”…그린란드 나타난 짝퉁 트럼프
트렌드뉴스
-
1
이혜훈 낙마, 與 입장 전달 전 李가 먼저 결심했다
-
2
이준석 “한동훈 사과는 일본식 사과, 장동혁 단식은 정치 기술”
-
3
李 “팔때보다 세금 비싸도 들고 버틸까”… 하루 4차례 집값 메시지
-
4
‘더 글로리’ 차주영 활동 중단…“반복적 코피, 수술 미루기 어려워”
-
5
그린란드 청년들 “美 막으려 입대”… 덴마크 군함 본 주민 “힘 필요”
-
6
[단독]‘李 성남-경기라인’ 김용, 보석중 북콘서트 논란
-
7
운동권 1세대서 7선 의원-책임총리까지… 민주당 킹메이커
-
8
“한국을 미국의 54번째주로 만들겠다”…그린란드 나타난 짝퉁 트럼프
-
9
[천광암 칼럼]이혜훈 결국 낙마… ‘탕평’이라도 무자격자는 안 된다
-
10
李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용인 산단 이어 부동산에도 언급
-
1
‘민주 킹메이커’ 이해찬 전 총리 별세…7선 무패-책임 총리까지
-
2
李, 이혜훈 지명 철회…“국민 눈높이 부합 못해”
-
3
민주평통 “이해찬, 의식 돌아오지 않은 위중한 상태”
-
4
李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강조
-
5
운동권 1세대서 7선 의원-책임총리…‘민주당 킹메이커’ 이해찬 별세
-
6
한동훈 제명 두고 국힘 ‘폭풍전야’…장동혁 복귀후 직접 마무리할 듯
-
7
李, 美 새 국방전략 발표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에 기본”
-
8
이혜훈 낙마, 與 입장 전달 전 李가 먼저 결심했다
-
9
與 “이해찬, 의식 회복 못한 상태“…국내 긴급 이송 논의 중
-
10
“한국을 미국의 54번째주로 만들겠다”…그린란드 나타난 짝퉁 트럼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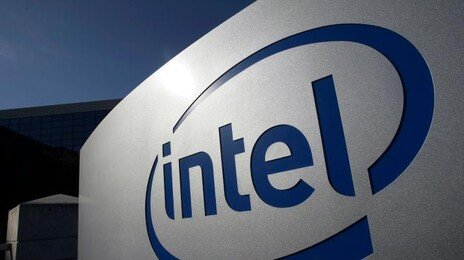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