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백종현 교수 “칸트와 함께 ‘이성의 한계’ 너머 희망 얘기할 때”
-
입력 2006년 7월 11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그래서 칸트의 대표작과 그 개념들에 대한 정밀한 수술이 함께 이뤄진 이번 번역서에 관심이 간다.
1958년 박사학위를 받은 서동익 박사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1985년 독일에서 칸트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백 교수는 지난 20년간 순수이성비판의 번역에만 매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택에서 이뤄진 그와의 인터뷰는 칸트에 대해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1781년에 쓰인 순수이성비판에 대해 간과되는 사실 중 하나는 이 책이 독일어로 쓰인 최초의 철학서라는 점입니다. 칸트를 포함해 그 전의 독일 철학자들이 모두 라틴어로 철학적 사유와 저술활동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순수이성비판은 칸트의 머릿속에서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이 이뤄진 것입니다.”
라틴어의 자장(磁場) 아래서 이 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는 곧 한국에 수용된 순수이성비판이 라틴어-독일어-일본어-한국어라는 여러 겹의 언어적 전회(轉回)를 거쳐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오성(悟性)’으로 번역돼 온 ‘페어슈탄트(Verstand)’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이 단어는 감성에 대비되는 ‘지성’ 혹은 ‘이해’를 뜻한다. 일본어에서는 오(悟)가 ‘안다’는 뜻도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깨닫다’는 뜻만 있다는 차이를 간과했다는 것.
“순수이성비판 한국어판을 독일어로 다시 번역하면 칸트의 원저와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맥에 따라 같은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선험성’은 ‘초월성’으로, ‘합리론’은 ‘이성주의’로 번역됐다.
백 교수는 이를 위해 대학원 강의에서 한 학기 40여 쪽 분량만 번역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고 한다. 그는 한국학술단체협의회가 진행 중인 학술용어 표준화작업의 철학분과 회장을 맡아 왔다.
“칸트는 이성의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도 ‘지식이나 사실이 아닌 것들은 모두 인간에게 의미가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당위와 희망의 존재의의를 밝혀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로서 철학’뿐 아니라 ‘위안으로서 철학’의 정당성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야말로 과학적 지식의 세계에 매몰된 현대인에게 너무도 필요한, 철학하는 자세가 아닐까요.”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트렌드뉴스
-
1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2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3
“놓지마!” 애원에도…술 취해 어린아들 7층 창문에 매단 아버지
-
4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5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6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7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8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9
V리그 역사에 이번 시즌 박정아보다 나쁜 공격수는 없었다 [발리볼 비키니]
-
10
남아공-美 갈등 깊어져…‘멜라니아’ 상영 불발에 G20 퇴출까지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8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9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10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트렌드뉴스
-
1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2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3
“놓지마!” 애원에도…술 취해 어린아들 7층 창문에 매단 아버지
-
4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5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6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7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8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9
V리그 역사에 이번 시즌 박정아보다 나쁜 공격수는 없었다 [발리볼 비키니]
-
10
남아공-美 갈등 깊어져…‘멜라니아’ 상영 불발에 G20 퇴출까지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8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9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10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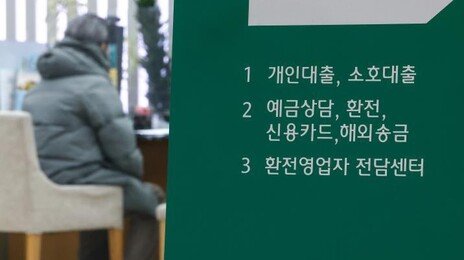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