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김용준 교수 “인촌에 반해 高大에 몸담았다”
-
입력 2005년 9월 7일 03시 35분
글자크기 설정

김 교수는 ‘나의 젊은 시절’이라는 회고문에서 춘원에 대해 “나를 충직한 황국신민으로부터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 줬다”고 고백했다. 인촌에 대해서는 “고려대 교수로서 한평생을 마치게 된 것도 인촌 때문이며 지금까지 고려대 교수였음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1927년생인 김 교수는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을 했고, 황국신민선서를 외우며 “천황폐하의 적자(赤子)로서 천황폐하를 위해 내 생명을 새털과 같이 바치는 일이야말로 남아로서 가장 보람 있는 삶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때 이광수의 소설을 읽으면서 황국신민의 세계와 어딘가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에 눈을 떠 “일본어 일기 외에 한글 일기를 쓰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춘원 이광수를 친일문인 운운하며 매도하는 신문기사를 대할 때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나는 춘원을 나무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며 자신의 스승인 사상가 함석헌(咸錫憲)의 ‘육당(六堂) 춘원의 밤은 지나가다’는 글을 인용했다.
춘원보다 10년 아래였던 함석헌은 이 글에서 육당 최남선과 춘원은 “민족을 위해 슬프게 힘 있게 우렁차게 울었던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내처 힘 있게 울지 않고 중도에 그 소리가 막혀버린 것은 이 민중의 역량이 그것뿐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이 민족에 대한 심판”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 교수는 또 6·25전쟁 이후 함석헌의 스승인 다석 유영모(多夕 柳永模)를 통해 인촌을 알게 됐다며 “좀처럼 남을 칭찬하는 일이 없었던 유 선생님이 한 강좌에서 장장 2시간에 걸쳐 인촌이라는 인물에 대해 말하시면서 극구 칭찬하셨다”고 회고했다.
김 교수는 1965년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교수가 될 때 “고려대를 택한 것은 바로 다석이 심어준 인촌의 모습 때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고려대 교수로 박정희 정권 때와 전두환 정권 때 두 차례나 해직됐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고려대 교수였음을 후회해 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진보 학술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할 1차 명단 3090명을 발표한 뒤 일고 있는 선정 기준의 편파성 등을 꼬집으려는 듯, ‘세상이 들고일어나 그를 칭찬해도 우쭐하지 않았고, 세상이 들고일어나 그를 비난해도 저어하지 않았다(거세이예지이불가권 거세이비지이불가저·擧世而譽之而不加勸 擧世而非之而不加沮)’라는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 편의 글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트렌드뉴스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 예보…월요일 출근길 비상
-
3
비트코인, 9개월만에 7만 달러대로…연준 의장 워시 지명 영향
-
4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
5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6
“까치발 들고 물 1.5L 마시기”…50대 매끈한 다리 어떻게? [바디플랜]
-
7
한준호, 정청래에 “조국혁신당 합당, 여기서 멈춰 달라”
-
8
다카이치, 팔 통증에 예정된 방송 취소…총선 앞 건강 변수 부상
-
9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10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4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5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6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7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8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9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
10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트렌드뉴스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 예보…월요일 출근길 비상
-
3
비트코인, 9개월만에 7만 달러대로…연준 의장 워시 지명 영향
-
4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
5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6
“까치발 들고 물 1.5L 마시기”…50대 매끈한 다리 어떻게? [바디플랜]
-
7
한준호, 정청래에 “조국혁신당 합당, 여기서 멈춰 달라”
-
8
다카이치, 팔 통증에 예정된 방송 취소…총선 앞 건강 변수 부상
-
9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10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4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5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6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7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8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9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
10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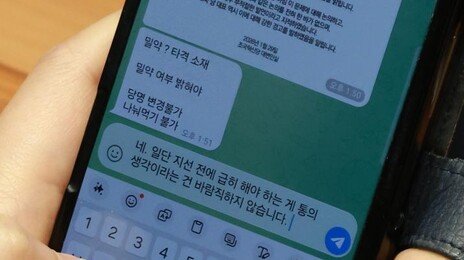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