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향기]전쟁 예측, 늘 맞지는 않았다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전쟁의 미래/로렌스 프리드먼 지음·조행복 옮김/560쪽·2만8000원·비즈니스북스


프랑스-프로이센 전쟁 이전 유럽의 전쟁은 하루가 넘지 않는 전투 하나씩의 승패에 좌우되었다. 패배한 쪽은 바로 강화에 응했다. 전쟁이 ‘남자에게 인격 도야의 장’으로 치부되던 시대였다.
1898년 폴란드인 블로흐는 ‘미래의 전쟁에서 삽은 총만큼이나 없어선 안 될 물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망은 제1차 세계대전 서부전선의 참호전으로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그 전망은 들어맞지 않았다. 1940년 독일군의 대승은 육상 진군이라는 고전적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후의 양상은 1935년 독일 장군 루덴도르프가 ‘승리는 정신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 대로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총력전이었다.
웰스는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원자폭탄도 먼저 내다봤다. 그는 1914년 쓴 ‘세상의 해방’에서 원자폭탄이 대도시 200개를 파괴한 뒤 인류가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는 세상을 상상했다. 그러나 이후 아랍,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에서 전쟁은 이어졌다.
인류의 파멸을 우려하게 했던 동서 대결은 소련의 자연 소멸로 끝났지만 다른 전쟁의 양상이 나타났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의 토착민들이 초강대국에 맞서 싸웠고 정복자는 괴로움에 시달렸다. 반군의 목표는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인내심과 지역민의 신뢰를 잃게 하는 것이었다.
예언을 피하는 저자가 드물게 자신 있는 투로 내놓은 한마디에 마음이 쓰인다. ‘아시아는 지역 정치의 복잡성과 결합할 때 미래 강대국 전쟁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원제 ‘The Future of War: a History’(2017).
유윤종 문화전문기자 gustav@donga.com
트렌드뉴스
-
1
BYD가 수입차 5위, 아우디도 제쳐…‘메이드 인 차이나’의 공습
-
2
‘활동 중단’ 차주영, 심각했던 코피 증상 “1시간 넘게…”
-
3
“초등생에게 ‘도련님’, 남편 동생에게 ‘서방님’…며느리가 노비냐”
-
4
월 800만 원 버는 80대 부부 “집값만 비싼 친구들이 부러워해요”[은퇴 레시피]
-
5
“김정은 딸 김주애, 고모 김여정과 권력 투쟁 가능성…유혈사태 날 수도”
-
6
얼음낚시하다 저수지 빠진 60대, 40분간 얼음판 붙잡고 버텨
-
7
“세조 상도덕 없네” “단종 오빠 지켜!” 요즘 광릉에 악플, 왜?
-
8
‘딸깍’ 아니었네…충주맨 관두자 구독자 10만 빠졌다
-
9
요즘 ‘인증샷’은 바로 여기…2030 몰리는 ‘한국의 가마쿠라’[트렌디깅]
-
10
온니영, 무무소, 뉴욕뮤지엄…‘中 짝퉁’ 난립에 韓브랜드 타격
-
1
“초등생에게 ‘도련님’, 남편 동생에게 ‘서방님’…며느리가 노비냐”
-
2
민주 44% vs 국힘 22% ‘더블스코어’… 보수텃밭 TK서 32% 동률
-
3
李 “다주택 팔라 강요한 적 없어…유도-경고했을 뿐”
-
4
“트럼프, 16세기 왕처럼 굴어…예측불가 행동에 국제법도 무시”
-
5
“김정은 딸 김주애, 고모 김여정과 권력 투쟁 가능성…유혈사태 날 수도”
-
6
李대통령, 경제분야 역대 최고 성과로 ‘코스피 최고치 경신’ 지목
-
7
SNS 칭찬, 감사패, 만찬… ‘明의 남자들’ 힘 실어주는 李대통령
-
8
과천경마장 이전 계획에 주민들 반발 “아파트 오지마”
-
9
첫 女광역시장-도지사 나올까…與 서영교 전현희-野 윤희숙 이진숙 ‘출사표’
-
10
국힘 “李 분당집 사수” vs 與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 다주택엔 입꾹닫”
트렌드뉴스
-
1
BYD가 수입차 5위, 아우디도 제쳐…‘메이드 인 차이나’의 공습
-
2
‘활동 중단’ 차주영, 심각했던 코피 증상 “1시간 넘게…”
-
3
“초등생에게 ‘도련님’, 남편 동생에게 ‘서방님’…며느리가 노비냐”
-
4
월 800만 원 버는 80대 부부 “집값만 비싼 친구들이 부러워해요”[은퇴 레시피]
-
5
“김정은 딸 김주애, 고모 김여정과 권력 투쟁 가능성…유혈사태 날 수도”
-
6
얼음낚시하다 저수지 빠진 60대, 40분간 얼음판 붙잡고 버텨
-
7
“세조 상도덕 없네” “단종 오빠 지켜!” 요즘 광릉에 악플, 왜?
-
8
‘딸깍’ 아니었네…충주맨 관두자 구독자 10만 빠졌다
-
9
요즘 ‘인증샷’은 바로 여기…2030 몰리는 ‘한국의 가마쿠라’[트렌디깅]
-
10
온니영, 무무소, 뉴욕뮤지엄…‘中 짝퉁’ 난립에 韓브랜드 타격
-
1
“초등생에게 ‘도련님’, 남편 동생에게 ‘서방님’…며느리가 노비냐”
-
2
민주 44% vs 국힘 22% ‘더블스코어’… 보수텃밭 TK서 32% 동률
-
3
李 “다주택 팔라 강요한 적 없어…유도-경고했을 뿐”
-
4
“트럼프, 16세기 왕처럼 굴어…예측불가 행동에 국제법도 무시”
-
5
“김정은 딸 김주애, 고모 김여정과 권력 투쟁 가능성…유혈사태 날 수도”
-
6
李대통령, 경제분야 역대 최고 성과로 ‘코스피 최고치 경신’ 지목
-
7
SNS 칭찬, 감사패, 만찬… ‘明의 남자들’ 힘 실어주는 李대통령
-
8
과천경마장 이전 계획에 주민들 반발 “아파트 오지마”
-
9
첫 女광역시장-도지사 나올까…與 서영교 전현희-野 윤희숙 이진숙 ‘출사표’
-
10
국힘 “李 분당집 사수” vs 與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 다주택엔 입꾹닫”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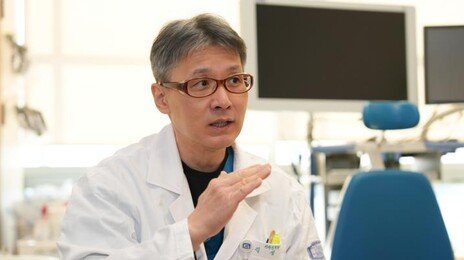

![“머릿속이 조용?” 마운자로 ADHD 효과 소문, 사실은[건강팩트체크]](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346942.3.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