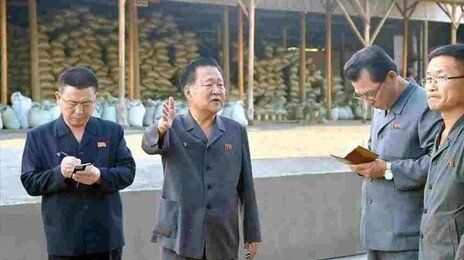공유하기
[횡설수설]최화경/심판과의 동침
-
입력 2002년 6월 9일 22시 40분
글자크기 설정

▷심판처럼 외로운 직업이 또 있을까. 심판의 실수가 곧 승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선수나 관중은 그들에게 인간의 능력을 넘는 완벽성을 요구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조지 커닝 심판담당 매니저는 “심판도 사람인 이상 실수는 있게 마련이고 실수가 없으면 축구도 없다”며 심판 편을 들지만 오심으로 진 팀 입장에서는 땅을 칠 노릇이다. 세계에서 난다, 긴다하는 엘리트 심판 72명이 진행하는 이번 월드컵에서도 미국에 진 포르투갈을 비롯해 벌써 여러 나라 팀이 오심을 탓하고 있다. 오심이 실수 때문이라면 그래도 참을 만하다. 문제는 의도적인 오심이다.
▷1998년 프랑스월드컵 도중 현지에서 감독직을 박탈당한 뒤 차범근씨는 폭탄선언을 했다. FIFA 회장선거로 우리나라에 미운털이 박히는 바람에 판정에서 불이익을 봤다는 내용이다. 당사자들이야 극구 부인하지만 스포츠에서 담합이나 심판 매수가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체조나 피겨스케이팅 경기가 특히 심하다. 인기절정을 치닫다 하루아침에 몰락한 프로레슬링에서 보듯이 승부조작이 탄로 나면 순식간에 팬이 떠나버린다. 그러기에 국제경기에선 심판진과 선수단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아예 숙소를 떼어놓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다.
▷FIFA가 한국과의 일전을 앞둔 미국팀을 심판진과 같은 호텔에 투숙하도록 한 것은 충분히 의혹을 살 만하다. “미인대회 참가자와 심사위원이 한 호텔에 묵는 것”이라는 한국팀 거스 히딩크 감독의 비유대로다. FIFA는 앞서 이 호텔이 본부숙소라는 이유로 한국팀에 숙박을 퇴짜 놓았다고 하니 세계 축구를 주무른다는 FIFA의 일 처리치고는 한심하다. FIFA에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한국-미국전이 어디 보통 경기인가.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라’는 우리 속담이라도 들려줘야 할까보다.
최화경 논설위원 bbchoi@donga.com
한국영화를 이끌 감독들 >
-

사설
구독
-

동아시론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트렌드뉴스
-
1
이란, 중동 美기지 4곳 ‘조준 공격’…“미군 4만명 이란 사정권”
-
2
하메네이, 집무실 비워 공습 피해…“최근 암살 시도 걱정”
-
3
[단독]폴란드, 韓 해군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 무상 양도 안받기로
-
4
트럼프, 이란 향해 “국민은 봉기하고 군인은 무기 내려놔라”
-
5
‘노인 냄새’ 씻으면 없어질까?…“목욕보다 식단이 더 중요”[노화설계]
-
6
집무실 ‘가루’ 된 하메네이, 생사 불확실…권력 계승자 4명 정해놔
-
7
장동혁, 이준석-전한길 토론 보더니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필요”
-
8
‘부화방탕 대명사’ 북한 2인자 최룡해의 퇴장 [주성하의 ‘北토크’]
-
9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10
“내 항공권 어쩌나” 도하 영공 전면 폐쇄…중동 하늘길 막혔다
-
1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2
장동혁, 이준석-전한길 토론 보더니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필요”
-
3
대구 간 한동훈 “죽이되든 밥이되든 나설것”
-
4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5
송광사 찾은 李대통령 내외…“고요함 속 다시 힘 얻어”
-
6
[책의 향기]무기 팔고자 위협을 제조하는 美 군산복합체
-
7
‘지지율 바닥’ 쇼크에도… 민심과 따로 가는 국힘
-
8
큰 거 온다더니 ‘틱톡커 이재명’…“팔로우 좋아요 아시죠?”
-
9
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법도 강행 처리… 법원행정처장 사퇴
-
10
쿠팡 김범석, 정보유출 99일만에 영어로 “사과”
트렌드뉴스
-
1
이란, 중동 美기지 4곳 ‘조준 공격’…“미군 4만명 이란 사정권”
-
2
하메네이, 집무실 비워 공습 피해…“최근 암살 시도 걱정”
-
3
[단독]폴란드, 韓 해군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 무상 양도 안받기로
-
4
트럼프, 이란 향해 “국민은 봉기하고 군인은 무기 내려놔라”
-
5
‘노인 냄새’ 씻으면 없어질까?…“목욕보다 식단이 더 중요”[노화설계]
-
6
집무실 ‘가루’ 된 하메네이, 생사 불확실…권력 계승자 4명 정해놔
-
7
장동혁, 이준석-전한길 토론 보더니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필요”
-
8
‘부화방탕 대명사’ 북한 2인자 최룡해의 퇴장 [주성하의 ‘北토크’]
-
9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10
“내 항공권 어쩌나” 도하 영공 전면 폐쇄…중동 하늘길 막혔다
-
1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2
장동혁, 이준석-전한길 토론 보더니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필요”
-
3
대구 간 한동훈 “죽이되든 밥이되든 나설것”
-
4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5
송광사 찾은 李대통령 내외…“고요함 속 다시 힘 얻어”
-
6
[책의 향기]무기 팔고자 위협을 제조하는 美 군산복합체
-
7
‘지지율 바닥’ 쇼크에도… 민심과 따로 가는 국힘
-
8
큰 거 온다더니 ‘틱톡커 이재명’…“팔로우 좋아요 아시죠?”
-
9
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법도 강행 처리… 법원행정처장 사퇴
-
10
쿠팡 김범석, 정보유출 99일만에 영어로 “사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한국영화를 이끌 감독들]'충무로 반항아' 임상수 감독](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