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남들이 버린 장갑 빨아 쓰며 저축했는데…”
-
입력 2007년 2월 12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2008년에 모두 함께 베이징 올림픽을 구경하러 가기로 했는데….”
숨진 중국동포 김성남(51·사진) 씨의 막내 동생 김분연(37) 씨는 영정 앞에 엎드려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네 남매도 연방 눈물을 훔쳤다.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로 목숨을 잃은 김 씨는 중국 지린(吉林) 성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에서 회계사로 일하다 6년 전 한국에서 결혼한 막내 동생의 초청으로 2005년 4월 한국에 왔다.
3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던 전처가 추방돼 돌아온 몇 달 후였다.
고향을 뒤로하고 3년 예정으로 한국행을 택한 김 씨에게는 돈을 모아야 할 이유가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는 첫째 딸(26)의 짝을 찾아 결혼을 시키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려서부터 영특하기로 소문난 둘째 딸(15)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였다.
김 씨는 여수시 인근 양식장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으면서 1년 7개월 동안 일했다.
처남 홍모(48) 씨는 “피부가 바닷물 때문에 갈라지면서도 남들이 버린 장갑을 빨아서 쓸 정도로 알뜰하고 성실했다”고 돌이켰다.
월급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대부분 중국의 가족에게 보내던 김 씨는 지난해 초부터 돈을 거의 받지 못했다. 양식장 주인은 갖가지 핑계를 대며 월급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밀린 월급이 지난해 10월까지 1020만 원.
주변에서 “한두 달 일하다 그만두라”고 충고할 때도 “언젠가 주겠지” 하던 김 씨였지만 더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일을 그만뒀다.
그리고 관할 노동청에 업주를 고발했지만 그의 손에 들어온 돈은 300만 원뿐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건설업에 종사한다고 신고한 김 씨가 원래 입국 당시 목적과 다른 곳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적발해 1월 중순까지 사무소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보냈다.
말리는 동생들을 뒤로하고 제 발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찾아간 김 씨는 그 자리에서 붙잡혀 수용시설에 갇혔다.
동생들이 세 번이나 찾아가 “보증을 서라면 보증을 서고 벌금을 내라면 낼 테니 풀어 달라”고 빌었지만 김 씨는 풀려날 수 없었다.
죽기 이틀 전 찾아간 막내 동생에게 김 씨는 예의 그 사람 좋은 미소를 띠며 “설날이 되면 월급도 나오고 나도 풀려날 테니 너무 걱정 말라”고 말했다.
그게 김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여수=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어깨 아프면 약-주사 찾기보다 스트레칭부터”[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
3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4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5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6
日 소니마저 삼킨 中 TCL, 이젠 韓 프리미엄 시장 ‘정조준’
-
7
캐서린 오하라 별세…‘나홀로집에’ 케빈 엄마
-
8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9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10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3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4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7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8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9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10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어깨 아프면 약-주사 찾기보다 스트레칭부터”[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
3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4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5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6
日 소니마저 삼킨 中 TCL, 이젠 韓 프리미엄 시장 ‘정조준’
-
7
캐서린 오하라 별세…‘나홀로집에’ 케빈 엄마
-
8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9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10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3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4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7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8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9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10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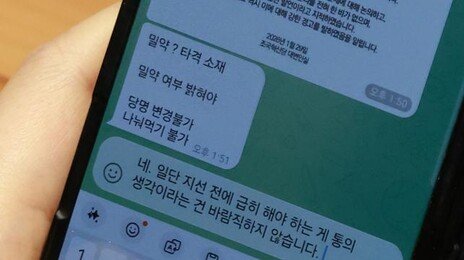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