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싸움[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17〉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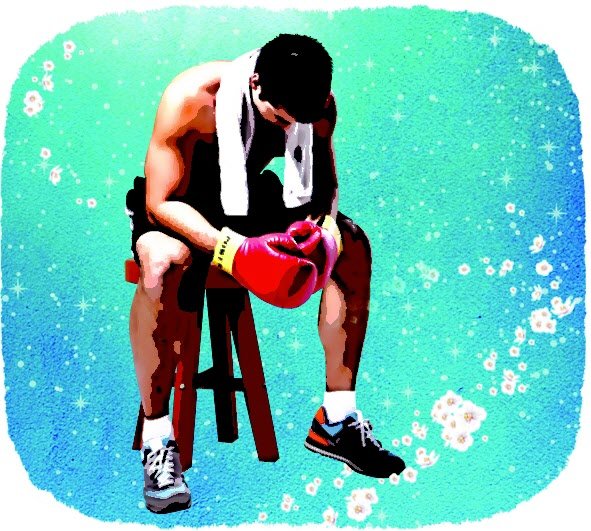
감량 중인 복서는 말린 표고를 물고 하루를 겨우 버틴다 한다 저녁이 되면 접시에 버섯을 뱉는데 몽실몽실한 것들이 접시에 구른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버티고 나면 침이 말라 표고도 부풀지 않는데 스테인리스 그릇에 표고를 뱉으면 깡깡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바로 그때 복서는 새처럼 가볍다 귀와 코에 폭포와 벼랑을 달고 아주 작은 풀벌레 소리도 듣는다 내가 사랑했던 이들이 그렇게 떠났다
―고명재(1987∼ )
시인이 되기 전 고명재 시인은 오직 시인이 되기 위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시를 썼다고 한다. 그건 어떤 일인가? 표고를 입에 물고 종일 고된 훈련을 하는 복서의 일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복서가 정신과 육체를 단련시킨다면 시인은 영혼과 감각기관, 몸의 에너지(기·氣)를 단련시킨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무언가 간절한 사람들은 새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귀와 코에 폭포와 벼랑을 달고 아주 작은 풀벌레 소리”까지 감지해 낼 수 있으려면 새가 되는 수밖에 없다. 시인이 사랑했던 이들도 결국 이렇게 가벼워진 채 떠났다니, 아름답지 않은가. 날 수 있을 만큼 존재가 가벼워진 자들과의 이별.
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구독
-

글로벌 포커스
구독
-

어린이 책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1평 사무실서 ‘월천’… 내 이름이 간판이면 은퇴는 없다[은퇴 레시피]
-
2
한국 성인 4명 중 1명만 한다…오래 살려면 ‘이 운동’부터[노화설계]
-
3
미국은 미사일이 부족하다? 현대전 바꾼 ‘가성비의 역습’[딥다이브]
-
4
트럼프가 보조금 끊자…美 SK 배터리 공장 900여명 해고
-
5
중동 변수에 시험대 오른 ‘코스피 8000’ 장밋빛 전망
-
6
국힘 지도부 ‘서울 안철수-경기 김은혜’ 출마 제안했다 거부당해
-
7
아쉬움 토로한 이정후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잘했다”
-
8
홍준표 “통합 외면 TK, 이제와 읍소…그러니 TK가 그 꼴된 것”
-
9
이란 대통령 “사과” 몇 시간 만에 또 공습…걸프국 “보복 경고”
-
10
“홀인원 세 번에 빠진 파크골프…류마티스 관절염도 극복”[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
1
한동훈 “尹이 계속 했어도 코스피 6000 갔다…반도체 호황 덕”
-
2
李 “대통령·집권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돼…권한만큼 책임 커”
-
3
美외교지 “李 인기 비결은 ‘겸손한 섬김’…성과 중시 통치”
-
4
‘패가망신’ 경고, 李 취임 후 10여번 써…주가-산재 등 겨냥
-
5
나경원 “오세훈 시장 평가 안 좋아…남 탓 궁색”
-
6
오세훈, 장동혁에 “리더 자격 없다…끝장토론 자리 마련하라”
-
7
배우 이재룡, 교통사고 뒤 도주…체포 당시 음주 상태
-
8
[사설]지지율 연일 바닥, 징계는 법원 퇴짜… 그래도 정신 못 차리나
-
9
美, 이란 3000곳 타격-43척 파괴…트럼프 “10점 만점에 15점”
-
10
홍준표 “통합 외면 TK, 이제와 읍소…그러니 TK가 그 꼴된 것”
트렌드뉴스
-
1
1평 사무실서 ‘월천’… 내 이름이 간판이면 은퇴는 없다[은퇴 레시피]
-
2
한국 성인 4명 중 1명만 한다…오래 살려면 ‘이 운동’부터[노화설계]
-
3
미국은 미사일이 부족하다? 현대전 바꾼 ‘가성비의 역습’[딥다이브]
-
4
트럼프가 보조금 끊자…美 SK 배터리 공장 900여명 해고
-
5
중동 변수에 시험대 오른 ‘코스피 8000’ 장밋빛 전망
-
6
국힘 지도부 ‘서울 안철수-경기 김은혜’ 출마 제안했다 거부당해
-
7
아쉬움 토로한 이정후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잘했다”
-
8
홍준표 “통합 외면 TK, 이제와 읍소…그러니 TK가 그 꼴된 것”
-
9
이란 대통령 “사과” 몇 시간 만에 또 공습…걸프국 “보복 경고”
-
10
“홀인원 세 번에 빠진 파크골프…류마티스 관절염도 극복”[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
1
한동훈 “尹이 계속 했어도 코스피 6000 갔다…반도체 호황 덕”
-
2
李 “대통령·집권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돼…권한만큼 책임 커”
-
3
美외교지 “李 인기 비결은 ‘겸손한 섬김’…성과 중시 통치”
-
4
‘패가망신’ 경고, 李 취임 후 10여번 써…주가-산재 등 겨냥
-
5
나경원 “오세훈 시장 평가 안 좋아…남 탓 궁색”
-
6
오세훈, 장동혁에 “리더 자격 없다…끝장토론 자리 마련하라”
-
7
배우 이재룡, 교통사고 뒤 도주…체포 당시 음주 상태
-
8
[사설]지지율 연일 바닥, 징계는 법원 퇴짜… 그래도 정신 못 차리나
-
9
美, 이란 3000곳 타격-43척 파괴…트럼프 “10점 만점에 15점”
-
10
홍준표 “통합 외면 TK, 이제와 읍소…그러니 TK가 그 꼴된 것”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18〉](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11/28/132865017.4.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