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 메디컬 리포트]현장에 답이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27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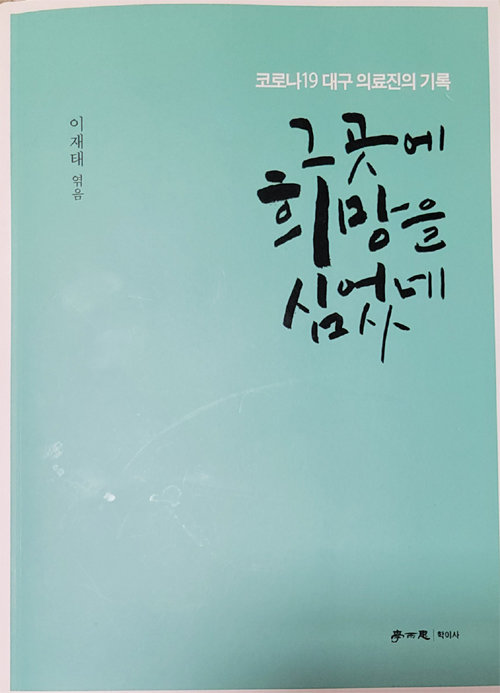

당시 생활치료센터는 전국의 국공립병원장과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거듭하면서 점점 구체화됐다. 코로나19가 어떤 질환인지 잘 몰랐고 치료제나 백신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는 경증 환자들을 따로 모아서 관리함으로써 추가 확산과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현장의 처절한 고민들이 없었다면 나오지 못하는 아이디어였다. 이와는 비교되게 당시 대구에서 현장을 모른 채 엉뚱한 것을 지시한 복지부 고위 공무원도 있었다. 당시 의료계에 따르면 한 고위 공무원이 대구의료원에 방문해서 “이렇게 빈 병상이 많은데 왜 코로나 환자들을 입원시키지 않냐”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서 기다리는 국민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냐”며 ‘핀잔’을 줬다고 한다. 그 자리에 있던 의료진은 굉장히 당황했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대구의 현장을 가보지 않은 전문가들 중엔 대구의 민간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을 때 병상을 내주지 않아 사망자가 생기거나 타 지방 병원으로 많이 이송됐다고 비판한 이도 있었다. 하지만 본보 기자가 당시 대구 현장에서 자원봉사하며 지켜본 바에 따르면 대구의 민간병원들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각각 100∼150병상을 확보해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적극 힘을 보탰다.
더구나 당시는 ‘메르스’에 준하는 엄격한 방역 기준 때문에 대구 모든 병원의 응급실이 마비되거나 폐쇄됐던 어려운 시기였다. 특히 영남대병원은 근처에 신천지 본당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코로나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했던 병원이다. 그런데 사망한 코로나 환자의 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닌 음성이 나왔다는 이유로 당국은 검사실이 오염됐다고 생각하고 폐쇄하는 황당한 조치를 하기도 했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번에 새로 내정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의료계의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듣기를 희망한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변이가 확산되면서 여름 이후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엔 간호사법을 두고 의사,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직역단체 간에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현장의 목소리와 각 직역 간의 소통이 제대로 담기지 못해 벌어지는 일들이다.
특히 원격진료와 관련해선 이와 관련된 업체들은 속속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등의 보건직역단체도 생기고 있다. 갈등의 현장에 직접 들어가 살피고 소통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제 더 이상 현장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현장에 있다.
이진한의 메디컬리포트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e글e글
구독
-

비즈워치
구독
-

푸드 NOW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2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3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
4
[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
5
알몸 목욕객 시찰한 김정은 “온천 휴양소 개조 보람있는 일”
-
6
몸에 좋다고 알려졌지만…부유층이 피하는 ‘건강식’ 5가지
-
7
李 “일부 교회, 설교때 이재명 죽여야 나라 산다고 해”
-
8
김정은, 공장 준공식서 부총리 전격 해임 “그모양 그꼴밖에 안돼”
-
9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의지, ‘이 사람’이 불씨 지폈다[지금, 이 사람]
-
10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1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2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3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4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5
덴마크 언론 “폭력배 트럼프”… 英국민 67% “美에 보복관세 찬성”
-
6
李 “일부 교회, 설교때 이재명 죽여야 나라 산다고 해”
-
7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
8
[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
9
韓은 참여 선그었는데…트럼프 “알래스카 LNG, 韓日서 자금 확보”
-
10
21시간 조사 마친 강선우 ‘1억 전세금 사용설’ 묵묵부답
트렌드뉴스
-
1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2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3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
4
[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
5
알몸 목욕객 시찰한 김정은 “온천 휴양소 개조 보람있는 일”
-
6
몸에 좋다고 알려졌지만…부유층이 피하는 ‘건강식’ 5가지
-
7
李 “일부 교회, 설교때 이재명 죽여야 나라 산다고 해”
-
8
김정은, 공장 준공식서 부총리 전격 해임 “그모양 그꼴밖에 안돼”
-
9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의지, ‘이 사람’이 불씨 지폈다[지금, 이 사람]
-
10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1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2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3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4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5
덴마크 언론 “폭력배 트럼프”… 英국민 67% “美에 보복관세 찬성”
-
6
李 “일부 교회, 설교때 이재명 죽여야 나라 산다고 해”
-
7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
8
[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
9
韓은 참여 선그었는데…트럼프 “알래스카 LNG, 韓日서 자금 확보”
-
10
21시간 조사 마친 강선우 ‘1억 전세금 사용설’ 묵묵부답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 메디컬 리포트]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던 장애질환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2/06/16/113971127.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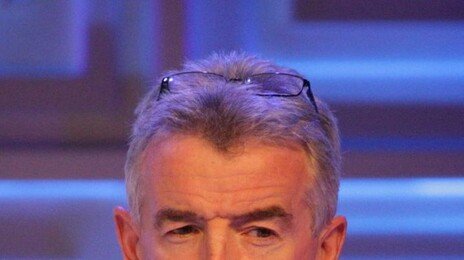

댓글 0